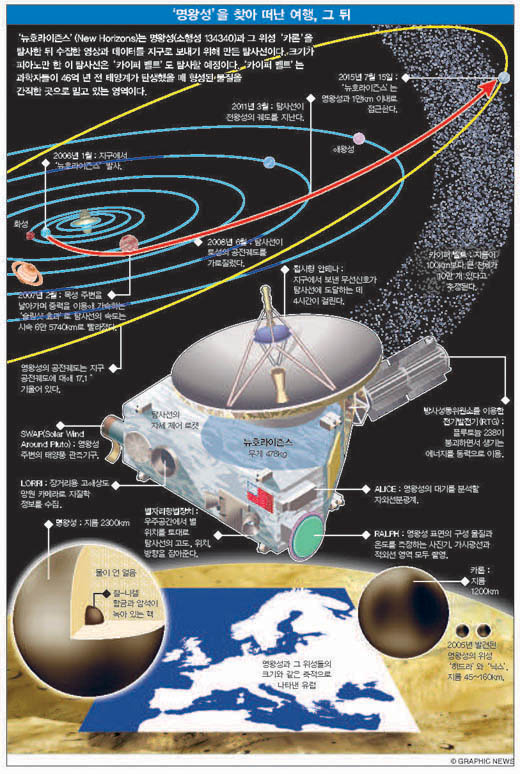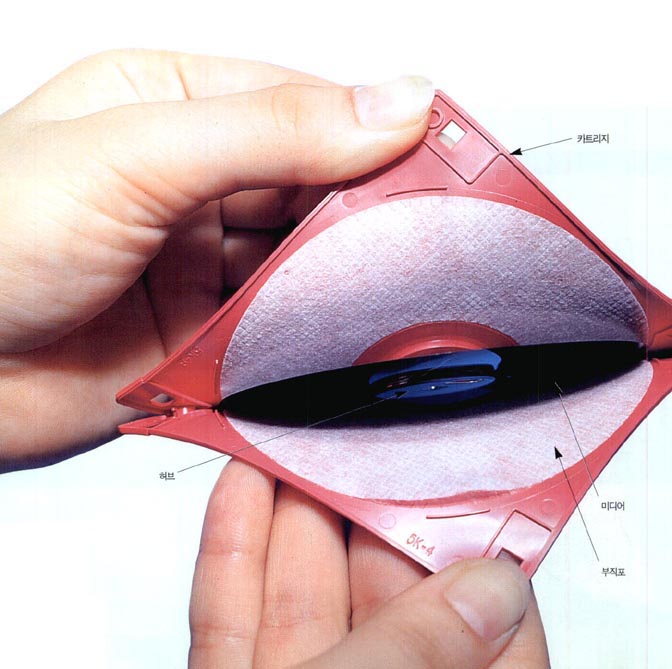'프랑스에 파브르 곤충기가 있다면, 한국에는 정부희 곤충기가 있다.’ 정부희 고려대 한국곤충연구소 박사가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다. 그녀는 2010년 ‘곤충의 밥상’을 시작으로 매년 곤충기를 펴내고 있다. 현재 5권까지 나왔다. 파브르가 곤충기를 집필한 것보다 두 배는 빠른 속도다. 심지어 수필집도 따로 펴내는 다작 작가다. 그렇다고 곤충학자로서 연구를 게을리 하지도 않는다. 학술지에 논문을 매년 세 편 정도는 꼬박꼬박 발표한다. 주전공인 ‘버섯에 사는 딱정벌레’로 논문을 내는데, 그동안 애벌레버섯과 등 7개 과(科)를 정리했으니 연구업적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돋보기 대신 카메라
정 박사는 여러 면에서 파브르를 연상케 한다. 우선 늦은 나이에 학위를 땄다. 41살이던 2003년 성신여대 생물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2008년 곤충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류학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연구를 늦게 시작하다보니 처음부터 교수가 될 생각을 안 했다. 학교에 얽매이지 않으니 그만큼 많은 시간을 야외연구에 쏟아 부을 수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일주일에 2~3일은 현장을 누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곤충기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정 박사는 “처음부터 곤충만 연구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곤충기를 쓸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30대 초반부터 야생화에 관심을 가져 우리나라 식물을 공부해놓은 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곤충의 한살이를 다루면서 식물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파브르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돋보기와 몽당연필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는 점일 테다. 정 박사는 키 160cm가 안 되는 작은 체구지만 커다란 DSLR을 항상 메고 다닌다. 60mm 렌즈에 외장형 플래시를 두 대나 달아놓았다. 곤충기에 쓸 재료를 모을 때는 메모를 따로 하지 않는다. 모습은 사진으로 찍고, 행동은 머릿속에 기억한다. 곤충 한 종이 알에서 애벌레를 거쳐 성충이 되는 모습을 수년 동안 관찰해 확연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녀에겐 카메라가 수첩이고 메모지며 돋보기다.

우리 곤충 전체를 기록한다
국내에도 곤충을 기록한 책은 꽤 있다. 특히 곤충을 분류해 특징별로 설명한 도감과 특정 곤충분류군의 생태를 소개한 책이 많다. 허나 우리 땅에 사는 곤충전체를 이야기하는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곤충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 박사의 도전은 무모해보이기도 한다. 그녀는 남들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필체와 관찰력으로 이 땅에 사는 곤충들의 생애사를 모으고 있다.
정 박사가 쓴 글을 읽어보자. 어릴 적 추억이 나오는가 하더니 자연스레 곤충 이야기로 넘어간다. 왕벼룩잎벌레가 옻나무잎에서 얻은 독성물질로 자신을 방어하는 원리를 소개하며 화학물질명과 각종 실험결과를 덧붙인다. 수필과 논문을 자연스레 오가는 점은 파브르의 전매특허인데, 정 박사는 그마저도 빼닮았다.

정부희 곤충기는 재밌다. 먹이활동을 다루는가 하면 어느샌가 짝짓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홍날개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 할 때 서로 마주서는 모양을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 들어선 것 같다”고 표현하고, 밑들이가 90° 각도로 짝짓기하는 모습이 “완전 특종감에 해당해 카메라를 들이댄다”고도 한다. 알락파리 두 마리의 육감적인 입맞춤을 “기다란 주둥이를 꽈배기처럼 꼬고 두툼하고 넓적한 아랫입술을 느물거리며 밀착시킵니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추천 글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언저리를 아슬아슬하게 맴돌며 풀어낸” 이야기라며 재밌어 할 정도다.
정 박사는 20대에 영어영문학을 배웠다. 수업 시간에 읽은 셰익스피어 문장에는 은하수를 표현한 단어만 수십 가지였다. 습작 한번 안 하긴 했지만, 그때 읽은 문학작품들의 아름다움은 곤충기에 녹아있다.

사비 털어 만든 야외 곤충연구소
“만들 땐 생각을 못했는데, 짓고 보니까 알마스 연구소와 비슷하더라고요.”
* 알마스 연구소 파브르가 말년에 머물렀던 개인 곤충연구소
정 박사는 최근 파브르와의 공통점을 하나 추가했다. 살림을 탈탈 털어 경기도 양평에 약 2975m2 (900평, 사용면적 600평)에 이르는 개인 야외 곤충연구소를 마련한 것이다.
늘 야외로 돌아다니며 관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개인 연구소를 차렸을까. 늘 전국으로 누비다 보니 베이스캠프가 필요했다. 곤충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곁에 두고 관찰하고픈 욕구도 있었다. 그러려면 곤충손님이 찾아오도록 밥상을 차릴 공간이 필요했다. 작년 7월 2억6000만 원을 들여 버려진 땅을 구입한 정 박사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곤충의 먹이식물 150종을 심었다.
“이 넓은 땅에 모종 몇 개 심어봐야 티도 안 나요. 일도 하던 사람이나 하지. 온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서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엎친 데 덮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멘붕이 왔죠.”
힘이 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래도 두 아들이 든든한 우군이 돼 줬다.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함께 연구소를 가꿨다. 당귀에는 홍줄노린재와 산호랑 나비가, 백합에는 백합긴가슴잎벌레가, 박하에는 박하잎벌레가 찾아왔다. 이제 서서히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단계다. 정 박사는 3년만 지나도 무궁무진한 곤충들이 이곳을 찾을 거라며 기대하고 있다. 요즘은 연구소 이름을 ‘곤충의 밥상’으로 할지 ‘곤충의 사랑방’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먹이식물을 곤충이 와서 먹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데요. 아무 데나 가서 곤충 보는 거랑은 맛이 달라요. (등 뒤에서 박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근데 사실은 ‘새의 밥상’이 됐어요. 곤충이 많아지니까 새가 얼마나 몰려오는지…, 얘, 네가 우리 애들 다 먹으면 어떡하니!”

스테노펠의 어리여치 사랑
건혁 학생의 온라인 아이디는 ‘스테노펠’. 어리여치 상과(Stenopelmatoidea)의 학명에서 일부를 가져왔다. 잠시 스쳐가는 풋내기 사랑이 아니다. 건혁 학생은 6살 때 곤충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중학교 3학년 때 풀벌레 종류를 연구하겠다고 정했다. 그가 롤모델로 삼는 김태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의 이야기가 주효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풀벌레 전문가인 김 연구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다. 어리여치는 풀벌레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안 돼 있는 분류군이다.
“이름에 여치가 들어있지만 여치와는 습성이 완전히 달라요.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시키는 녀석도 있어요. 이것 보세요.” 스마트폰을 휙휙 넘기더니 영어논문을 꺼내 보여준다. “2009년 나온 어리여치 신종이에요. 메뚜기목 중에서 꽃가루받이를 하는 건 이 종이 처음이라고요.” 그는 가지고 있는 곤충논문이 많았다.
“이건 김태우 연구사님과 거미연구회 회원 두 명이 완도의 여서도에서 발견해 작년에 발표한 어리여치 신종이에요. 호랑이를 닮아서 범어리여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말이 점점 빨라졌다. 속기를 하는 손가락이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논문 다음은 홈페이지였다. 국내에는 어리여치를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건혁 학생은 주로 외국 자료를 뒤져서 정보를 얻는다. 희귀곤충을 많이 사육하는 일본 아마추어 학자들의 블로그가 특히 양질이라고 했다. “이런 블로그에서 영감을 엄청 얻어요.” 독창적인 사육방법을 개발해 어리여치가 알부터 애벌레, 탈피 후 성충으로 크는 모습을 치밀하게 찍은 접사 사진이 방대했다. “근데 일본어 읽을 줄 알아요?” “구글 번역기 돌리죠.” 전 세계 블로그를 종횡무진하며 사진과 영상을 한참 보고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다.

미래의 파브르 100명
“혹시 당신 같은 학생이 또 있느냐”고 묻자,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답이 나왔다. 건혁 학생이 속한 ‘생물자원연구회’는 그와 비슷한 아마추어 연구가 100여 명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다. 고등학생 신분이라 자유롭게 움직이진 못하지만, 종종 함께 곤충채집을 다니고 정보를 교류한다. 2013년 초엔 운영진들끼리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의 매미연구를 돕기도 했다.
“‘라시우스’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동민수 형은 고3인데, 아이패드에다 개미 관련 논문 수백 편을 넣고 다녀요. 인천 계양산에 있는 개미를 조사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 ‘갈로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김도윤 형은 우리나라 최초로 신종 갈로아벌레를 채집해 연구한 학생이예요. 정민규, 송민규, 성민규, 김재동, 이준호 이 분들도 취재해보세요.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전문가 수준이에요.” 건혁 학생은 어릴 때부터 파브르 곤충기를 많이 읽었다고 했다. 어린이용 파브르 곤충기는 실제와 달라서 별 도움이 안 됐는데, 김진일 교수의 완역본은 학명과 실험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연구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조롱박벌이 여치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파브르 곤충기구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파브르가 인생을 다 바친 게 보였어요.”
그도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수도권 일대에서 메뚜기목을 관찰해 기록하고 아마추어 곤충학술지에 기록보고를 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론 곤충기를 쓰는 게 목표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너 완전 한국의 파브르라고. 전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곤충을 가장 재미있게 알리고 싶어요. 김태우 연구사님이나 정부희 박사님처럼 쉬우면서도 전문성 있는 곤충 책을 쓰는 게 꿈이에요.”
▼관련기사를 계속 보시려면?
INTRO. 21세기 파브르 곤충기
PART1. 나는 살아있는 것을 연구한다
PART2. 파브르가 사랑한 곤충, 그리고 우리 곤충
PART3. 나는 한국의 파브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