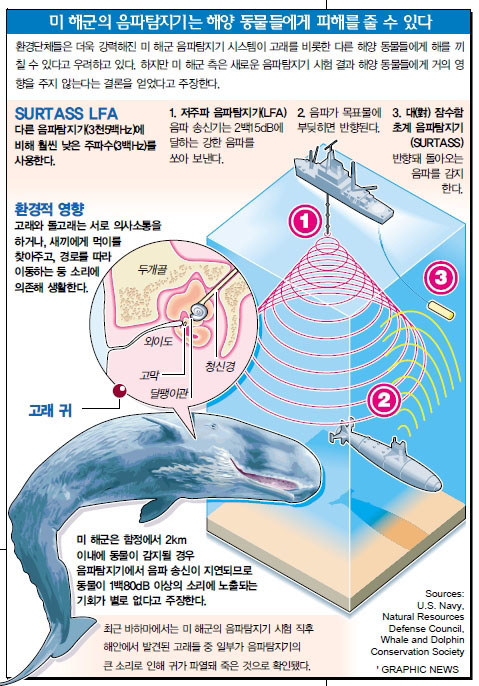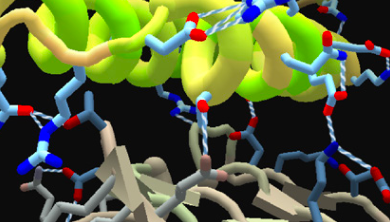어머, 아직 기후 위기가 실감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SF 시나리오부터 읽어 보시죠. 세 명의 기자가 각각 2100년, 2300년, 그보다 먼 미래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봤습니다.
/
2100년
2100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루 동안 6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100년 빈도의 비가 쏟아질 예정이니 이번 주말엔 외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친절하지만 무시무시한 라디오 예보를 들으며 택시에서 내렸다.
찰-박
택시에서 내리는 발아래는 이미 딛는 곳마다 물이었다. 습한 우기 내내 물이 고인 하수구엔 장구벌레가 들끓었다. 그런데 또, 비라니. 라디오 속의 친절한 기상 캐스터가 잠실 롯데타워 25개를 합친 것보다 높은 비구름이 서울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던 게 생각났다. ‘폭우가 지나가면 모기는 좀 줄어들겠지? 그렇다고 폭우를 반길 일인가?’ 의미 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오늘 소개할 집에 도착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인천에서 시작한 건 크나큰 실수였다. 엄마의 부동산을 물려받을 심산으로 시작한 일인데, 날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기만 한다. 씁쓸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영종도는 물론 서구와 동구, 미추홀구 일부까지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혔기 때문이다(QR코드 참고).
“이 엄마가 30대 땐 말이야, 오션뷰 카페가 아주 핫플이었어.”
핫플이라니. 단어 선택부터 아주 예스러운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지만, 지금 나에겐 그저 무용한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해자드 맵도 볼 수 있나요?”
오늘 집을 보러 온 사람도 해자드 맵부터 찾는다. 해자드 맵은 침수, 해일, 태풍 위험도를 나타낸 지도다. 2050년부터 제정된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땐 꼭 확인하고, 위험 지역일 땐 기후재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폭우나 해일로 입은 피해를 대비해 미리 보험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이 주변은 다 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혹시나 집을 안 사겠다고 할까봐 눈치를 살피며 해자드 맵을 내밀었다. ‘기후 부동산 변화 100년 도감’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침수된 인천 지역은 15km2 정도.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 전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 어떤 지역이든 보험이 필수다.
“음…, 처음 찾아온 집이라… 다른 곳도 좀 보고 올게요.”
역시나. 오늘도 허탕이다. 우기에 집을 거래한다는 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맥이 풀린다. 씁쓸하게 매물을 뒤로한 채 나서는데, 모기가 왱 하고 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간다. 아무래도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나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다.
/
2300년

2300년, 7월 1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나, 김해 김씨 삼현파 91대손 김민호의 고향은 오늘부로 지도상에 없다. 3호 태풍 나비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수로왕릉을 포함한 경상남도 김해시 남쪽 절반이 바다에 잠겼다.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왕이 수로왕릉에 묻힌 지 2300여 년 만의 일이다. 2300년 전, 아니 300년 전만 해도 바다로부터 약 17km 떨어져 있던 곳이다. 그 사이 해수면이 5m 높아져 내륙이던 김해를 바닷물에 둘러싸인 섬처럼 만들었다. 졸지에 해안가가 된 나의 본관은 태풍 한 번에 무력하게 쓸려나갔다. 저승의 수로왕은 자신의 무덤이 해수면 아래에 잠기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태풍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300년 전부터 이어졌으니 새로울 것도 없다. 옛날에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해안가 지역 사람들이 창문에 얇은 종이나 비닐을 붙여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풍습이 있었다고 들었다. 창문이라니.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런 걸 본 기억은 없다. 창문이 있어 봐야 풍속이 초속 60m를 가볍게 넘는 바람에 깨지기밖에 더하나. 아마 일 년에 네다섯 번은 창문을 갈아 끼워야 할 거다.
애초에 요즘 세상에 해안가에서 사는 사람은 좁아터진 한반도 중심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쪽방촌으로 밀려난 빈민밖에 없다. 나처럼. 이곳 해운대는 한때 돈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보이는 고층빌딩을 짓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곳이었다. 물이 보이는 집이 웃돈을 받고 거래되는 인기상품이었다고. 상상도 안 간다. 바다를 등지고 있는 집이 더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니까. 오늘날 해운대엔 창문 하나 없이 밝은 색 시멘트로 뒤덮인 4~5층 정도의 낮은 건물이 줄지어 있다. 묘비가 가득 들어선 공동묘지 같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수로왕의 무덤을 쓸어버린 태풍 나비가 이제 우리 동네 가까이 왔나 보다. 태풍이 가까워질 때 대피경보를 울리는 건 해안가에 사는 빈민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지다. 그래, 내륙지역에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긴 어렵겠지. 안전한 땅이란 너무나도 적고, 갈수록 세지는 기후재난은 이제 정부가 손쓸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안전하지 않은 땅은 버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걸 안다.
2300여 년 전 김해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임금을 달라며 구지가를 불렀다고 한다. 하늘은 감읍해 수로왕을 내려줬다. 그러니 나도 태풍이 다가오는 지금, 해운대의 쪽방에 갇혀 노래를 부를밖에.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
머나먼 미래

머나먼 미래,
서울 남산 국회의사당
18번째 발의된 수도 이전안은 국회에서 또 부결됐다.
‘수도 서울 사수파’가 두 표 차이로 이겼다. 조선 시대부터 따져 1000년 이상 지켜온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이들 말이다. 늘 두 자리 수로 여유롭게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슬아슬했다. 상습 침수지역인 한강 주변 부촌의 인구가 줄면서 사수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 탓이다.
‘수도 이전파’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해수면이 2022년 대비 10m나 상승하고 집중호우도 늘어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해 온 세종으로 가자는 이들도 있었고, 요즘 한창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북부나 강원도로 옮기자는 이들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는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은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은 갈등이 빨리 찾아온 편은 아니다. 21세기 초 기준 서울의 평균 해발고도는 38m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2m), 태국 방콕(1.5m), 영국 런던(11m), 캄보디아 프놈펜(12m) 등 일부 국가의 수도는 일찌감치 잠겼다. 수도 이전을 두고 수백 년간 난장판이 벌어졌다. 서울은 아직까진 버틸 만했다. 우기 때를 제외하면.
한동안 정부는 한강 주변 침수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네덜란드처럼 방조벽도 지어보고, 지하에 초대형 배수관도 설치했다. 한강을 준설해 유량을 늘리는 시도까지 벌였다. 하지만 초대형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허무함만이 남았다.
지금에서야 다들 말하는 거지만, 그때 곡창 지대를 지키는 데 돈을 썼어야 했다. 그랬으면 삶이 이 정도로 비루해지진 않았을 것 같다. 호남평야, 나주평야, 김해평야 같은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면서 쌀이 자취를 감췄다. 해수면 상승에 더해 여름에는 폭우가 내려 평야 지대가 자주 범람했다. 반대로 봄에는 가뭄이 더 심해져서 웬만한 작물은 잘 자라지 않았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흰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라고 가끔 말씀하신다. 나도 한국 사람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지 포니오나 카우피, 타로, 아마란스, 컨자(QR코드 참고) 같은 게 썩 입에 맞지는 않는다.
요즘은 시원하고 바닷물 불어날 걱정 없는 북쪽의 ‘산세권’이 인기다. 빙하가 다 녹으면 앞으로 70m가 더 상승한단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아예 그때쯤의 한반도 모습을 떡하니 부동산에 붙이고 산세권 땅만 파는 곳도 있다. 요즘 철원, 화천, 인제는 집이 없어서 못 판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