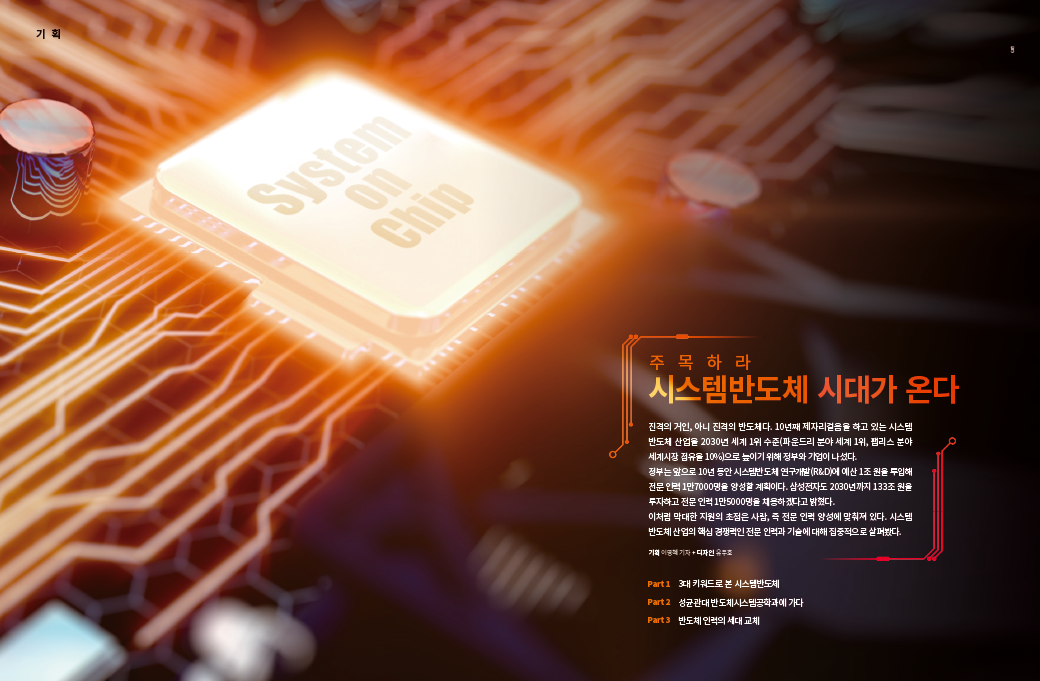SF영화 장면 같은 강의실
지난 2월 4일 오후 2시 기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의 계절학기 수업에 참여했다. 10년 전 기자가 다녔던 공대와 2015년 이공계 대학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GIST는 요즘 이공계 대학 중에서도 수업방식이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별히 케케묵은 전공 책을 백팩에 넣고 산뜻하게 등교(?)를 했다. 하지만 겉모습과(특히 피부) 달라진 교실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복학생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화상채팅이었다. 이날 강의는 한국 GIST에 있는 교수 2명과 미국에 있는 교수 1명, 총 3명이 동시에 진행했다. 3명의 교수가
팀을 이뤄 수업하는 것도 색달랐지만 지구 반대편 사람이 한 교실에 있는 것처럼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더 신기했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교수는 실시간으로 응답했다. 수업을 함께 진행한 조경래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화상채팅은 요즘 대학 강의에서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칠판 대신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 서서 발표를 했다. 화면 속 자료를 손가락으로 넘기거나 확대하며 설명하는 모습이 SF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내용을 바로 찾아보거나 수업 내용을 정리한 PPT를 태블릿 PC로 보는 학생도 많았다. 필기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칠판을 사진으로 남겼다. 함께 수업을 들은 최우림 학생은 “수업 내용을 적는 것보다 머리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칠판을 촬영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앞좌석 친구의 등 뒤에 숨어서 몰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던 기자에겐 ‘문화충격’이었다(이런 현상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등 다른 공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다. 한 교수는 학생들이 필기할 때 잠깐 쉬던 쉬는 시간이 사라져서 아쉬워하기도 했다).

[요즘 공대 강의는 IT기기,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화상채팅 서비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발표를 한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에는 공부를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 평균 2~3개씩 깔려있었다. 공통적인 건 공학용계산기 어플. 10년 전만 해도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공학용계산기를 갖고 다녔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검은색 계산기는 시험 볼 때 ‘커닝페이퍼’를 숨기는 데도 유용했다. 요즘은 한 반 40명 중에 공학용계산기를 쓰는 학생이 5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도 갓 전역한 복학생.
요즘 이공계 대학생들은 카카오톡 같은 채팅 어플이나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어플도 자주 사용한다. 주로 조별 과제를 할 때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용도다. 서강대 공대와 고려대 공대, 서울과기대 등 다른 공대에서도 다양한 어플을 소개받았다.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할 때 테스트할 수 있는 어플, 물리수학 공식을 제공하는 어플, 수학 공식을 넣으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어플, 스캐너처럼 작동해서 각도기나 눈금자 기능을 할 수 있는 어플, 수직 수평유지를 도와주는 수준계 어플까지…. 그중에는 수업 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어플도 있었다. 최우림 학생은 “수업 중간에 교수님이 퀴즈를 내면 학생들이 어플을 통해 답을 맞추고 정답률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젠 수업 시간에 마음 놓고 졸지도 못하는 걸까.
공지사항도 100% 영어로
2시간짜리 수업이 절반쯤 지났을까. 서서히 잠이 오기 시작했다. 간만에 공부를 한 탓도 있겠지만 영어 탓이 가장 컸다. 공대에 영어강의가 본격화된 건 2007년이다. 대학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대학 평가 기준에 영어 강의 비중이 포함되면서부터다. 기자가 공대를 다니던 때(2005~2009년)에도 영어 강의가 존재는 했다. 교과서가 일단 원서고 강의 자료 또한 모두 영문이다 보니 교수의 강의 내용 중 ‘은·는·이·가’ 조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영어였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 중에는 멘붕에 빠진 학생들을 위해 수업 마치기 5분 전에 한글로 수업 내용을 요약해주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달라졌다. 순도 100% 영어강의였다. 교수 강의와 학생 발표는 물론이고, 수업 전 공지사항과 중간 질의응답, 농담도 모조리 영어였다. 갑작스런 질문에도 곧장 답변하는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놀라울 뿐이었다. 조 교수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수업의 큰 목표”라고 밝혔다. 함께 수업을 진행한 앨리스 리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 역시 “과학자들은 (영어로 쓴) 논문을 통해 말하고 듣는다”며 “학생들이 실제 과학자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전공 수업이지만 영어 작문과 말하기도 중요한 비중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미 영어강의에 많이 적응한 듯 했다. 발표를 한 김도원 학생은 “수업을 듣기 전과 비교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한 번 해봤으니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질문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결과물. 국내 대다수의 공대에서 학생들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실습 프로그램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장 실습 강조…
한 학기 통째로 회사서 보내기도
원래 이번 강의의 정원은 12명이었다. 하지만 4명이 포기한 결과 8명이 남았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빡센’ 실습의 결과였다. 실습 위주, 제품 제작 위주의 교육과정 역시 요즘 공대의 트렌드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국내 대다수의 공대가 실무 강화 교육프로그램인 ‘캡스톤 디자인’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은 공대 학생이 학부 과정에서 배운 이론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1년 동안 제품 기획·설계·제작을 실습하는 특별 과정이다. 199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기자가 학교를 다니던 때까지도) 기계과, 전자과 등 일부 학과에서만 실시하던 ‘선택’이었는데 최근 2~3년 사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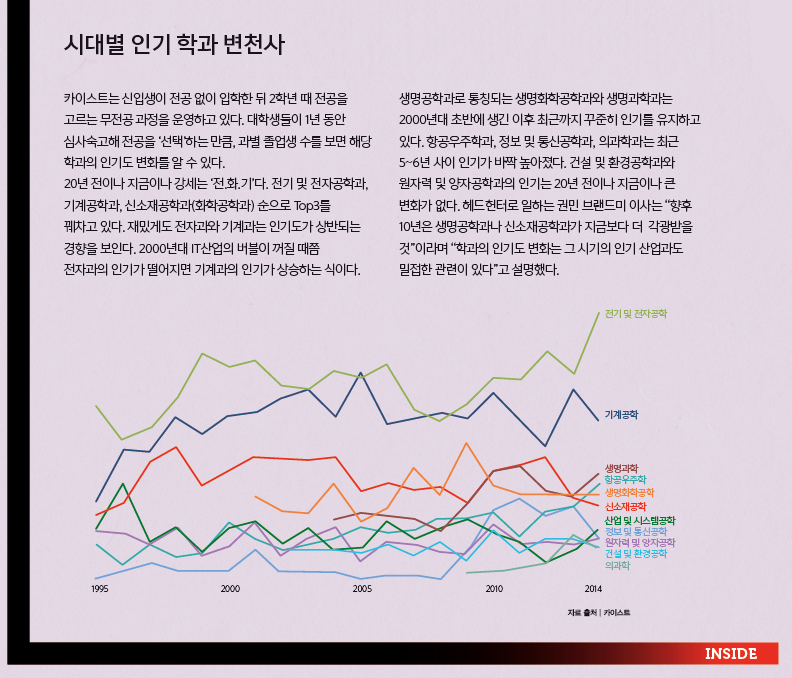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화했다. ‘코업(co-operative·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통째로 회사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것이 학점으로도 인정이 된다. 2~3년 전부터 성균관대와 서울과기대 등 주요 공대가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서의성 성균관대 교수는 “학교 차원에서 수십 곳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창업도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한 예로 이화여대는 3년 전부터 ‘실전 캠퍼스 CEO’라는 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창업 실습을 시킨다. 학교가 나서 시제품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특허 출원을 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분위기다. 이러니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돌아오는 기차 안, 4년 공대 생활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공대 공부를 계속 했더라면’ ‘요즘 시대에 공대를 다녔더라면…’ 부질없는 생각의 결론은 이랬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고되다. 하지만 고된 만큼 성장한다.
▼관련기사를 계속 보시려면?
INTRO. 요즘대세 공대가 좋아
PART1. 고교생 100명이 묻고, 공대생이 답하다
PART2.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솔직토크
PART3. 터치스크린 발표에 농담도 영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