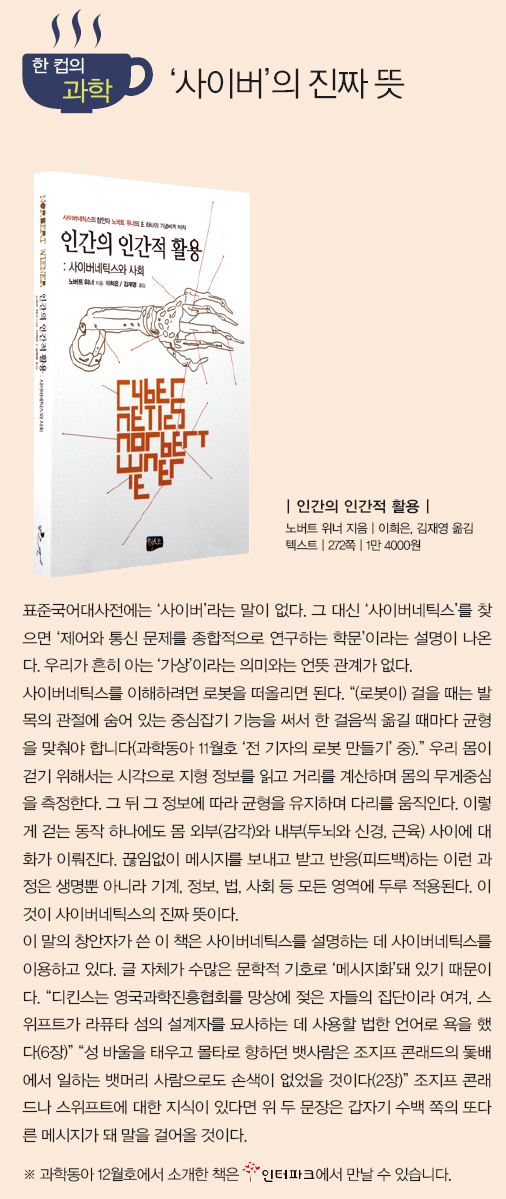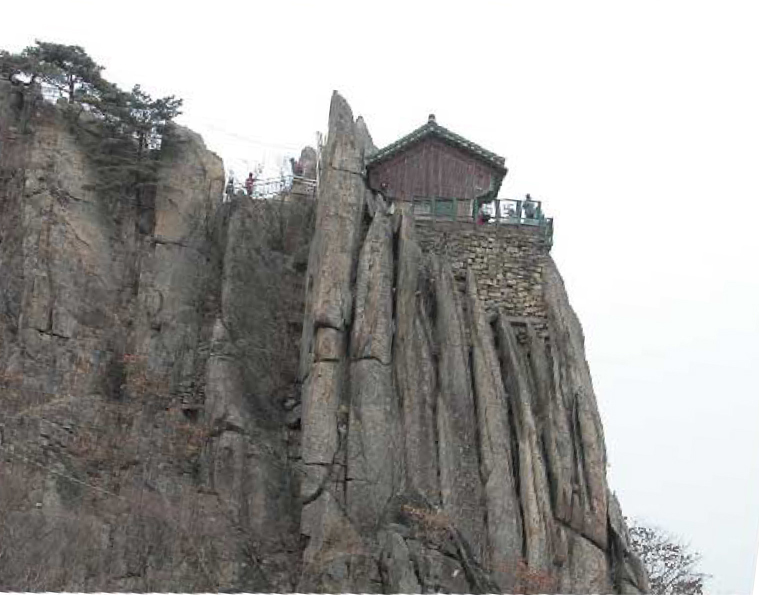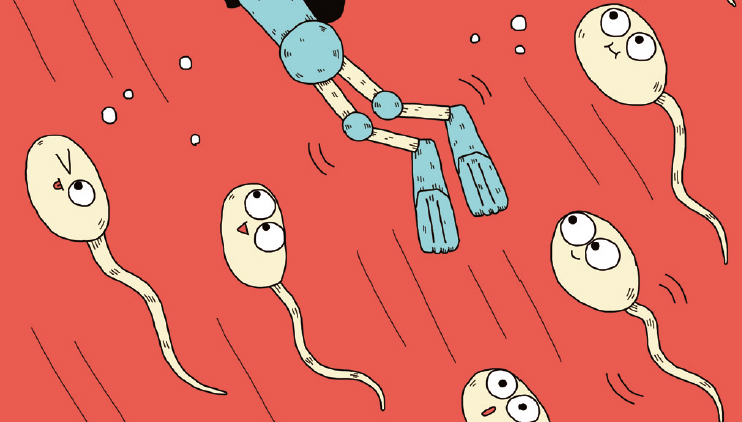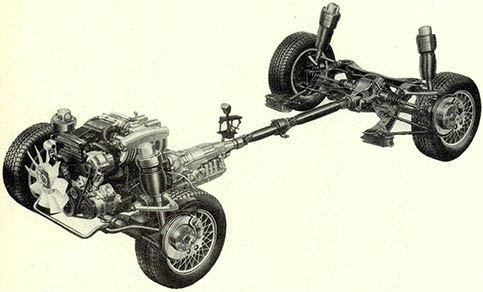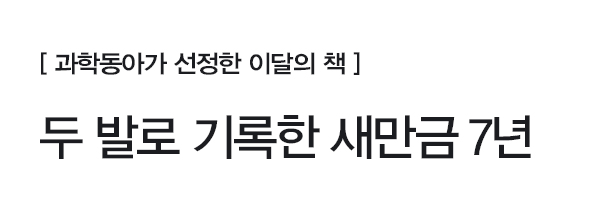
일주일씩, 걷고 또 걸었다. 처음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리고 7년. 고3이 된 올해까지 매해 여름 바다를 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 해안선 변화를 기록하고 만난 생물종을 기록했다. 사진을 찍었다.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는 수시로 찾아갔다. 바다와 하늘이,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그 경관에 녹아 들었다.
이 책은 학생인 저자가 7년에 걸쳐 찾은 새만금의 모습을 기록한 일종의 생태 기행서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따라 별 생각 없이 갔던 그곳
이 점차 한 젊은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은 과정이 샅샅이 기록돼 있다. 보고 들은 기간과 두 발로 걸은 거리가 길어 이 책은 다른 어떤 기록물보다 풍성하고 깊다.
2007년, 저자가 화포 염습지를 지날 때였다. 그 전까지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곳인데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만큼 뻘흙이 사라지고 육지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염습지에서 ‘습’자가 빠져 염지가 됐다. 방조제 건설 뒤 찾아온 이런 극적인 변화에 저자는 할말을 잃는다. 하지만 다음 해는 더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땅에서 소금기마저 빠져 나가 온통 민물 습지 식물인 갈대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사람 키를 넘길 정도로 무성했다. 그 전에 염습지를 차지하고 있던 칠면초나 퉁퉁마디 같은 염생식물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생태계는 완전히 변했다. 저자는 ‘7년 답사 중 가장 무모했던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위 내용을 새만금 조사 보고서나 기사에서 다뤘다면 어떨까. 보고서는 ‘염생습지는 육지로 변했고, 식물은 100% 갈대로 바뀌었다’라는 두 문장으로 건조하게 기록했을 것이다. 기사 역시 ‘작년까지 퉁퉁마디가 자라던 염생습지가 갈대밭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처리했을 것이다. 한 번 또는 많아야 두세 번 찾아간 사람이 만든 기록은 시간에 따른 변화나 구석진 지역의 생태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기본 정보는 비슷할지 몰라도 감동이 다르다.
저자는 2003년, 부안에서 시작돼 서울까지 이어지던 방조제 건설 반대 ‘삼보일배’ 장면을 보고 새만금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당시 기자도 서울에 들어온 일행에 합류해 삼보일배를 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막상 해 보니 다른 모습이 보였다. 하다못해 도심지 도로 한복판에 어떤 종류의 미세한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있는지라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직접 해 보면 뭐든지 새롭다. 하물며 7년 동안 문턱이 닳도록 다닌 저자에게 새만금이 누구나 아는 빤한 모습으로만 보였을까. 지역 주민으로부터 들은 생생한 증언, ‘몸으로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갯벌 생명들의 숨은 모습이 귀하다.
지난 7월 일본야생동물보호기금(WWF JAPAN)과 한국해양연구원, 생태지평 등과 함께 일본 해안 도시의 습지보호 사례를 취재간 적이 있다(과학동아 9월호 참조). 그 때 만나는 일본인 공무원이나 시민 단체 사람들, 생태사진작가들이 ‘도요새’나 ‘저어새’, ‘새만금’ 같은 우리말을 거침없이 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새만금이야 지명이니 그렇다 쳐도, 도요새나 저어새는 예상 밖이었다. 둘 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새이긴 하지만, 일본 이름이 있다.
이유는 이 새들이 거처를 잃어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다. 바로 새만금이다. 이렇게 새만금은 우리말 새이름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것이 이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