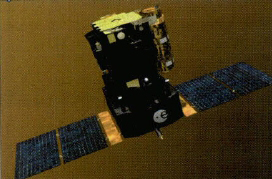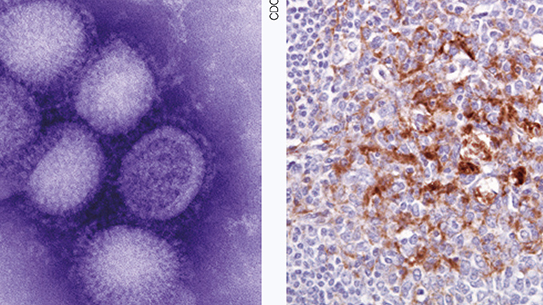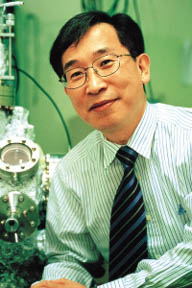
롯데리아 햄버거, 버거킹 햄버거, 맥도널드 햄버거 맛의 미묘한 차이를 곰곰이 따져보는 과학자가 있다. ‘어떤 재료를 쓰길래, 어떤 소스를 쓰길래 맛이 다른 것일까’ 를 고민하는 이는 다름 아닌 서울대 물리학부 국양 교수(51). 택시를 타도 그의 못말리는 호기심이 발동한다. ‘운전기사 아저씨의 고향은 어디일까’ 를 생각하면서 고향을 맞추려고 발음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그 덕분에 요즘은 택시 기사 아저씨들의 고향 맞추기 정답률이 높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국교수의 호기심은 그를 나노세계의 프런티어로 만든 큰 힘이다. 인류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미시영역을 직접 보여준 주사형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을 직접 만들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물질, 새로운 기억매체,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는 동력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러와의 인연

최근 들어 은 나노 입자가 코팅돼 있어 세균이나 곰팡이의 서식을 막는다는 세탁기가 등장하고, 나노 크기의 입자로 이뤄진 자외선 차단제가 여름 상품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더불어 몸속에서 암세포를 찾아가 제거하는 나노 로봇과 각설탕만한 칩 속에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나노 소자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21세기를 나노과학의 시대라 부르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다.
10억분의 1m,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원자들의 세상이다. 1981년 스위스 IBM연구소의 물리학자 게르트 비니히와 하인리히 로러가 STM을 발명하기 전까지 인류에게 예측만 가능하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STM이 개발된 후로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나노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속화됐다. 한마디로 STM은 나노과학의 출발점인 셈이다.
우리는 주변 사물을 눈으로 본다.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시영역은 빛을 이용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짧아 볼 수 없는 원자의 세계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어두운 상자 속 물건을 알아맞힐 때 손으로 표면을 더듬어 모양과 특징을 유추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STM은 바로 손과 같은 날카로운 검침이 표면을 더듬어 원자의 표면을 읽어낸다.
국교수가 STM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벨연구소 연구원 시절인 1982년 겨울. “박사학위를 하던 1979년경 지도교수한테 STM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말한 적이 있어요. 지도교수는 그냥 웃어버리더군요. 그런데 1982년 로러박사가 벨연구소에 와서 자신이 개발한 STM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순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국교수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이란 생각 하나로 STM 제작에 착수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니히와 로러 박사는 1986년 노벨상을 타기 전까지 STM의 공개를 꺼려했다. 뿐만 아니라 STM을 동작시키기 위한 기계 장치, 전기 장치, 소프트웨어 등 너무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벨연구소 연구원들의 방문을 두들겼어요”라며 웃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뭔가 만드는 일에는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도 모르냐면서 무시도 많이 당했죠”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설움보다 몰랐던 것을 배우고 ‘국양표 STM’ 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국교수에겐 더 큰 힘이었다. 그 덕에 STM 개발에 착수한 지 2년만인 1984년 4월 22일 나사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만든 ‘국양표 STM’ 으로 실리콘 원자의 표면을 볼 수 있었다.
‘뚝딱’ 만드는 일은 어려서부터 최고
국교수가 1984년 만든 STM은 국교수와 조교, 단 둘이 만든 작품이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작동되는 STM은 다섯대가 채 안됐다. 뿐만 아니라 국교수가 만든 STM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지면서 전세계 과학자들은 앞다투어 그를 초청했다. ‘국양표 STM’을 만든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과학자들의 러브콜이었던 셈이다.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에 관해 국교수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다. 최근까지도 “형 집에 가서 세탁기도 고쳤는걸요. 제가 가면 고쳐야 할 가전제품들이 모두 나와 있어요”라며 웃는다. 사실 맥가이버를 무색하게 만드는 국교수의 이력은 어려서부터다. 요즘처럼 아파트 생활이 아닌 전통 한옥에서 살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식구들이나 손님이 대문에서 부르는 이름은 언제나 4남 1녀 중 막내인 “양!”. 그러면 어린 막내는 쏜살같이 대문으로 뛰어 나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방안에서 줄만 잡아당기면 됐다. 바로 서울 종로의 과학사에서 구입한 도르래와 줄을 연결해 집안에서도 대문의 빗장을 열 수 있게 되면서부터다.
호기심은 과학자 최고의 덕목
1981년 국교수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PC)가 등장했다. 국교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드라이버를 들고 본체 뒷부분을 뜯어본 것. 이 정도의 호기심은 과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호기심 예찬론을 편다.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라며 “호기심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뜻 보면 사소한 것 같은 호기심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국교수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더 이상 작게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한다. 그리고 한계에 이른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0.13μm의 선폭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의 세계에서 10억분의 1m인 나노세계로 눈을 돌린다. 나노 크기의 저장매체를 활용하면 실리콘 반도체 기억용량이 일반인의 상상을 훌쩍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1997년부터 진행해 온 창의적연구진흥사업단을 이끌면서 풀어가고 있는 과제다.
사실 국 교수에게는 남모르는 즐거움이 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호기심이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호기심이 그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에너지 변환시스템. 만약 미토콘드리아를 닮은 나노 크기의 에너지변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효율 높은 연료전지로도 탈바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꿈의 변환시스템인 셈이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국교수는 오늘도 실험실에서 원자들의 물리적 성질을 밝히고 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에는 모험이 필요해요. 연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모험의 결과보다는 모험 그 자체를 더 즐겨요. 지금 하는 연구의 결과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알고 싶어서, 해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노 세계의 모험가다운 한마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