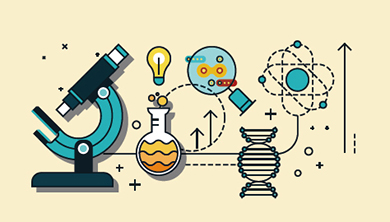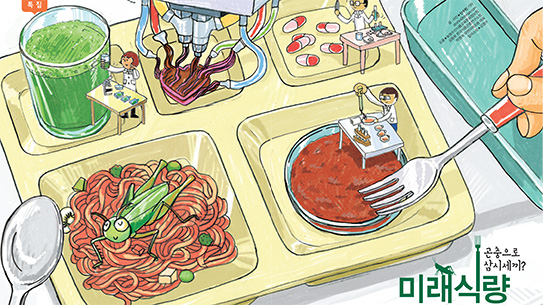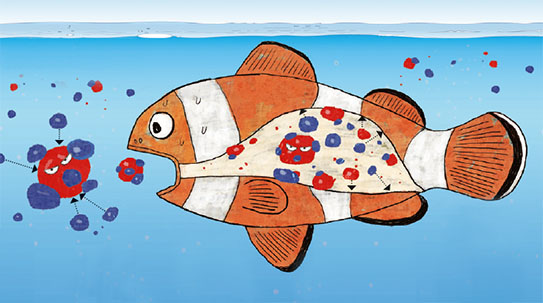살균제처럼 생물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을 ‘살생물제’라고 해요. 이번 사건은 ‘세계 최대의 살생물제 사건’이라 불리고 있어요. 살생물제로 사람이 죽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독제를 마시라고 부추긴 기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은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살균제’를 사람이 마실 수 있게 했다는 데 있어요. 원래 가습기를 살균하려면 가습기를 살균제로 소독하고, 살균제 성분이 남지않도록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 물에 그대로 부어 써도 괜찮은 것처럼 광고하고 또 팔았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습기 살균제는 사람이 호흡하며 들이마실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따라서 식약청 기준에 따라 의약품이나 식품과 같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당시 기업들은 이 제품을 ‘공산품’으로 분류해 신고했어요.
산업자원부에서는 신고 내용만 보고 일반 생활용품용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를 통과시켰어요. 일반생활용품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위험이 없는 제품으로, 용도별로 최소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안전하다는 ‘KC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제품이 소비자가 물건을 믿고 사는 기준인 ‘KC마크’까지 달게 된 거예요.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PHMG 등은 모두 사용법을 지키고 사람에게 닿지 않게 사용하면 아무 이상없는 살균소독제”라며 “윤리를 어기고 잘못된 사용법을 퍼뜨린 기업과 행정기관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탈취제,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제품 7개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소독용 독성 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해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해외에서는 살균제 같은 ‘살생물제’ 규제가 매우 엄격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살생물제를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분리해, 인체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제품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요. 또 유럽에서는 인체대상 제품에 넣을 수 없는, 즉 사람 몸에 조금이라도 닿는 것조차 금지된 화학물질이 500가지가 넘어요. PHMG 등도 여기 들어가지요.
반면 우리나라에서 공산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체대상 제품에 쓸 수 없는 화학물질은 26종에 불과해요. 특히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로 뿌려져서 호흡기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은 최근까지 분명하지 않았지요.
정부는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공산품으로 분류했던 제품들 중 위해도가 높은 8종을 살생물제로 다시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했어요. 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ncis.nier.go.kr/ncis)을 이용해 공산품이나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누구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답니다.
이번 일은 부실한 안전관리와 기업의 잘못된 욕심이 낳은 가슴 아픈 비극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