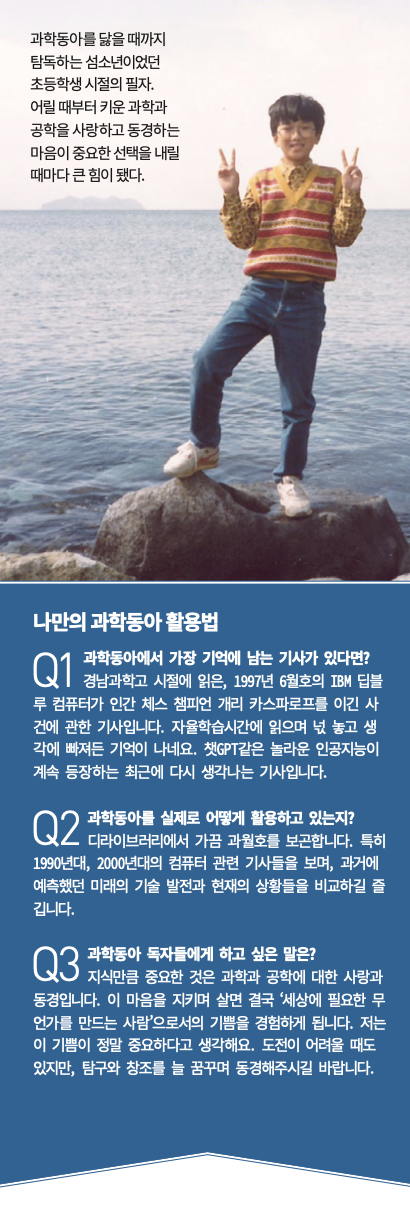얼핏 보면 제 인생은 꽤나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작은 농어촌을 넘나들며 자랐고, 열심히 공부해 과학고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중견 회사, KT 계열사, SK텔레콤을 거쳐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습니다. 카카오에서 일할 땐 고액 연봉자로 신문에도 이름이 올랐죠.
이렇게 나열된 사실만으론 재수 없는 자랑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확신하며 한발 한발 멋지게 나아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상은 실제의 저와 거리가 있습니다. 제 모든 선택의 순간들은 혼란스러웠고, 선택한 후에도 늘 번뇌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제 안에 ‘과학과 공학을 향한 동경’이 있었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학이 좋은 걸 어떡해
돌아보면 큰 선택을 내려야했던 생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당시엔 서울의 공대와 지방의 의대, 한의대의 차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선 의학 계열로 가길 바랐죠. 하지만 ‘난 공학이 좋은걸’이란 마음으로 서울의 공대에 진학합니다. 작은 지방에서 자랐던 터라 서울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 과학고 동기 중 다수가 의대, 치대에 가는 걸 보며 내 선택이 너무 이상적이진 않은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큰 선택은 대학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죠. 이 무렵 ‘이공계 기피 현상’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피가 점점 심해지자 좀 삐딱해집니다. ‘여태 과학, 공학 외길을 걸었는데, 내가 기피 대상이라니!’
그래서 산업공학과 대학원의 금융공학 연구실에 진학합니다. 금융공학을 전공하면 수학과 컴퓨터를 결합한 ‘퀀트’로 증권사, 투자은행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금융계에서 성공해 보겠어’란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공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는 공학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죠.
졸업 후엔 컴퓨터로 돌아갔고, 병역 특례가 끝날 때쯤 또 갈림길에 섰습니다. 두 가지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하나는 여의도에서 퀀트로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몇 년 전 선망한 직업이었죠. 연봉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금융맨이 각광받던 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KT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KTH였습니다. 제 관심 주제인 대용량 분산처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월급은 금융 쪽의 절반이고, 근무지도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 선택의 연속
결국 이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합니다. KTH의 ‘분산처리 연구소’로 갑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억울했죠. 공대 대신 의대를 간 과학고 동기들도 떠오르고, 이번에 좋아하는 일 대신에 포기한 여의도의 연봉도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포잡’을 뛰었어요. 보통 일을 두 개 하면 ‘투잡을 뛴다’고 하는데, 네 개를 했죠.
낮엔 KTH에서, 밤엔 원격으로 미국 뉴욕의 팬시(Fancy)란 스타트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여러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 자문을 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같은 연구기관, LG 등 대기업 연구소에서 특강을 했죠. 잠이 줄고 수입은 늘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면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자존심도 영향을 미쳤죠.
몸은 힘들어도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면서 많은 신사업 기회를 찾았죠. 전체 공정의 최적화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거나, 상품 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매출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전문인 직업이 부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며 통계와 기계학습으로 이 데이터들을 포괄하는 패턴을 찾아내, 비즈니스 기회로 확장하는 사람들.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1세대 데이터 사이언스티스트가 됐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며 저는 SK텔레콤에 스카우트돼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를 만드는 초기 멤버로 합류했죠. 한국 최대 규모의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고 좋은 경험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자 또 고민에 빠집니다. 일이 반복되면서 저의 성장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남은 선택지는 창업이었습니다.
SK텔레콤은 대기업 중에서도 업무 환경, 대우, 복지가 가장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꿀이 흐르는 곳을 떠나 창업의 광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한없이 고민했죠. 어쨌거나 결국 퇴사했고 대표로서 기계학습 회사를 차렸습니다. 창업은 힘든 일이었지만 다행히 일이 잘 풀려, 이 회사를 카카오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엑싯(exit)’에 성공한 것이죠.
이후엔 카카오에 합류해 이사 직함으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기업용 카톡 메시지의 최적화나, 카카오 광고 엔진의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일도 했습니다. 충분히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퇴사했습니다. 야생도 두 번째로 나오니 할 만하더군요. 이번엔 ‘데이블’이란 기계학습 회사에 합류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총괄하는 CDO(Chief Data Officer)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데이블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더 큰 회사인 ‘야놀자’에 매각해, 또다시 엑싯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선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젊었을 땐 ‘선택을 잘해야 좋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대를 갈 수 있을 때, 공대를 갔죠. 금융공학에서 공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융맨 대신 프로그래머를 택했습니다. 대기업을 스스로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선택들 각각은 딱히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은 찰나에 일어나고 그 후의 시간은 정말 길어요. 선택의 가치는 선택 후에 쌓는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바보처럼 보이는 과거의 선택도 몇 년 뒤엔 바뀔 수 있습니다. 틀린 선택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걸 옳게 만드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말이죠.
두 번째 깨달음:자신만의 곱셈 찾기
고등학생 때 저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과학고 친구들은 ‘초천재’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이기나’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지는 사람이면 어쩌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1%가 될지, 가능은 할지 걱정했죠.
그런데 1%는 재능이 필요해도, 5%는 어떻게든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5%에 들면 됩니다. 5% 곱하기 5%는 0.25%. 1%보다 드문 인재죠. 말장난 같지만 유의미합니다.
저는 업계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알려져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의 두 영역에서 실력을 쌓으려 노력했고, 이 둘을 조합했을 때 매우 많은 기회가 창출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조합을 찾길 바랍니다.

선택과 곱셈의 이유
이 글을 쓰며 다시 떠올려봅니다. 섬마을 학교의 모든 책을 읽고도 모자라, 이미 본 과학동아를 너덜너덜해지도록 읽던 기억들. 과학고의 빡빡한 시간들 사이에, 과학동아를 읽으며 대학 가서 하고 싶은 연구를 상상하던 날들. 그때 읽었던 내용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기분들은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키운 것은 지식보다도 ‘과학과 공학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어른이 되서도 제 마음의 중심에 남아서, 이후 제가 해온 많은 선택의 근간이 됐습니다. 지금 과학동아를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그 마음이 있겠죠. 10년이 지나도 그 마음과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