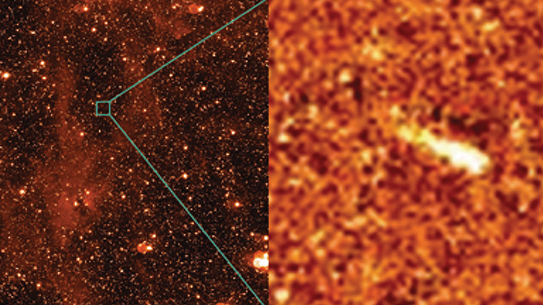“어려운 거 있으면 찾아와서 말해, 인마!”
1월 6일 오후, 전미영 앙코르 대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예지동 시계골목을 거쳐 세운스퀘어까지 걸었다. 전 대표는 20분 정도 걸렸던 동행길 내내 만난 모든 상공인과 인사를 나눴다. 상공인들은 전 대표를 반기며 특유의 ‘츤데레’ 식 격려를 보냈다. 그는 “제가 망할까봐 걱정하세요, 다들”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전 대표는 앙코르를 “시계골목의 미래를 상상하는 디자인 그룹”이라고 소개한다. 앙코르는 예지동 시계골목을 포함해 청계천 일대 도심제조업의 산업문화와 기술력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를 시민과 신진 시계기술자들에게 물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세운상가에 시계골목 팝업스토어를, 온라인으로는 빈티지 시계를 판매하고 복원하는 시계기술 큐레이션 플랫폼 ‘앙코르’를 운영한다. 과거 예지동 시계골목이 그랬던 것처럼 시계기술자와 상인, 그리고 시민을 연결하는 것이 앙코르의 목표다.
전 대표가 예지동 시계골목에 빠져든 건 2019년 일이다. 그는 원래 폐기물에 관심이 있던 인류학 연구자였다. “예지동 시계골목에 처음 발을 들인 것도, 냉면 먹으러 와서였어요.” 그는 “신발이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면 쓰레기가 되지만, 신발장에 들어있으면 신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시계라는 물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며 “시계라는 물건도 요즘은 그리 귀히 보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이 골목은 시계를 보석처럼 귀히 대하는 곳이라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석사 학위논문 주제를 예지동 시계골목으로 결정했다. 2020년 제출한 ‘산업화 ‘너머’의 작업장-예지동 시계골목의 기술과 문화’를 준비하며 논문에 목소리를 담은 사람만 44명.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전 대표는 “나이도, 성별도, 생업의 영역도 다른 기술자분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직접 시계 수리기술을 배우고, 골목에서 살다시피 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그를 예지동 시계골목 상공인들은 ‘특이한 애’라고 부르면서도 받아들였다.
원래 서울대 박물관 인류민속부 학예연구원으로 문화유산 관련 행정 업무를 하던 그다. 전 대표는 앙코르를 ‘박물관’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큐레이터’로 지칭했다. 시계골목 팝업스토어는 두 개의 층으로 구분돼있다. 시계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전시하는 공간인 2층은 전시관의 역할을 한다. 1층엔 네트워크 작업장이 있어 시계 수리 의뢰인, 시계기술자, 그리고 신진 시계기술자가 한 곳에서 소통한다. 박물관에서 보존처리실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한쪽엔 수리되거나, 수리되길 기다리는 시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이 창고는 수장고로 불린다.
전 대표는 “시계를 수리하는 기술은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복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복원은 물건을 빛나는 새것처럼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의뢰인의 경험, 물건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을 수리해 고장 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시계기술자의 기술은 복원에 특화돼 있다. 그는 “현재 앙코르는 서울시 미래유산팀과 협업해 이 일대 기술자들이 근대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복원의 명수’로 활약하도록 연결하고 있다”고 했다.
“하나의 분야가 50~60년간 성장하면 내부에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걸 간과하지 않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하죠. 미래 세대가 이런 노하우를 자기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전 대표의 수장고에서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에 들은 소리였다. 정다운 이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망하지 마시라’는 인사를 전하며 그의 박물관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