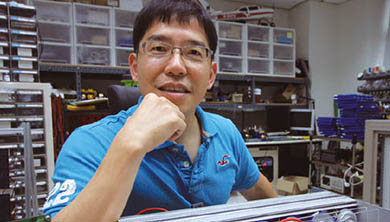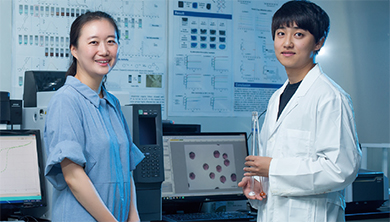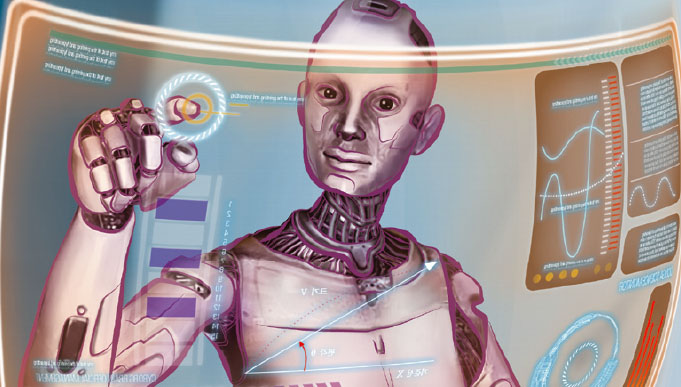5월 초 세상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미합동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송된 것. 탄저균은 치사율이 80%가 넘는 생화학 테러 물질이다. 치사율이 10% 안팎(6월 말 대한민국 기준)인 메르스 바이러스와는 독성이 비교도 안 된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5월 27일 이 사실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기 전까지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살상력 크고 공기로 전염돼
민간 배송업체 페덱스를 통해 배달된 탄저균(공식 명칭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 )) 표본은 포자형태의 액체 1mL로, 냉동 상태로 3중 포장돼 있었다. 미국 국방부는 미생물 취급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됐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탄저균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이유는 보관과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탄저균은 흙속에 서식하는데, 환경 조건이 나빠도 분말 포자 상태로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열이나 소독에도 강한 저항성을 나타낸다(주한미군은 표본을 락스 성분의 표백제에 넣어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도 탄저균의 무서운 점이다. 보통은 오염된 동물의 배설물, 사체 또는 흙에 닿았을 때 감염되지만 때로는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도 체내에 침투할 수 있다. 탄저균이 체내에 들어오면 초기에는 약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악화돼 호흡곤란이나 쇼크가 온다. 증상이 나타난 뒤 24시간 이내에 다량의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의 80%가 사망한다.
누구를 위한 생물학 무기 감시인가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다. 당시 미국과 일본, 독일, 소련 등 강대국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개발했다. 하지만 탄저균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아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1978년 구소련에서는 탄저균 유출 사고가 발생해 70여 명이 사망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우편을 이용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이런 실제 사례를 봤을 때 탄저균 10kg을 대도시 상공 위로 살포하면 100만~300만 명이 사망한다는 일부 언론의 추정은 과장된 면이 있다). 미국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세웠다. 이번에 배달 사고를 낸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다.
주피터 프로그램에는 탄저균과 보툴리늄, 두창, 페스트, 야토병 등 10여 가지 위험한 생물학 물질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감시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왜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반입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에 대해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