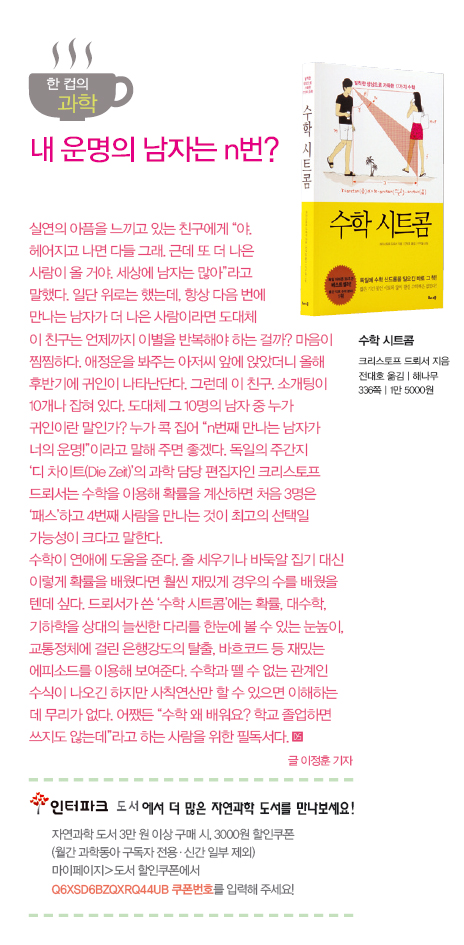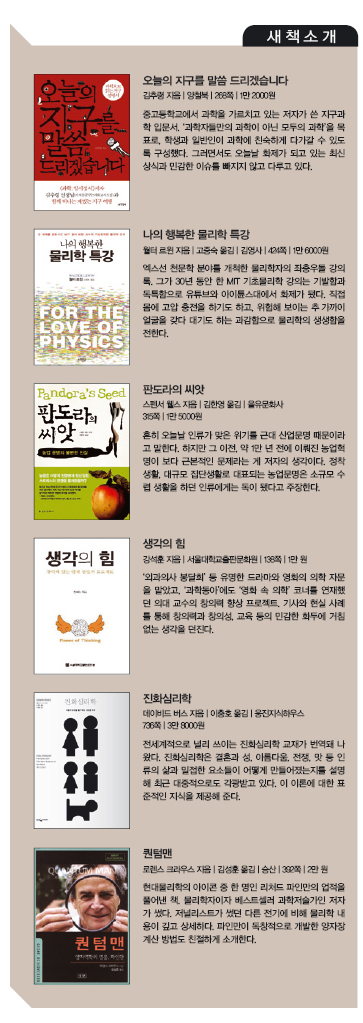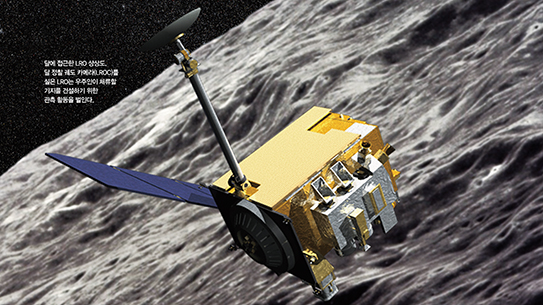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번 달에도 그들의 예술 능력에 대한 과학뉴스가 실렸다(20쪽). 과학동아는 작년 3월 네안데르탈인 특집(‘안녕! 네안데르탈인’)을 통해 국내 일반인들 사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졌던 여러 사실들을 새롭게 소개했다. 그 중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의 피부색이었다. 여러 매체에서 만든 복원도나 상상도는 대부분 네안데르탈인을 털이 많고 피부가 검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유럽에서 100여 년에 퍼졌던 잘못된 상식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중위도인 유럽에서 진화했고, 일부는 시베리아까지 퍼져 살았다. 이 지역은 오늘날 흰 피부를 지닌 사람들이 산다. 적도 부근보다 햇빛이 강하지 않아 멜라닌 색소를 지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안데르탈인이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인류에 대해서는 어떨까. 피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꼽아보자. 서너 가지 이상 떠올릴 수 있다면 비교적 관심이 많은 독자다. 대부분은 피부색이나 미용을 제외하고 나면 할 말이 사라질 것이다.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니나 자블론스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쓴 ‘스킨, 피부색에 감춰진 비밀’을 읽어보면 피부가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하며 중요한 장기인지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의 원제는 ‘피부(Skin)’. 여기에 ‘자연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진지하게 연구되지 않던 피부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반면 우리말 제목은 사회적, 정치적 ‘구별짓기’와 차별의 상징인 피부색을 다른 특징들보다 더 전면에 내세웠다. 차별은 민감한 주제다. 그래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독자들이 책에 관심을 보였고, 신문에서는 다시 한번 ‘인종적 차별과 편견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해설 기사를 썼다. 제목을 ‘피부의 자연사’로 붙였다면 이런 반응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책이 피부색 이야기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은 피부색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촉각, 성적 역할, 미적 기능, 털, 땀, 화장 등 피부에 관해 상상 가능한 모든 주제를 꼼꼼히 되짚었다. 피부색의 진화는 그 중 하나였고, 다른 모든 특징에 비해 특별히 더 부각해야 할 주제가 아니었다. 피부색을 인종주의라는 특별한 주제와 연관시킨 것은, 피부의 겉모습만 강조한 사람들의 왜곡된 관심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한마디 더. 이 책을 읽은 소감을 트위터에 올리자 한 현직 의사가 말을 건넸다. 주류의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진화의학을 이야기해 눈여겨봤다는 내용이었다. 피부 속 엽산과 비타민 D를 파괴하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멜라닌을 발달시켰고, 그 결과 피부색이 위도에 따라 달라졌다는 부분이었다.
인류의 진화와 관련한 이런 내용에 주류의학은 관심 자체가 없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국내든 국외든 의학자가 인류 진화 연구를 주도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과거나 진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