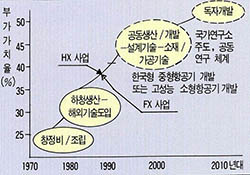두나무가 오랜 세월 붙어 자라면 두가지가 이어져 한나무가 되는 연리지가 된다. 이 현상은 몇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연리지에 숨어 있는 귀한 인연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가까이 자라는 두나무가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서로 합쳐져 한나무가 되는 현상을 연리(連理)라고 한다. 두몸이 한몸으로 합쳐진 모습으로 인해 예로부터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에 비유되곤 했다. 알기 쉽게 ‘사랑나무’라고도 부른다.
나뭇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연리지(連理枝), 줄기가 이어지면 연리목(連理木)이다. 연리목은 가끔 볼 수 있으나 가지가 붙은 연리지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 가지는 다른 나무와 맞닿을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맞닿더라도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좀처럼 붙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땅속의 뿌리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연리현상이 줄기나 가지보다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난다. 좁은 공간에 서로 뒤엉켜 살다보니 맞닿을 기회가 많아서다. 연리근(連理根)이라고 불러야 하나 쓰지 않는 말이다. 베어버리고 남아있는 나무 등걸이 몇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는, 잘리지 않은 옆 나무와 뿌리가 연결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연리지가 말하는 사랑의 미학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은 너무 빨리 변해간다. 자고 나면 업그레이드를 생각해야 하는 정보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가장 전통적이고 우리다워야 할 사랑의 방식과 가치관도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 ‘같이 삽시다/ 살아 봅시다/ 과연 우리 서로 잘 맞는지 어떤지를 겪어 보면 어떨지/ 점포맘보….’ 거참! 사랑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가벼운 놀이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쉰세대’에게 이 노래가사는 거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인스턴트 사랑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때의 유행일 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이라는 기본 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을 같이 하는 과정을 연리지로 승화시킨 옛 사람들의 사랑 방식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잔잔한 감동을 준다.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송나라 범영이 쓴 역사책 ‘후한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후한 말의 대학자인 채옹이란 사람은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다가 돌아가시자 무덤 곁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묘를 지켰다.
얼마 후 채옹의 방 앞에는 두그루의 나무가 서로 마주보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차츰 두나무는 서로의 가지가 맞붙어 마침내 연리지가 됐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채옹의 효성이 지극해 부모와 자식이 한몸이 된 것이라고 칭송했다. 이때부터 연리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세월이 한참 지나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에 연리지를 인용하면서는 남녀 간의 변함없는 사랑의 뜻으로 더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서기 736년 무혜왕비를 잃고 방황하던 56세의 현종은, 남도 아닌 자신의 열여덟번째 아들 수왕 이모(李瑁)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게 됐다. 비극으로 끝난 이들의 사랑이야기는 양귀비가 죽고 50여년이 지난 서기 806년, 유명한 시인 백거이에 의해 장한가(長恨歌)라는 대서사시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수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이야기에 연리지는 단골손님이 됐다.
우리 역사 속에도 연리지는 일찌감치 등장하는데, 남녀 간 사랑의 뜻만 아니라 상서로운 조짐으로 받아들였다. 때로는 선비들의 우정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여염에서는 이 나무에 빌면 부부사이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내물왕 7년(362) 4월에 시조 묘의 나무가 연리됐으며, 고구려 양원왕 2년(546) 2월에 서울의 배나무가 연리됐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에도 광종 24년(973) 2월에 서울 덕서리에서 연리지가 발견됐으며 성종 6년(987)에 충주에서도 연리지가 생겨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리지는 그 출현을 일일이 역사책에 기록할 만큼 희귀하고 경사스러운 길조로 여겨져 왔다.

천년만의 모습, 우리 앞에
사랑의 상징으로 예부터 희귀하고 기쁜 일로 생각한 연리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정확하게는 자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십년에 걸쳐 사랑의 밀어를 나누고 있는 현장이 들킨 것이다. 2000년 7월,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에 있는 운문호 옆의 작은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귀향한 몇사람과 동네 사람이 모여 세상사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란히 선 소나무 두그루가 가지를 내밀어 서로 꼭 붙잡고 있는 ‘이상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전설처럼 알려져 오던 신비스런 연리지의 진짜 모습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이가 40-50년쯤으로 추정되는 이 연리지 소나무는 도로에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깊은 산속의 북쪽 비탈에 나란히 서있다. 땅위 약 2.6m 높이의 굵은 가지 하나가 뻗어 아래쪽에 있는 나무를 꼭 잡고 있다. 손을 내민 쪽의 소나무가 지름 한뼘 정도에 키 10여m 정도이며, 한발짝 떨어져 내민 손을 반갑게 잡고 있는 나무는 이보다 조금 작다. 마치 등산에 나선 부부가 비탈길에서 넘어지려는 아내 손을 꼭 잡아주자, 가슴으로 손을 감싸안고 정겹게 남편을 올려다보는 형국이다. 이 연리지 나무는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해온 순수 우리 소나무라는 점에서도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외 전국적으로 알려진 연리지는 충남 예산의 공주산업대학 본관 앞에 있는 연리지다. 두그루의 히말라야시다 중 왼쪽 나무의 첫번째 가지와 두번째 가지가 서로 붙어있다. 아랫가지는 윗가지를 바쳐주고, 윗가지는 아랫가지를 보듬어 안고 있는 모양이 아름답다. 이 연리지는 두나무의 가지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나무의 가지가 서로 연결된 것이므로 전형적인 연리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에 자라는 아름드리 곰솔은 뿌리목 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다. 아마 옛날에는 뿌리가 서로 이어져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노출돼 가지처럼 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
연리가 되는 과정은 이렇다. 가까이 심겨진 두나무의 줄기나 가지는 자라는 동안 지름이 차츰 굵어져 맞닿게 된다. 양쪽 나무에서 각각 해마다 새로운 나이테를 만들므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로를 심하게 압박한다. 우선 맞닿은 부분의 껍질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괴되거나 안쪽으로 밀려나면서 맨살이 그대로 맞부딪친다. 남남으로 만난 둘 사이에는 사랑의 스킨십이 이뤄지면서 물리적 맞닿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결합을 준비한다.
먼저 지름생장의 근원인 부름켜가 조금씩 이어지고 나면, 다음은 양분을 공급하는 유세포가 서로를 섞는다. 마지막으로 나머지의 보통 세포들이 공동으로 살아갈 공간을 잡으면 두몸이 한몸이 되는 연리의 대장정은 막을 내린다. 고욤나무에 감나무 접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런 나무를 잘라보면 마치 쌍가마를 보고 있는 듯 두개의 나이테 두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 세포의 이어짐은 적어도 10여년이 넘게 걸리고 결국은 한나무와 꼭 같아진다. 양분과 수분을 서로 주고받음은 물론이고 한쪽나무를 잘라버려도 광합성을 하는 다른 나무의 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
연리목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4-5년 생 정도의 같은 종류 어린 나무 두그루를 구해 한걸음 정도 떨어지게 심고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를 기다린다. 두나무가 맞닿을 줄기 부분의 껍질을 약간 긁어내고 탄력 있는 튼튼한 비닐 끈으로 묶어두면 연리목이 만들어진다. 나무의 종류는 자귀나무나 음나무가 좋다.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증산작용을 줄이기 위해 잎을 닫아버린다. 마주 보고 서있는 두 자귀나무가 잎을 닫고 붙어있는 모습은 의좋은 부부를 연상시켜 연리목으로는 그만이다. 또한 음나무는 사랑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어 이 역시 연리목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소나무와 참나무처럼 종류가 다른 나무는 수십년이 아니라 수백년을 같이 붙어 있어도 그냥 맞대고 있을 따름이지 결코 연리가 되지 않는다. 세포의 종류나 배열이 서로 달라 부름켜가 연결될 수 없으며 양분 교환은 어림없는 일이다. 완전한 연리란 같은 종의 나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랑으로 승화
옛 사람들은 덕망 있는 군주가 천자의 지위에 오르면 신비스런 봉황새가 출현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낙향한 선비들은 벽오동나무 한그루를 심어두고 봉황새가 내려앉는 날을 기다렸다. 사실은 임금님이 잊지 않고 불러줄 ‘사랑의 메시지’를 고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긴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좀처럼 날아올 것 같지 않은 상상의 새 봉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앞에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연리지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 초만 해도 드물게나마 모습을 보이던 연리지가 이후 1천년을 넘긴 긴긴 세월까지 어인 일인지 한번도 그 귀한 자태를 내비치지 않았다. 그동안 아예 연리지는 생기지 않았던지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은 탓인지, 우리의 기록에 연리지 ‘현물’이 나타난 예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영화 ‘은행나무 침대’에서처럼 사랑의 인연이 1천년 뒤에 나타나듯이, 고려 성종 6년(987) 이후 기록상으로는 처음 모습을 보인 연리지의 출현은 21세기의 첨단 과학문명 시대에 들어선 오늘에도 전설로만이 아니라 분명 길조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진 연리지가 연인, 부모와 자식, 통치자와 국민, 그리고 부자와 빈자 사이 모두를 묶어‘사랑나무’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