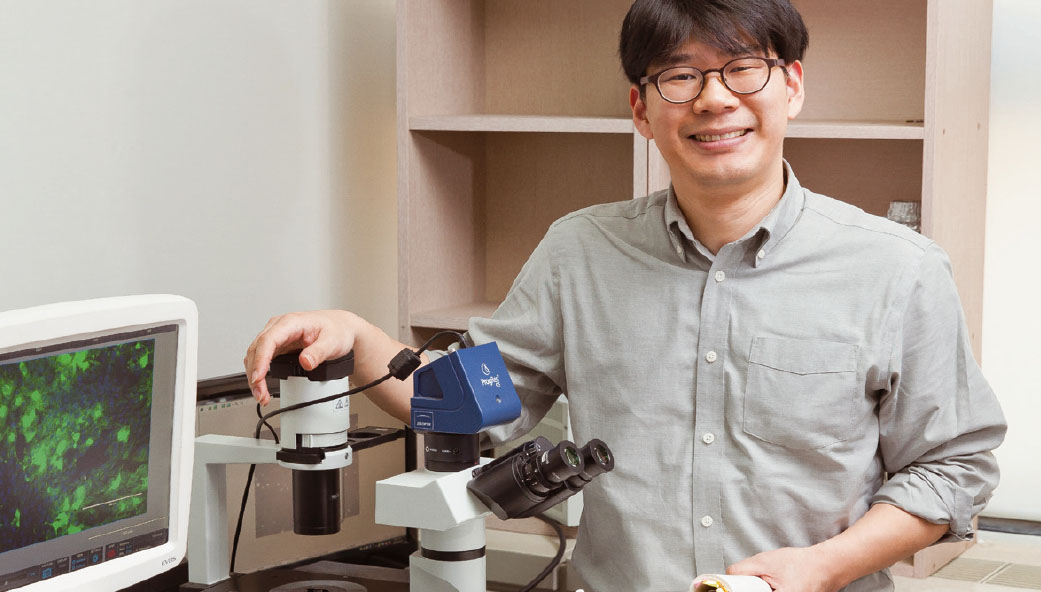생물이 생을 마치는 모습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루살이보다 짧게 사는 생물도 있고, 집단의 수를 줄이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종류도 있다. 코끼리는 죽을 곳을 스스로 찾아간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장자(壯者)는 부인이 죽었을 때 울지 않았다고 한다. 울기는 커녕 항아리를 두들기며 노래를 불러 문상 온 혜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함께 살며 늙어 온 부인이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단 말인가, 노래까지 부르다니.” 혜자가 나무라자 장자는 이렇게 답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나도 슬펐지. 그러나 생각해보니 인간이란 원래 생명을 지닌 것이 아니었어. 혼돈 속에 뒤섞여 있던 것이 변해 기운(氣運)을 낳고 그 기운에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생명을 얻어 살아왔을 뿐이야. 생명을 지녔던 형체가 또 변해서 죽어갔으니 계절의 순환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 편안히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고 소리쳐 운다는 게 오히려 천박한 짓이지.”
이 글은 ‘강원도민일보’의 칼럼 ‘면경대’에서 인용한 것이다. 장자는 ‘인생은 모두 천명에 따른다’는 숙명론을 취해 후세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무엇보다 장자의 사상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이란 한 단어로 압축된다. 즉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장자는 지구가 언젠가는 사람의 간섭을 받아 결딴이 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 듯하다. 또 장자는 현대 생태학의 이론인 ‘물질순환’ 원리를 이미 터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죽으면 먹히고 썩어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생물체에 들어가 ‘형체’를 이룬다는 것을.
장자의 숙명론에 따르면 생자필멸(生者必滅), 즉 생물은 어느 것이나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고야 만다. 죽지 않는 생물은 없다. 그런데 생물의 죽는 모습은 모두 제각기다.

하루살이보다 짧은 생
흔히 단명(短命)을 논할 때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곤충의 한 무리인 하루살이를 예로 든 것이다. 하지만 하루살이는 실제로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사는 하루살이는 꼬리하루살이, 무늬하루살이 등 50여종이 보고돼 있다. 물 속에 낳은 알은 한달 안에 깨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1-2년을 물 속에 살다가 성충(成蟲)으로 자라 날개를 달고 땅 위로 날아오른다. 이 성충을 가리켜 보통 하루살이라 부른다. 즉 하루살이는 새끼 시절은 길지만 어미가 돼서 사는 기간이 짧다. 정말로 하루만 사는 놈도 있지만 보통 2-3일은 예사고 길게는 14일 넘게 사는 것도 있다. 명이란 긴 놈과 짧은 놈이 따로 있으니 하루살이의 생존기간도 하루살이 나름이다.
하루살이 성충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암수 모두가 교미에만 몰두한다. 어떻게 허기진 배를 무시하며 한가지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을까. 물에서 나와 공중을 날 때 이미 몸에 많은 양의 지방을 비축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도 며칠을 견딜 수 있다. 이처럼 양분 저장용으로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에서 약 4cal의 열이 나오지만 지방은 그 두배가 넘는 9cal 이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루살이에 비해 짧게 생을 마치는 생물도 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중에 효모(yeast)라는 단세포생물이 있다. 술을 만드는 발효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이다. 효모 가운데 몸의 일부를 떼어내 번식하는(출아법) 종류를 실험실에서 키워보면, 어미 효모는 출아를 8회에 걸쳐 행하고 난 뒤 죽어버린다. 1회 출아에 약 1시간이 걸리므로 불과 8시간이 일생인 셈이다. 이에 비해 몸이 둘로 나눠지는 이분법(二分法)으로 번식하는 효모나 세균은 끝없이 분열하기 때문에 수명을 논하기 어렵다.
출아효모보다 수명이 더 짧은 생물도 있다. 버섯이 그것이다. 1천년을 넘게 사는 버섯이 있다는 말도 전해지지만, 여름 날 비온 뒤 음습한 곳에 돋아난 먹물버섯의 경우 햇볕을 받고 몇시간이 지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삭아버리고 만다.
이들에 비해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물의 최후를 관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약육강식의 혹독한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일이 다반사이다 보니 ‘제 명대로 못사는’ 동물이 많기 때문이다. 물고기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모천(母川)에 회귀하는 연어나 송어는 제가 태어난 강에 와서 알을 낳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생존기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기껏해야 5년 남짓한 기간이다.
하지만 바다에 사는 고등어나 호수의 붕어는 몇년을 살다가 죽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강이나 바다의 수면은 한없이 평온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약육강식의 피 터지는 싸움이 매순간 벌어지고 있다. 나이 먹은 고기가 힘이 조금 빠지는 날에는 귀신도 모르게 젊고 건강한 놈들이 달려들어 잡아먹어버린다. 그래서 ‘제 명대로 다 살다가 죽는 물고기는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코끼리의 전설
때때로 생물이 죽는 모습은 인간에게 숙연함을 안겨준다. 집단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레밍쥐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행에 예민해서 맹목으로 남을 따라 행동하는 일을 레밍효과(lemming effect)라 한다. 여기서 ‘레밍’은 다리가 짧고 작은 귀에 부드럽고 긴 털을 가진 설치류 레밍쥐에서 따온 말이다.
노르웨이에 사는 레밍쥐(Lemmus lemmus)는 보통 쥐와는 다른 괴이한 행동을 한다. 레밍쥐의 집단은 3-4년만 지나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봄이나 가을의 하루를 잡아 야음을 타고 여러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나중에는 대낮에도 집단으로 이동한다.
이들의 종착지는 바닷가다. 거기서 막다른 벼랑에 다다르면 처음에는 멈칫 바다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며 도망갈 곳을 찾다가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알아차리고는 그만 바다에 빠져버린다. ‘집단 자살’이 자행되는 것이다. 확실한 원리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때가 되면 늙은 쥐들이 죽어줌으로써 집단의 밀도를 낮춰 결과적으로 종족보존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 있다. 이런 일은 3-4년 주기로 반복해 일어난다.
‘집단적인 죽음’을 행한다고 알려진 또다른 동물은 코끼리다. 코끼리는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때가 되면 떼를 지어 한 곳으로 가서 죽는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코끼리라는 이름은 ‘코’가 큰 동물들이 ‘끼리끼리’ 모여 산다고 해서 붙여진 듯하다. 이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경험 많은 늙은 코끼리의 안내를 받아서 계절에 따라 물과 먹이를 찾아 다니는, 가족의 끈이 단단한 동물이다.
코끼리는 인도에서 사람 이상으로 신성시되는 동물이다. 흰 코끼리(백상)에서 부처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것도 한가지 사례다. 그래서인지 코끼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할 줄 아는 영물(靈物)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코끼리가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무리를 지어 정해진 굴로 찾아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는다는 얘기가 전해져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그 ‘전설의 묘지’를 찾지 못했다. 가끔 여러마리의 코끼리가 함께 죽은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가다가 깊은 늪에 빠졌거나 갑자기 흘러내리는 모래더미에 묻혀 죽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식물 세계에서도 인간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죽음이 관찰된다. ‘절개의 상징’으로 알려진 대나무가 대표적인 사례다. 흔히 대나무의 단단하고 꼿꼿한 외양을 보고 ‘높은 절개’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말은 대나무가 죽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바가 크다.
비 온 뒤에 대나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우후죽순’(雨後竹筍)이란 말이 있듯이 죽순이 나와 자라는 속도는 무척 빨라서 시간당 3cm에 이른다. 때로는 줄기가 불어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힘차게 자란다. 번식은 땅 속에 줄기를 뻗어내며 행하는데, 멀리는 그 줄기가 1km를 뻗는다. 수명이 1백년이 넘는 대나무도 있지만 한국의 왕대나 솜대는 60년, 조릿대는 5년 안팎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만 꽃을 피우고 죽는다. 어느날 갑자기 온 동네 대나무들이 꽃이삭을 달고 얼마간의 개화기를(길게는 9년) 지내고 나면 줄기의 잎은 물론이고 땅 속에 뻗은 줄기도 죽어버린다. ‘선비의 나무’ 대나무도 시듦이 있어 어느날 온 대밭이 말라버리고 만다니 절개를 지키는 선비답게 끝이 깨끗해서 좋다.

못난 고추의 생존 전략
생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바로 자손이라는 자신의 씨앗을 남기고 떠나기 때문이다.
낚시꾼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 있다. 산란기에 피라미나 붕어의 암놈을 낚아 올려 낚시바늘을 뽑아내는 순간 이 물고기들은 배에서 누런 알을 사정없이 쏟아낸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나는 죽는다. 고로 새끼를 남기고 죽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로 무서운 본능이 아닌가.
식물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가 많다. 밭에 고추를 키우면서 자주 겪는 일이다. 다른 밭곡식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다 키가 작고 줄기가 땅딸막하게 비틀어진 녀석이 있다. 다른 고추에 비해 자라나는 모양이 형편없지만 언제인지 모르게 녀석은 남보다 재빨리 한두개의 빨간 주머니를 매단다. 모든 힘을 고추 익기에 쏟아부은 결과다. 못나기는 해도 열심히 열매를 맺고 죽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서운 생명력에 전율을 느낄 지경이다.
그런데 사람도 고추나 피라미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다. 취직 시험을 갓 보고 나온 수험생이 화장실로 달려가서 갑자기 사정(射精, 정자를 쏟음)을 한다거나, 30km 강행군을 하던 군인이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정을 해버리고 마는 일이 있다. 심한 충격과 위기감이 죽음을 예감케 했기에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죽음의 양태가 다를 뿐이지 한번 태어나면 죽고 마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유전인자를 남기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죽음 없이 영생(永生)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만생만물(萬生萬物)이 오늘도 후손 번식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