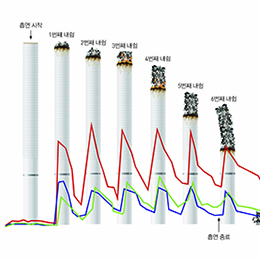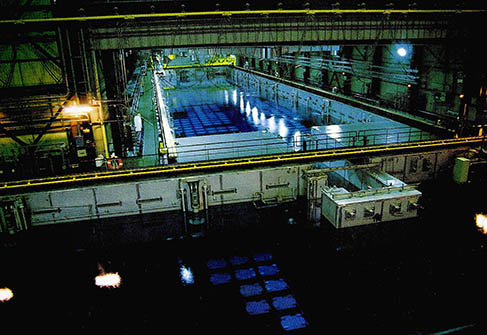인류는 46억년이라는 지구 역사의 한 순간에 살고 있다. 불과 1백년도 못사는 인간이 외길 인생을 얘기하는 것은 가소로울지도 모른다.
어렸을 땐 꿈도 많았다. 어머니는 의사가 되라고 주문했고 누나들은 과학자가 되라고 주문했다.
내가 지질학의 외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싹트기 시작한 동네의 바위산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소학교 2, 3학년 때까지 학교 앞동산(함북 청진 천마산)을 보고 온 세상이 그러한 바위 산으로 돼 있으리라 믿었다.
그 후 30리 떨어진 시골 샛강가에 널려 있는 각양각색의 자갈에 매혹돼 종류마다 주워와 책장에 진열하곤 했다. 때로는 석필석(활석)을 캐느라고 그 맥을 찾아 산 넘어 산을 헤매기도 했다.
지질학은 이렇게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에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다. 최근 들어 첨단과학에 밀려 소외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후회없이 지질학을 고수하련다. 또 40여년이라는 교단생활의 외길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 전 30여년 살았던 서울 수유리에서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했다. 남들같이 집을 굴려 재미도 못본 채 너무나 민하게 오랫동안 살았다. 이것 모두가 나의 외길 인생의 옹고집일지도 모른다. 얼마 남지 않은 대학 강단에서 그동안 씨 뿌리고 가꾼 열매를 따기 위해 여력이 다할 때까지 이 길을 가련다.

뒷줄 왼쪽부터 세번째가 김동학씨(한국자원연구소장), 네번째가 조병기씨(2차대전때 남양군도에 징용돼 일본의 패전도 모른 채 전후 10여년간 야생생활을 한 적이 있음), 여섯번째가 정창희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여덟번째가 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