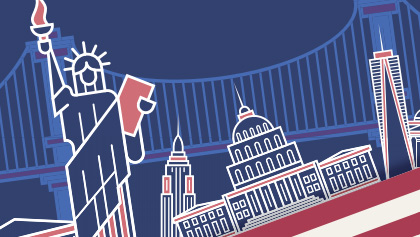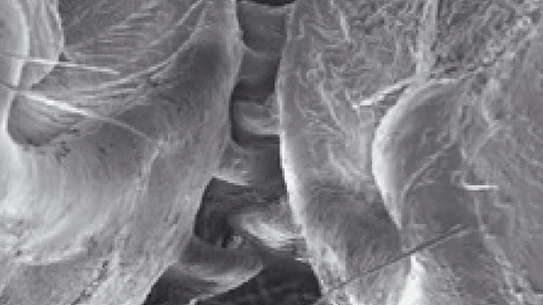심신의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하인로드다. 수면장애에 대한 논문 속에서 이 용어를 서술했다. 그러나 심신의학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연구와 진료가 활성화된 것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됐다.
심신의학이 의료계 내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적인 이유로 시대 변천에 따르는 질병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근대 의학의 발전으로 전염병이나 감염병과 같은 외인성 질환(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병균으로 인한 질병)에 따른 환자수나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성인병이나 만성병 같은 내인성 질환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성인병이나 만성병을 진찰할 때는 심리·사회적인 면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암과 같은 성인병은 식생활, 기호품(술, 담배), 노동, 수면, 운동 등 오랜 세월에 걸친 잘못된 생활습관의 축적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질병이 만성화되면 2차적으로 여러가지 심리적 불안감이나 사회적 활동의 저하를 일으킨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처럼 고도의 기술화된 사회, 관리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성이나 삶의 의미를 잃기 쉽다. 또 장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더욱이 가치관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사람은 마음 놓을 곳을 잃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복잡한 대인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까지도 합쳐져 다양한 심신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즉 예전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질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신의학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일반화된 용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심신의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각 진료과에 들어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중요한 조언을 해준다. 이에 비해 독일의 심신의학은 내과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1976년 이래 하이네만 대통령의 명에 의해 심신의학이 의학교육 과목으로 채택됐고, 국가시험에도 필수과목으로 출제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도 심신의학의 역사가 제법 깊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은 어떨까. 우리의 심신의학은 정신과에서 그 일부가 강의되고 있는 정도에 그친다. 1992년 국내에서 2개의 관련 학회가 창립됐다. 이 중 대한신심스트레스학회는 임상의사, 기초의학자, 심리학자, 간호학자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회지로 ‘스트레스 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또다른 조직인 한국정신신체의학회는 정신과의사들만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으며, 학회지로 ‘정신신체의학’을 간행하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500(500원)이 필요합니다.
1999년 04월 과학동아 정보
🎓️ 진로 추천
- 의학
- 심리학
-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