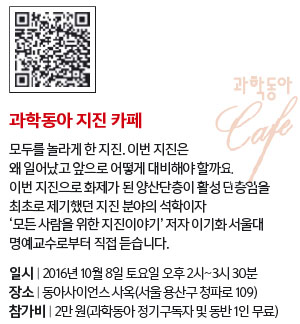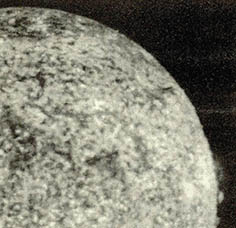노벨상 시즌이 왔다. 과학기자에게 노벨상은 미묘한 존재다. 도처에서 ‘노벨상 타령이 과학계를 오히려 멍들게 한다’는 질타를 듣는다. 노벨상이 수~수십 년 전 연구 성과를 갈무리하는 전형적인 후행지표이며, 따라서 결코 현재나 미래의 과학수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다. 하지만 대중에게 과학 정보를 전파하는 게 일인 과학기자 입장에서는 최고급 과학 정보가 뉴스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연중 과학행사라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벨상 발표를 일종의 축제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가, 잘못한 사람 벌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잘 한 연구자를 상찬하는 자리니까.
여러 해 노벨상 관련 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다. 한국은 아직 노벨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냉정한 현실이다. 한국은 해외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과학을 배워와 국내 젊은 학생에게 전파하는 데 대부분의 자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던 개발도상국이었다. 그들과 겨뤄볼 만한 여유를 찾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없진 않다. 가끔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망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층이 두텁지 않다. 거의 매년 수상자를 내는 일본의 경우, 그렇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만 매년 여러 명이다. 수준급 과학자의 저변이 넓다는 뜻이다. 해외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연구를 좇지 않은 지도 한참이다. 과학 분야 일본 수상자 21명 중 국외에서 최종학위를 받은 사람은 세 명뿐이다. 나머지는 다 일본에서 최종학위를 받고 연구한 국내파다.
유학을 가도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의 밑으로 가길 선호하는 우리는 여전히 추격형 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선두에 서라, 모험을 해라 말만해서는 변하는 게 없다. 그래서 과학선진국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데이터로 따져보기로 했다. 최영준 기자와 우아영 기자가 연구비 지원 형태, 연구자의 공동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해 봤다. 또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영국과 독일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고, 정책 연구자와 노벨상 수상자들을 탐문해 대안을 물어봤다.
결과? 성급함부터 버리자. 결과에 대한 목마름을 넣어두자. 어차피 우리는 노벨상을 기대하기에 이르다. 운이 좋으면 하나나 두 개의 노벨상을 때 이르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다다. 연구비 조금 줬다고 보고서 내놓으라 폭탄 던지지 말고, 이제 좀 살 만하다고 노벨상 언제 나오냐고 채근하지 말자. 그 대신 노벨상을 낳을 연구 생태계를 키우자. 거기서 나온 연구자가 인류와 인류의 지성을 위해 좋은 연구를 하게 하자. 노벨상 이야기는 그때 꺼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