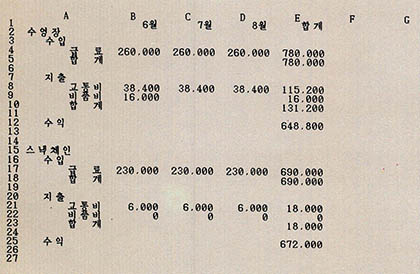시작은 바닥에 떨어진 깃털 하나였을 것이다. 해변에서 반짝거리는 조개 껍데기를 줍듯, 나뭇가지 사이와 흙바닥 위에 흩어진 깃털들을 그러
모아 머리 위나 헐벗은 허리춤에 꽂아 봤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점차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옷을 갖춰 입고 오두막이 생기고 고상한 취미와 문화가 생기면서, 여성들은 깃털 얹은 모자에 열광하게 됐고 부유한 수집가이자 과학자들은 보존 처리가 잘 된 표본에 감격하게 됐다. 그들은 아름다운 새들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사냥꾼들은 돈벌이를 위해 닥치는 대로 새를 쏘아 죽이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 불어온 미국 남부의 목재 열풍은, 새들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아마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마 이 정도의 사냥으로, 이정도의 벌목으로 새가 몽땅 죽어 나갈 거라고는. 지저귀는 새들은 숲 지천에 널려 있었고, 한 종의 전체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은 없었다(오늘날 과학기술로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큼직한 상아색 부리로 나무를 쪼아대는 그 우렁찬 소리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았을 때 멈춰야 했다. 새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미국 최초의 자연보호 단체들이 탄생하고 강력한 조류 보호 법안들이 만들어졌지만, 당시 사람들의 욕망은 이미 최대치로 들끓는 상태였다. 죽은 뒤 우아하게 모자 위에 얹어지고 당당하게 박물관에 전시됐던 새들은, 서식지마저 빼앗긴 뒤 ‘살아있는’ 상태로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책은 미국 남부 저지대의 울창한 숲을 주름잡았던 ‘흰부리딱따구리’가 불과 한 세기 만에 사라져 버린 멸종의 역사를 되짚는다. 아울러 이 새를 손에 넣으려고 안절부절못했던 사람들, 혹은 이 새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았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한다. 국제자연보호협회 활동가로 일하며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논픽션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저자는, 이 새가 왜 사냥됐고 서식지는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뭉근하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그의 또 다른 저서인 ‘문버드’처럼,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풀어 쓰는 방식으로 독자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흰부리딱따구리의 흔적을 되짚고 있는 책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릇 그 새만의 것은 아니다. 야생 조류를 비롯해 절멸 위기의 동물들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동물에게는, 지금이 바로 절멸을 늦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