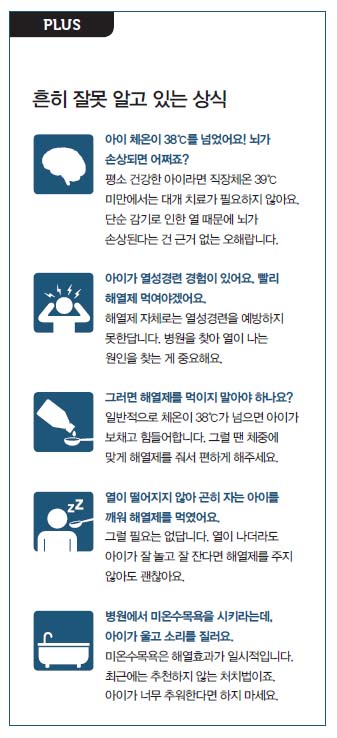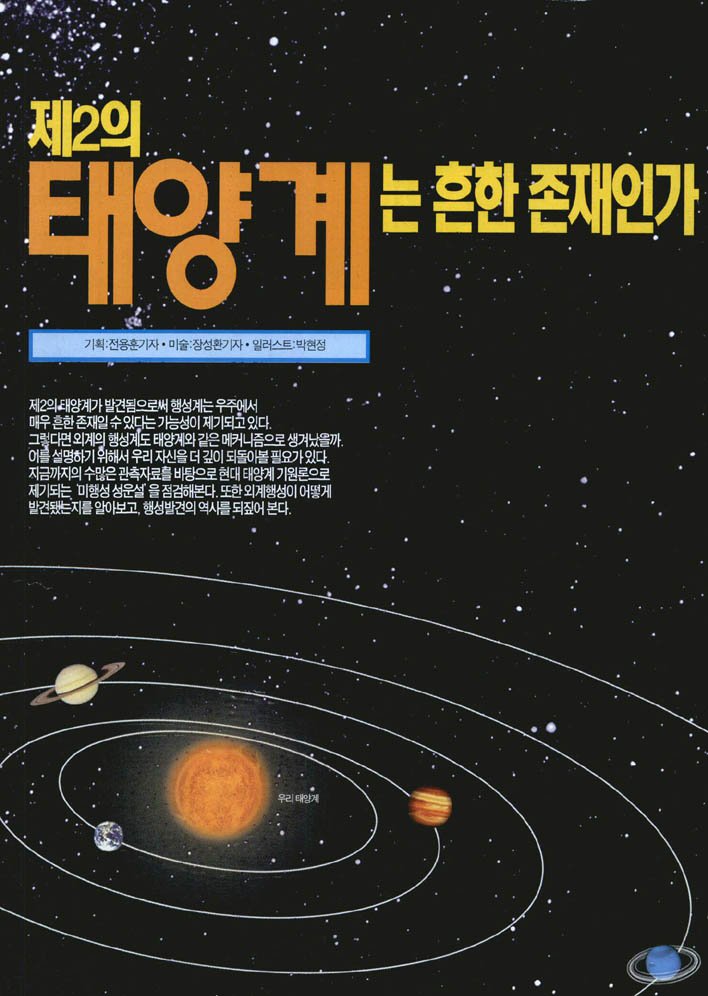“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 아이가 더 편하게 열을 낼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열성경기라도 일으키면 책임지실 겁니까? 열이 날 땐 미온수로 씻겨서 열을 내려줘야 합니다.”
얼마 전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웹툰을 연재하는 한의사 C씨가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병과 싸우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작용인데, 아이들은 면역체계가 미숙해 열 내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며 “이불을 덮어주라”고 조언한 것이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과 수많은 의료인이 ‘잘못된 정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마도 이들은, 열감기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눈이 돌아가는 자녀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본 경험이 있을 터였다.
열날 때는 오히려 얇은 이불을 덮어라
호된 질타에 C씨는 1주일 뒤 “감기 초기 오한이 날 때만 이불을 ‘살짝’ 덮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다. 직장인 Y씨는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숨 자고 나면, 감기가 말끔하게 나은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쯤 되니 헷갈린다. 어린아이가 열이 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니 열심히 열을 식혀줘야 할까, 아니면 몸이 병마와 싸울 땐 열이 잘 나게 도와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불을 덮는 것은 열이 더 오르고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 미온수목욕은 몸 안에서 열을 내게 하는 발열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 효과가 일시적이고 변화가 미미한 데 비해 아이가 괴로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 처치다. 김진선 조선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아이가 추워서 몸을 떨면 열이 생산돼 체온을 오히려 올릴 수 있다”며 “얇은 것을 덮어주면 몸이 떨리는 것을 방지하면서 열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도 2013년 발표한 지침에서 “두꺼운 이불이나 옷은 벗기고 얇은 옷을 입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열이 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정상적인’ 면역반응이다. 만성질환이나 선천성 장애가 없고 평소 건강한 아이에서는 직장체온이 39℃ 미만이라면 대개 치료가 필요 없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38.3℃ 이하의 미열이면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 체온이 41℃를 넘어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처치해야 하는 ‘고체온증’이 아니라면, 대개는 시상하부가 체온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41℃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얘기가 다르다. 면역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발열 초기라도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3개월 미만의 아이가 38℃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

‘발열공포’가 아이를 괴롭힌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열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부적절하게 대처한다는 점이다. 이를 ‘발열공포(fever phobia)’라고 부른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 바턴 슈미트가 1980년 발표한 논문에서 유래됐다. 그는 “81쌍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부모의 52%가 ‘아이가 40℃미만의 열로도 심각한 신경학적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무려 85%의 부모가 아이의 체온이 38.9℃가 되기도 전에 해열제를 먹인다”고 밝혔다. 발열공포라고 정의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런 우려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부모가 해열제를 잘못 쓰고 있다.
이런 발열공포는 어디에서 유래된 걸까. 김도균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에 대한 공포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인간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과거의 아픈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보다 생활 환경이나 의료 수준이 열악했던 시절, 특히 심각한 뇌수막염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다 귀가 멀고 뇌손상도 입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기억이 우리에게 열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진선 교수는 “의료진조차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수용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법으로 소아 발열을 관리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발열공포가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백신이 개발돼 심각한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줄었으며, 의료 수준이 높아져 설사 감염되더라도 치료에 실패하는 확률이 줄었다. 즉, 요즘 아이들이 열이 나는 원인은 대부분 3~4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부모들의 염려는 대부분 비현실적인 두려움이다.
하지만 김 교수팀이 올해 4월 ‘아동간호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부모들의 발열공포는 여전하다. 연구 대상자의 절반이 37.8℃를 발열의 최저기준 체온으로, 38.9℃를 고열의 최저기준 체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발열과 고열은 각각 38.0℃ 이상, 40.0°C 이상으로 정의한다. 또한, 74.8%가 열이 나는 아이를 미온수로 목욕시킨다고 응답했다. 78.1%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뇌손상을 일으킬까 봐 ‘매우 걱정 된다’고 답했다. 그 결과, 소아 외래나 응급실을 불필요하게 자주 방문했다.
특히 해열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4.2%가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해열제를 복용시킨다고 답했다. 심지어 6%는 아이가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문을 통해 좌약 형태의 해열제를 투여하고 있었다. 열이 나는 아이에게 부모가 가장 조치하기 쉬운 게 해열제 투여다 보니, 남용이 심한 것이다.


세균감염 위험 먼저 살펴야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열에 대한 지나친 공포로 해열제를 잘못 써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NICE는 “해열제 자체로는 열성경련을 막을 수 없다. 열성경련 예방을 목표로 해열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물론 해열제를 먹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아이의 체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경우에만 고려하라는 것이다. 이은혜 경희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체온이 38℃가 넘으면 아이가 보채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해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통 해열제의 사용간격은 4~6시간이다.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계열의 약을 섞어 자주 먹여서는 안 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다. 3일 이상 고열에 시달린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 교수는 “아이가 열이 날 때 뇌막염이나 요로감염, 패혈증 등 심각한 세균감염인지 단순한 바이러스성 질환인지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에 대한 공포로 ‘해열’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는 태도는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아이를 더욱 괴롭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