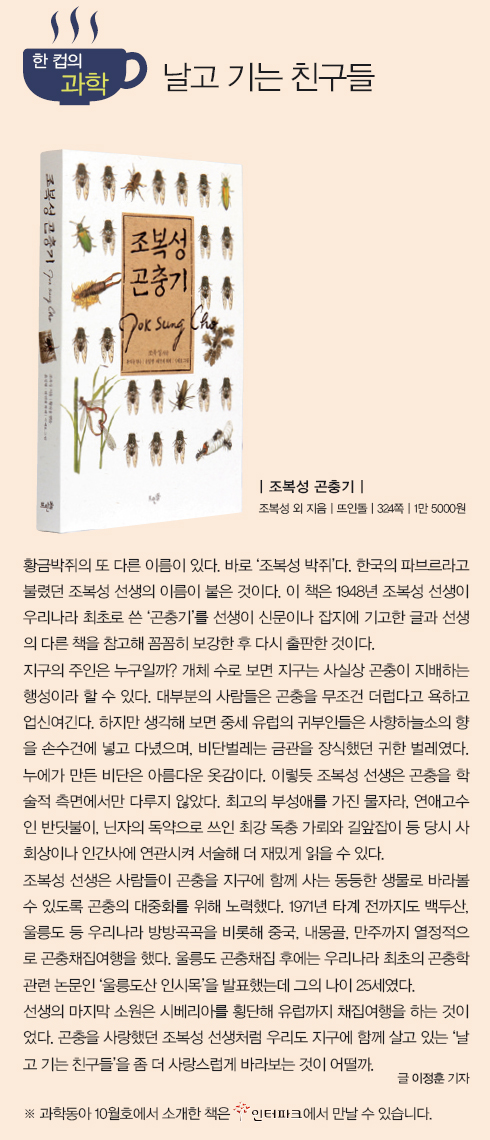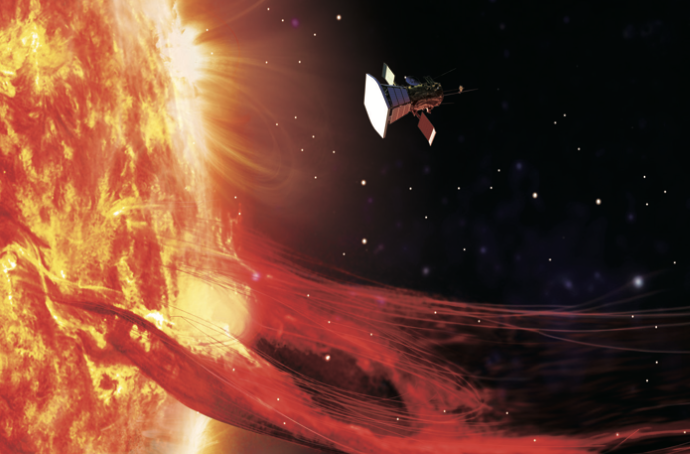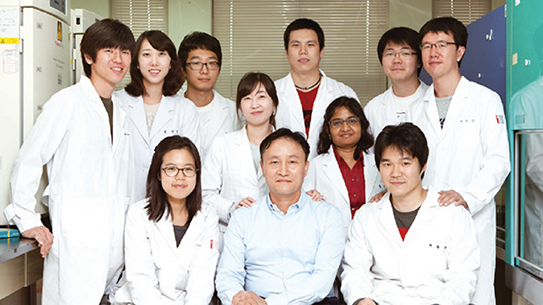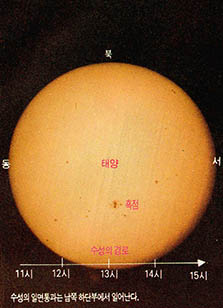어렵고 복잡한 과학 개념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 전전긍긍할 때, 또는 추상적인 물리학이나 우주론 책을 읽으며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때 종종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자나 힘, 형광 염료로 염색된 세포, 그래프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 등에 대해서 열심히 썼는데, 정작 가을 길가에 핀 꽃의 이름에는 무지할 때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안도현 시인은 ‘무식한 놈’이라는 시에서 “쑥부쟁이와 구절초를/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라고 노래했는데, 가끔 기자도 ‘무식한’ 자신과 절교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과학책 역시 마찬가지다. 과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감동 없는 감탄을 하고 만다. 첨단과학의 심오한 세계를 탐구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끔은 문학적이고 사색적인 어조로 자연을 관찰하는 과학책을 읽어도 좋지 않을까.
‘달팽이 안단테’는 그런 목적에 어울리는 책이다. 이 책은 분명 정통적인 의미에서 과학책이 아니다. 희귀병으로 병상에 누운 저자가 우연히 선물 받은 제비꽃 화분에서 달팽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을 이고 사는 달팽이의 천형에 병을 이고 사는 자신을 감정이입해가며 쓴 주관적인 자연 관찰기다. 그나마 저자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달팽이 이야기보다 달팽이에 대한 책 얘기를 더 자주 한다. 사이사이 자신의 병에 대한 절제된 감상이나 희망도 내비친다. 어딜 보나 잘 쓴 에세이지 과학책이 아니다.
그런데 막상 읽고 나면 어느 과학책보다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과학의 뿌리인 자연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찰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전문적인 달팽이 연구자보다 더 자세히 오래 관찰했지만, 자신이 하등한 연체동물을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의 시선’을 버린 채 자신도 하나의 달팽이가 된 기분으로 대했다.
물론 저자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저자는 하루 중 거의 모든 시간을 좁은 방 안에서 함께 지냈으면서도 달팽이가 사라질 때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글 속에서 달팽이는 그냥 ‘달팽이’일 뿐이다. 이름을 붙이거나 분류를 하는 일은 인위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애완동물처럼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 두려웠던 것일까.
따지고 보면 자연을 관찰했던 오래 전 조상들은 자연을 분석이 아니라 여유와 위트로 바라봤다. 이 책이 언급한 사례만 해도 그렇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박물학자들은 달팽이의 애정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한 저자는 ‘구애행위는 대단히 특이한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우화에 나오는 큐피드의 화살을 그대로 구현한다. 서로 교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날개달린 침을 찌른다’고 썼다.” 여기서 침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 달팽이 일부 종이 쏘는 탄산칼슘 구조물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신화를 떠올리는 것은 분명 문학적 상상력이다.
이 책의 원제목은 ‘야생 달팽이의 식사 소리’다. 병으로 몸을 못 움직이는 저자에게 달팽이가 먹이를 먹는 작고 느린 소리는 사그라들고 있다고 느끼던 생명의 소리였다. 자연이 자연을 먹고 다시 자연이 되는 과정이다. 느리게, 오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기에 들을 수 있었던 느린 깨달음의 소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