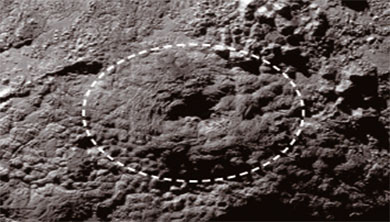지난 2008년 일본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5월 일본 정신신경학회 등 4개 학회는 공동으로, 우울증은 암이나 심장병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우울증을 ‘국민병’으로 규정했다. 일본에 왜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에서 저자인 에단 와터스는 “미국의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일본인을 몽땅 환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울증이 1990년까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은 전통우울증인 ‘유우츠’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추구해야 할 미덕으로 여겼다. ‘유우츠’는 심신의 절제를 뜻하는 단어다. 이는 미국의 우울증(depression)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GSK는 일본의 ‘유우츠’를 미국의 우울증과 동일시했다. 그리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며 감기에 걸릴 때 약을 먹듯 우울증도 쉽게 치료하라고 광고했다.
이런 GSK의 마케팅으로 일본에서 우울증 약을 먹는 환자수가 200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일본 파나소닉 건강보험조합 예방의료부의 토미타카 신이치로 부장은 “경증의 우울은 자연스럽게 낫지만 일본에서는 우울을 빨리 발견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약물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현상을 설명했다. 정신질환은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령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소한 사회적 모욕에도 장기간 원한을 품는 ‘아모크’란 정신착란에 걸리고, 중동에서는 일종의 빙의 현상인 ‘자르’가 널리퍼져 있다. 탄자니아 자치령인 잔지바르의 정신분열증도 미국과는 원인과 증상이 다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들은 세계의 다양한 정신질환을 모두 미국식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DSM)’에 있는 정의와 치료법은 국제 표준이 됐다. 게다가 미국 과학자들은 정신의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를 운영하고 학회를 개최한다.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 자금을 대고 약물치료 마케팅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도 미국의 제약회사들이다. 미국은 이제 정신질환도 패스트푸드와 랩 음악처럼 미국식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인들이 즐겨하는 “어딜 가든 우리가 있다”란 말은 정신질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jpg)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 | 에단 와터스 지음 김한영 옮김 아카이브 376쪽 1만 8000원]
그러나 미국식 치료는 종종 다른 문화와 충돌하곤 한다.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온 뒤 미국은 이곳 사람들을 돕겠다며 상담사를 파견했다. 상담받던 한 소년이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상담사는 소년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서 불행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폭풍, 가난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는동안 스리랑카 사람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어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찾았다. 이들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큰 재난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담사는 소년에게 미국식 정신과 치료를 강요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소개하며 “서로 다른 정신질환의 개념과 다양한 치료법이 사라지는 것을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대할 때처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고유의 방법은 동식물의 멸종처럼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다양성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위험해진다”며 “홍콩의 거식증 소녀가 미국식 치료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등 책에 있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울증이 1990년까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은 전통우울증인 ‘유우츠’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추구해야 할 미덕으로 여겼다. ‘유우츠’는 심신의 절제를 뜻하는 단어다. 이는 미국의 우울증(depression)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GSK는 일본의 ‘유우츠’를 미국의 우울증과 동일시했다. 그리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며 감기에 걸릴 때 약을 먹듯 우울증도 쉽게 치료하라고 광고했다.
이런 GSK의 마케팅으로 일본에서 우울증 약을 먹는 환자수가 200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일본 파나소닉 건강보험조합 예방의료부의 토미타카 신이치로 부장은 “경증의 우울은 자연스럽게 낫지만 일본에서는 우울을 빨리 발견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약물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현상을 설명했다. 정신질환은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령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소한 사회적 모욕에도 장기간 원한을 품는 ‘아모크’란 정신착란에 걸리고, 중동에서는 일종의 빙의 현상인 ‘자르’가 널리퍼져 있다. 탄자니아 자치령인 잔지바르의 정신분열증도 미국과는 원인과 증상이 다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들은 세계의 다양한 정신질환을 모두 미국식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DSM)’에 있는 정의와 치료법은 국제 표준이 됐다. 게다가 미국 과학자들은 정신의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를 운영하고 학회를 개최한다.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 자금을 대고 약물치료 마케팅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도 미국의 제약회사들이다. 미국은 이제 정신질환도 패스트푸드와 랩 음악처럼 미국식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인들이 즐겨하는 “어딜 가든 우리가 있다”란 말은 정신질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jpg)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 | 에단 와터스 지음 김한영 옮김 아카이브 376쪽 1만 8000원]
그러나 미국식 치료는 종종 다른 문화와 충돌하곤 한다.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온 뒤 미국은 이곳 사람들을 돕겠다며 상담사를 파견했다. 상담받던 한 소년이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상담사는 소년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서 불행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폭풍, 가난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는동안 스리랑카 사람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어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찾았다. 이들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큰 재난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담사는 소년에게 미국식 정신과 치료를 강요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소개하며 “서로 다른 정신질환의 개념과 다양한 치료법이 사라지는 것을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대할 때처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고유의 방법은 동식물의 멸종처럼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다양성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위험해진다”며 “홍콩의 거식증 소녀가 미국식 치료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등 책에 있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