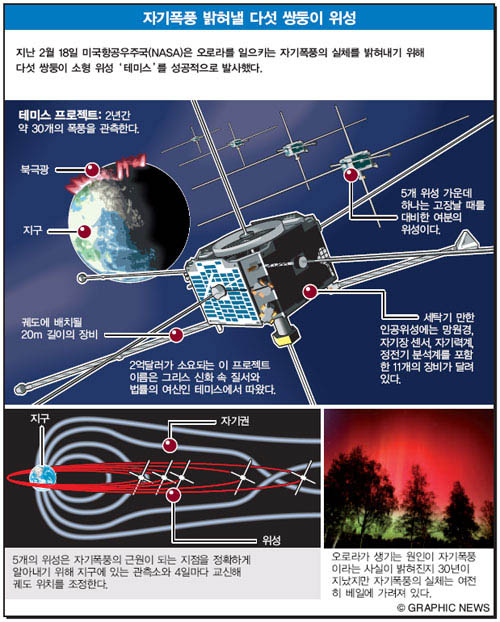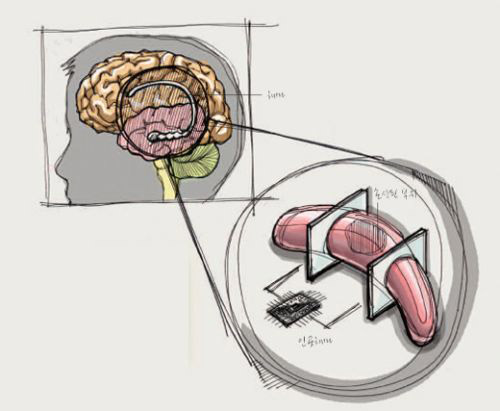|파브르 곤충기3|장 앙리 파브르 지음|김진일 옮김|현암사|484쪽|1만9500원
PROLOGUE
“…역자가 파브르와 그의 곤충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40년도 더 되었다. 마침 30년 전엔 1975년 파브르가 학위를 받은 프랑스 몽펠리에 이공대학교로 유학하여 197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시절 우리나라의 자연과 곤충을 비교하면서 파브르가 관찰하고 연구한 곳을 발품 팔아 자주 돌아다녔고 언젠가는 프랑스어로 쓰인 파브르 곤충기 완역본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소원을 3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룬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탐구생활을 옆구리에 낀 채 산천을 내 집처럼 누볐던 과학소년, 소녀라면 누구나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배추흰나비를 정처 없이 쫓으며 채집망을 휘둘러 잡았을 때의 쾌감과 그 조그만 몸통에 실핀을 꽂아 표본으로 만들 때의 쓰라림은 어린 마음 속에 박제처럼 남았다. 요즘은 방학숙제로 내주던 곤충채집이 자연보호를 이유로 금지되면서 곤충과 만날 기회도 자연스레 줄었다.
꼬물거리는 곤충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보였다면 ‘파브르 곤충기’의 입김이 컸다. 프랑스의 과학자인 파브르는 예리한 눈으로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하며 본능과 습성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오롯이 담은 파브르 곤충기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곤충학의 성경’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테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책이 바로 파브르 곤충기 아닐까. “세상의 곤충은 파브르의 눈을 통해 비로소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역자의 말처럼 파브르는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존재이며 파브르 곤충기는 한국인의 필독서다. 하지만 국내에서 출판된 파브르 곤충기는 부분만 발췌한 번역본이거나 요약본이 대부분이다.
40여 년을 곤충과 동고동락한 성신여대 김진일 교수는 파브르 곤충기 완역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나긴 번역작업에 매진했다. 이 책은 2006년 출간된 1권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책으로 ‘곤충의 기생생활’을 다룬다. 앞으로 7권의 책이 더 나올 예정이니 아직은 예고편일 수도 있다. 역자는 동식물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과 가장 가깝게 바꿨고 파브르의 개성 있는 문체는 맛깔나게 살려 번역했다. ‘한국판 파브르 곤충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치는 줄도 몰랐단다.
인간 세상과 마찬가지로 곤충의 세계도 살기 위한 투쟁으로 가득하다. 남의 둥지를 가로채거나 심지어 남의 애벌레 몸속에 자신의 알을 낳기도 한다. 진화론자들은 기생을 하는 벌들은 게으르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하지만 파브르는 정색을 하며 이를 반박한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기생벌은 노동벌보다 더 고되게 살아간다. 기생할 둥지를 찾아 헤매고 통로를 뚫어 알을 낳기까지 둥지를 하나 짓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기생벌은 왜 그토록 고단한 길을 택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해 파브르는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질문꾼으로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생물의 기원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쩌면 곤충들이 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거나 의문을 던지는 일 자체가 불필요한지도 모른다. 세심한 관찰자인 파브르는 그가 관찰한 곤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길 원했다.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려는 진화론과 지독한 과학의 잣대를 배제한 채 말이다.
곤충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파브르 곤충기를 제대로 읽어보는 건 어떨까. 잠시 멀어졌던 자연과 가까워지고 과거의 추억까지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앙 장리 파브르
1823년 프랑스 남부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자연에 관심이 많아 수학, 물리학, 화학을 스스로 공부해 깨우쳤다. 우연히 읽은 곤충잡지가 계기가 돼 ‘파브르 곤충기’를 탄생시켰다. 56세에 1권을 출간한 뒤 30년 동안 모두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