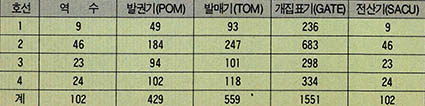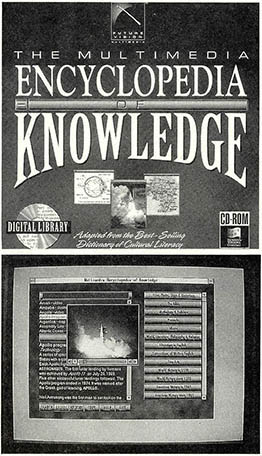1808년 외딴 섬마을 동화도에서 종이가 수송선과 함께 불타는 사고가 벌어진다. 사건 해결을위해 '조선과학수사대' 원규 일행이 동화도로 파견된다. 섬에 도착한 첫날, 참혹한 살인 사건이 원규를 기다리고 있다. 나무에 꽂혀있는 시체가 나타난 것이다. 시체를 살피던 원규는 말한다. "찍힌 부위에 출현이 심하지 않고 상처 부위가 부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죽은 자를 다시 나무에 꽂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을 쓰고 수발총을 들고 다니는 조선 후기 수사관의 등장.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혈의누’는 조선시대 수사관 원규(차승원)가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학적인 수사 모습으로 관객의 흥미를 더했다.
원규는 법의학서인 ‘증수무원록’과 ‘신주무원록’에 근거한 추리를 통해 용의자를 지목했다. 검시는 죽은 시체 모양대로 검시화를 그리고 사인을 조목조목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첨단 영상장비와 유전자 감식기를 활용하는 현대 수사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두 무원록의 내용과 추리 과정은 충분히 과학적이었다.
조선의 수사 모습은 어땠으며 현재 과학수사와 얼마나 다를까. 영화 ‘혈의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과, 조선시대 살인사건 기록문서인 ‘검안’에 남아있는 실제 수사 모습을 통해 확인해보자.

| 사인을 속이려 주검에 창을 꽂았다 |
‘혈의누’ 첫 살인사건에서 시체를 검시하던 원규는 신주무원록 하권 1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견을 밝힌다. 사람이 죽어 심장이 멈춘 후라도 몸에 깊은 상처를 내면 혈관에 고여 있던 피가 상처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 그러나 심장이 뛸 때 출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호스 구멍 밖으로 분출하는 물과 잠근 상태에서 호스에 남아있다가 흘러나오는 물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 출혈의 상태를 근거로 한 수사관 원규의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는 “무원록은 색깔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과장된 표현이 많다”며 “다만 살아서 창에 찔린 경우 쏟아지는 피가 조직 속으로 들어가 찔린 부위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질식사를 추정하다 |
영화에서 첫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갇혀있던 독기(유해진) 역시 시체로 발견된다. 독기의 사체를 찬찬히 검시하던 의원은 다음과 같이 소견을 말한다. “목을 맨 흔적이나 자상은 없습니다. 시체의 상태로 미뤄 질식사가 틀림없습니다.”
보통의 시체는 혈액이 굳기 마련인데 질식사의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 다만 각 장기에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고인 ‘울혈’(鬱血)이 나타난다. 따라서 질식사한 시체는 코 안에 핏물이 흐를 수 있으며 얼굴이 울혈에 의해 약간 벌겋게 보인다. 현대 과학수사대는 내장 장막을 부검해 점막에 출혈된 실핏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질식사 과정에서 버둥거리며 몸부림쳤을 상황을 고려해 검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봉우 박사는 “눈동자는 시체가 부패한 모든 경우에 돌출되며 질식사와 무관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질식사의 일반적인 증상과 신주무원록의 지침은 일치하지만, 몇 가지 관찰 사항만으로 사인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선시대 무원록은 현대 법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학적인 근거가 약하며 섣부른 일반화를 저지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금의 현장 검시 방법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독창적인 검시 방법이나 해석도 보인다. 오늘날 과학수사대는 무원록의 검시처럼 주로 시체를 면밀히 관찰하는 1차적인 수사 외에 정밀한 조직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 자살인가, 타살인가 |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경상도 문경군수 김영연에게 한 고발장이 도착한다.
‘사또,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며느리가 상놈 정이문에게 겁간당할 뻔했는데 이달 2일 목을 매고 말았습니다. 어찌 상놈이 양반 부인을 겁탈하려 할 수 있습니까.’
문경군수 김영연은 검시를 담당할 의생, 율생, 오작사령(시체를 다루는 관비)과 기록을 맡은 서리를 이끌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영연은 먼저 죽은 며느리인 황씨 부인의 주변인들을 심문한 뒤 시체를 검시했다. 먼저 자로 시체가 방에 놓인 위치를 표시했다. 검시를 위해 밝은 곳으로 시체를 옮기고 옷과 버선을 벗겼다.
자세히 살펴보니 정수리에 피부가 벗겨져있고 갈비뼈와 등에도 얻어맞은 흔적이 보였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것이 분명했다.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으로 만든 뾰족한 도구를 입안에 넣어 보았으나 색이 변하지 않아 독살은 아닌 듯 했고, 목 부위를 살피니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어 목 졸린 흔적이 뚜렷했다. 김영연은 시체를 방 안에 다시 들여놓고 횟가루를 뿌려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해 밤새 지키게 했다.
검시를 하는 동안 황씨 부인 목에 일(一)자로 난 상처를 미심쩍게 생각하던 김영연은 증수무원록언해의 해당 조항을 꼼꼼히 살펴 이것이 구타에 의한 타살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결국 머슴과 바람이 난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남편이 아내의 목을 끈으로 졸라 자살로 꾸민 살인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검안’에서 내용 발췌)
목에 난 끈 자국과 주변의 흔적으로 판단
스스로 목을 매 죽는 경우 체중이 줄에 실리면 힘이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므로 목 아래에서 시작된 끈 자국이 ‘V’자형으로 위를 향한다. 목 뒤 매듭이 있는 부분은 끈 자국이 없거나 있더라도 ‘ㅅ’자로 나타난다. 반면 다른 사람이 끈으로 목을 조른 경우는 목 전체를 빙 둘러 힘이 작용하므로 끈 자국이 목에 수평으로 나며 앞뒤로 자국의 높이가 거의 일정하다.
그러나 목에 난 끈 자국만으로는 자살과 타살을 구분할 수 없다. 몸이 약한 사람을 올가미에 씌워 위에서 당기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와 같은 자국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수무원록언해는 서까래의 올가미 흔적이나 먼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고려대 법의학과 황적준 교수는 “현대 법의학에서도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데 주변 정황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며 “목 부위 조직의 출혈 여부를 살피는 정밀 검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무원록도 수사에서 수집할 증거 목록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황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라진 혈흔을 찾아라 |
경기 여주에 사는 김완규는 비통한 심정으로 고발장을 적어내려갔다.
‘사또, 형님 김인규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소서. 둘째 형님이 술에 취해 홀로 건넌방에서 자다가 횡사를 당했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란 형수가 달려갔을 때 이미 한 괴한이 문밖으로 도주한 뒤였고 형님은 칼에 찔려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복수해 주소서.’
현장에 출동한 여주군수 이준규가 용의자 이춘경을 추궁하던 중 그가 차고 다니던 칼이 발견됐다. 혈흔(血痕ㆍ핏자국)을 찾기만 한다면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었다. 이준규는 서리에게 “이춘경의 칼을 숯불에 달구라”고 명했다. 칼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준비한 초(醋)를 그 위에 들이부었다. 그러자 ‘치지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칼에 선명한 혈흔이 나타났다. 이 광경을 보던 이춘경은 드디어 입을 열어 살인을 자백했다. (‘검안’에서 내용 발췌)
루미놀 대신한 고농도의 초
국내 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장감식반에서는 혈흔을 찾기 위해 ‘루미놀’이라는 질소화합물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에서도 주인공이 현장에서 루미놀을 분무기로 뿌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 물질은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붙어 발색 반응을 나타내는데, 어두운 현장에서 이 용액을 뿌리면 혈흔이 있는 자리만 형광으로 빛난다. 최근에는 혈흔의 백혈구를 보존해 유전자 검색까지 할 수 있는 ‘헤마글로’라는 새로운 검색 물질이 사용되는 추세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이 연구가 한창이다.
조선시대 과학수사대도 혈흔을 찾기 위해 화학물질을 활용할 줄 알았다. 증수무원록언해에서 명시한 고농도의 초가 바로 그것이다. 이윤성 교수는 이 방법에 대해 “다른 단백질을 제외하고 사람의 피만 분별하는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도 “혈액의 단백질 성분이 산에 노출되면 응고하는 성질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활 속에서 얻은 과학 지식이 실제 수사에 적용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동원 교수는 “증수무원록이나 신주무원록의 판별 기준들은 단지 죽음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알아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해의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자를 찾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무원록은 시신에 나타난 흔적을 통해 ‘어떻게 살해됐는가’를 밝힐 뿐 아니라 조선시대 과학수사대의 수사 지침이 된 법의학 지식창고였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