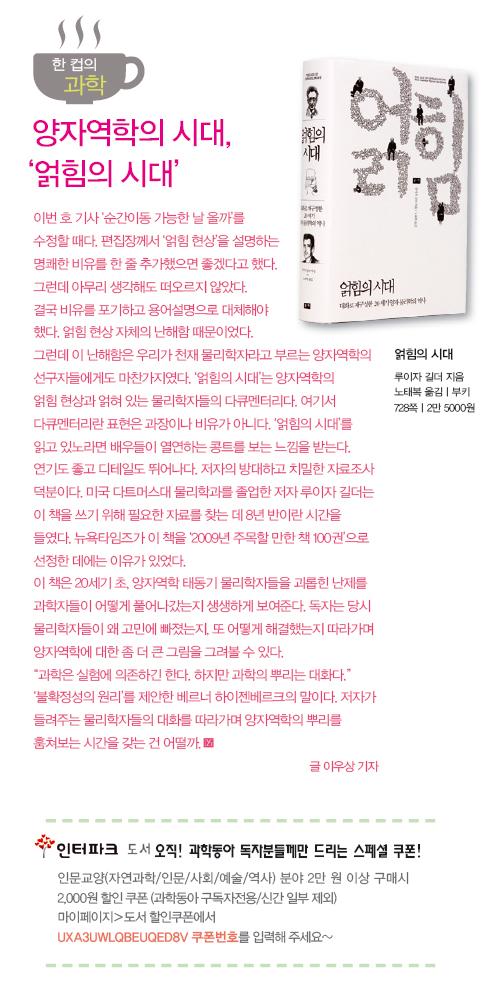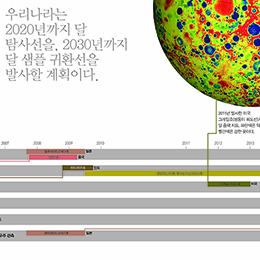지난 9월 19일 오후 SF팬이 많이 있는 기자의 트위터 타임라인이 들썩였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오후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을 인용했기 때문이었다. SF작가인 윌리엄 깁슨이 한 말로, 깁슨의 이름과 대표작인 ‘뉴로맨서’(1984)는 갑자기 인기 검색어가 됐다.
이를 지켜보던 기자의 기분은 묘했다. 마침 올해 초 뉴로맨서의 후속작인 ‘카운트 제로’(1986) 번역을 마치고 출간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아니나다를까, 곧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출간을 서둘러야 하니 빨리 교정을 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따끈따끈
한 책이 도착했다.
솔직히 일단 경고부터 해야겠다. 뉴로맨서와 카운트 제로는 소설이지만 평소 SF를 즐기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 SF팬인 한 지인은 “사람들이 이 책샀다가 괜히 안 후보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했다. 그래도 전혀 생소한 개념이 난무하는 건 아니다. 원작이 나온 지는 30년이 돼 가는데다가 ‘사이버스페이스’ 같은 단어는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 깁슨은 단편 ‘버닝 크롬’(1982)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고, 뉴로맨서는 이 개념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다.
이들 소설을 썼을 당시 깁슨은 소위 컴맹이었다. 소설은 타자기로 썼고, 스프롤 삼부작(뉴로맨서, 카운트 제로,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에 나오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격자 구조물과 현란한 해킹 장면은 순전히 깁슨의 상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카운트 제로는 반도체를 대체할 바이오소프트 기술을 통해 영생을 쫓는 대부호의 욕망과 신을 자처하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기괴한 존재가 일으키는 사건을 초보 해커, 용병, 미술품 거래상의 시선으로 다룬다. 번역을 하면서도, 요즘 바이오공학과 정보통신공학이 융합되는 추세를 보며 거의 30년 전에 바이오소프트가 반도체를 대체한다고 내다본 혜안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스프롤 시리즈는 SF의 하위장르인 사이버펑크의 대표작이다. 사이버펑크는 고도로 발달한 첨단 기술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이야
기를 주로 다룬다. 사이버펑크의 배경이 되는 세상은 우주를 날아다니는 먼 미래가 아니다. 정부가 쇠퇴하고 그 대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 거대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며, 높은 건물과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살아가는 하층민의 삶은 더욱 그늘져 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다.
사이버펑크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알린 건 영화 ‘매트릭스’(1998)였다. 요즘은 SF를 접하는 가장 대중적인 통로가 영화다. 하지만 SF로서 영화는 언제나 소설에 비해 뒤처진다. SF소설을 읽는 입장에서 SF영화의 소재나 주제는 대개 식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아니 이미 와 있는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다소 어렵고 지난하더라도 이와 같은 SF소설을 집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