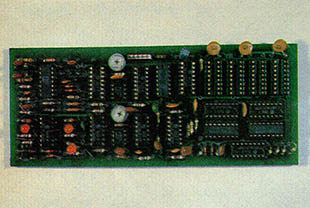1979년 미 매사추세츠주 워번시. 지난 10년 동안 12명의 어린이들이 백혈병에 걸렸다. 이 도시에서 10년 동안 평균 5.3명의 어린이들이 백혈병에 걸리는 통계치를 생각하면 12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숫자였다.
희생자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FACE)라는 모임을 만들고 소아백혈병의 발병률이 높아진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 공동 우물이 오염된 것이 원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식품회사와 화학회사가 공동 우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
FACE는 미 국립보건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던 시기에 오염물질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었다. 결국 이들은 비영리 환경보건연구센터인 JSI 센터를 통해 하버드대 공중보건연구소 교수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버드 교수팀은 주민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오염된 우물과 소아백혈병의 발병률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밝혀냈다. 피해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걸었고, 5년이라는 긴 재판 끝에 8백만 달러(약 90억원)의 보상금을 타냈다.
과학기술자와 지역주민 연결하는 중재자
위 사건의 특징은 지역주민들이 비영리 환경연구센터를 통해 하버드대 교수들이라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의뢰인과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상점’ (Science Shop)이다.
지역주민들이 의뢰한 환경, 보건, 안전 등 과학기술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 중 공익성이 큰 연구 과제를 선정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 한국에도 과학상점이 ‘상륙’해 대전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참여연구센터’ 가 그것.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의 과학상점인 셈이다. 세계 각국의 과학상점 네트워크인 국제과학상점네트워크 ‘생동하는 지식’ 의 코디네이터이자 네덜란드 과학상점 네트워크 의장인 캐스파 드 박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과학상점인만큼 향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국내에 과학상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98년 4월이었다. 당시 서울대 공대신문사가 주축이 돼 대학 사회에 과학상점을 소개하면서 서울대 안에 지역 사회와 연계된 과학상점을 만들고자 시도했다. 1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과학상점운동 관악학생특별위원회’ 가 꾸려졌고, 서울대 앞을 흐르는 도림천 살리기 운동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했고, 전문 연구자를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과학상점운동에 참여했던 노윤호(현재 LG기술연구원 연구원) 씨는 “과학상점운동이 2년 정도 지속됐는데 교수 등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1999년 전북대 이강민 교수가 교내에 과학상점을 만들었다. 과학기술 전문가가 발 벗고 나서 대학과 지역 사회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으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작년 한해 동안 4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수질오염 문제, 수도 동파 해결책 등 70여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뤘다. 그는 최근 대전의 시민참여연구센터 개소와 관련해 “서로 모델이 조금 다르지만 전북대와 대전의 과학상점이 상보적 관계로 발전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희는 과학상점 대신 ‘시민참여연구센터’ 를 공식 명칭으로 택했습니다.” 이상동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원래 구미에서는 ‘shop’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상점’ 은 물건을 파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 사람들이 ‘과학을 파는 상점?’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릴까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센터라는 과학상점 본래의 의미를 이름에 그대로 묻어나게 한 것이다.
한국형 모델 찾기에 주력

시민참여연구센터는 명칭 외에도 외국의 과학상점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 ‘한국형’ 과학상점이라는 것. “시민참여연구센터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풍토에 맞춰 네덜란드식도 미국식도 아닌 한국식 모델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양쪽의 장점만을 취합해 체계화시킬 계획이죠.” 이 국장의 설명이다.
그가 예로 든 네덜란드와 미국은 세계적으로 과학상점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나라들이다. 네덜란드는 1973년 위트레히트대에서 세계 최초로 과학상점이 시작된 과학상점의 본고장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환경, 핵무기, 주택 등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을 자발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대학 내에 물리학과 사회, 화학과 사회, 생물학과 사회 등 과학과 사회를 연계하는 학제간 연구프로그램이 제도화돼 있어 과학상점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쉬웠다.
물론 네덜란드의 과학상점이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띤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과학상점이란 용어조차 없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대에서는 과학상점이 명함 상자 하나로 시작됐다. 명함 상자를 며칠 놓아두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의뢰인이 적힌 명함이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가 상자를 다시 가져 와서 명함의 내용을 조사한 후 과학자들을 찾아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문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1979년 네덜란드 교육과학부가 암스테르담대 과학상점을 공식화하면서 과학상점 제도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후 과학상점은 네덜란드의 모든 대학에 설치돼 지금까지 대학의 공식적인 제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네덜란드의 과학상점이 대학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는 반면 미국의 과학상점은 독립적이고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연구센터가 중심이 된다.
지역연구센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할 있는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과 정책 등을 통해 이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덜란드가 과학기술 전문가와 의뢰인을 중재하는 모델이라면미국은 참여연구를 강조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문제를 의뢰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연구의 대부분, 또는 모든 단계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참터 문 많이 두드리세요
그렇다면 이 국장이 얘기하는 한국형 모델이란 뭘까. 네덜란드처럼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제도화를 통해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한편 미국처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과학상점이다.
“공동주택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구요? 그럼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찾으세요.”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이끄는 이성우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우선 사람들에게 센터를 많이 알릴 생각이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이 있으면 주저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한다. 그런 다음 내년부터 점차 제도화의 기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개소 한달이 채 못됐지만 이미 10여개의 과제를 의뢰 받은 상태다. 이 중 대전 1·2공단 환경 개선 사업은 한창 진행 중이다. KAIST 환경공학과 학생 10여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환경기술지도를 작성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 발전과 이용에 관해 원자력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간의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간담회를 중재해달라는 의뢰도 받았다. 또 녹색연합은 산업폐기물 오염과 관련해 식수와 토질오염을 조사해달라는 과제를 맡겼다. 숙제를 풀 과학기술전문가를 찾는 시민참여연구센터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생겼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일명 ‘참터’ 로 통한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지원하면서 ‘참’다운 과학기술을 가꿔나갈 ‘터’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참터가 한국 과학기술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