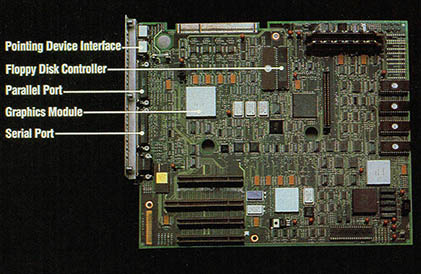새의 조상으로 알려진 시조새는 공룡과 어떤 관계일까.최근의 연구결과는 두발로 걷는 공룡으로부터 시조새가 진화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두발 보행에서 마침내 날갯짓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조류 탄생의 드라마를 살펴보자.
척추동물의 진화사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의 하나는 새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새는 깃털을 이용해 하늘은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모든 척추동물과 쉽게 구별된다. 그렇다면 새는 공룡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지 2년 후인 1861년 독일 바바리아 지방의 후기 쥐라기 지층인 졸렌호펜(Solenhofen) 석회암에서 처음으로 깃털 하나가 발견됐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완전한 두 개체의 시조새(Archaeopteryx) 화석이 발견됐다. 첫번째 것은 영국 자연사박물관, 두번째 것은 독일 베를린박물관에 소장됐다.
이 두 표본으로부터 깃털의 자국을 포함해 시조새의 모든 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깃털은 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시조새는 가장 오래된 새다.
시조새는 공룡과 발모양이 닮았다

1868년 시조새를 살펴본 토마스 헉슬리는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단계이며 다윈의 진화 이론을 지지하는 확고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실 깃털을 제외하면 시조새는 전형적인 육식공룡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후 같은 지층에서 콤소그나투스라는 조그만 공룡이 발견되자 헉슬리는 공룡이 단순히 시조새와 같이 공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가까운 친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조새 표본 중의 하나는 콤소그나투스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희미한 깃털 자국이 발견돼 다시 시조새로 확인된 적도 있다. 이빨을 가진 부리, 긴 꼬리, 날카로운 발톱 등 모든 해부학적 특징은 시조새가 전형적인 새보다는 공룡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주장은 1926년 헤일만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는 ‘새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새가 공룡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룡에게는 차골(叉骨)로 진화될 수 있는 쇄골(鎖骨)이 이미 퇴화돼 없어졌기 때문에 공룡이 새로 진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골은 한쌍의 쇄골이 V형으로 변한 것으로 시조새를 포함해 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헤일만은 새가 삼첩기(트라이아스기)에 악어와 공룡, 그리고 익룡의 공통조상인 원시파충류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새의 차골이 쇄골이 없는 공룡에게서 진화했다는 이론은, 진화상 한번 없어진 형질은 같은 종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돌로의 법칙’(Dollo’s Law)에 위배된다.
이러한 견해는 1960년대까지 지속됐다. 그런데 1964년 예일대학의 오스트롬 교수는 자신이 발견한 두발 육식공룡 데이노니쿠스와 시조새가 앞·뒷발의 구조와 기능이 같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전까지 학자들이 간과해온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새가 진화된 두발 육식공룡처럼 발가락으로 걷는다는 점이다(이에 비해 박쥐와 익룡은 네다리로 걷는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는데, 이들은 발가락이 아닌 발바닥으로 걷는다). 또 시조새의 앞발은 현생의 새보다 훨씬 원시적이며, 작고 민첩한 육식공룡의 전형적인 앞발과 닮았다.
한편 헤일만의 ‘새의 기원’이 출판 된 이후 전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룡화석이 발견됐다. 흥미롭게도 코엘로피시스, 인지니아, 그리고 오비랩터 같은 작은 육식공룡들에게서 쇄골이 확인됐다. 특히 1991년 몽골고비사막에서 발견된 벨로시랩터는 새처럼 쇄골이 변형된 차골을 갖고 있었다. 새의 조상이 공룡이라는 주장에 걸림돌이던 쇄골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특히 데이노니쿠스가 속한 마니랍토라 그룹은 시조새와 전형적인 새에게 나타나는 진보된 특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 사실은 새의 특징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두발 보행은 새와 공룡만 가능
그렇다면 공룡에서 나타나는 ‘조류적’ 특징은 무엇일까? 새의 진화에서 첫 단계는 뒷발로만 걷는 두발보행의 완성이다. 이 특징은 공룡이 진화하는 초기 과정에서 이미 성취됐다. 육식공룡들은 이동하는데 전혀 앞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발이 자유로웠다. 두발보행은 오직 새와 공룡만이 가능하다.
현재 새의 조상으로 알려진 수각류 공룡은 머리뼈에 구멍이 많고 뼈 속이 비어있어 골격이 가벼웠다. 목이 길어지고 등을 수평으로 유지해 뛸 때 뒷다리를 중심으로 머리와 꼬리가 균형을 이룬다. 또 긴 다리의 대퇴골은 정강이뼈보다 짧아졌으며 종아리뼈는 퇴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걸음걸이의 속도가 증가했다. 뒷발가락도 중앙의 세발가락만 사용하고, 첫번째와 다섯번째 뒷발가락은 퇴화했다. 이렇게 퇴화된 첫번째 발가락은 점차 뒤로 이동한다. 조류에 이르면 다른 발가락과 마주보는 위치까지 옮겨져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수각류가 테타누라와 마니랍토라 그룹으로 더 진화되면서 앞발가락의 수는 다섯개에서 세개로 줄고 짧은 앞발은 뒷발 길이만큼 길어진다. 특히 마니랍토라 그룹은 두개의 손목뼈가 합쳐져 반달형의 뼈로 변해 손목을 상하뿐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손을 새처럼 접을 수 있게, 즉 날갯짓이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다. 쇄골도 중앙에서 합쳐져 조류의 것처럼 폭도 넓어지고 부메랑 모양의 차골로 바뀐다. 치골도 앞을 향한 전형적인 용반류의 골반 형태에서 점점 뒤로 향하게 된다.
꼬리의 형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원시적인 수각류에서 뒷다리는 꼬리와 큰 근육(caudofemoralis)으로 연결돼 있었다. 수각류 공룡이 걸을 때 꼬리는 이 근육을 이용해 뒷다리를 뒤로 당긴다. 앞쪽으로 쏠린 몸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걸음걸이에 맞춰 악어의 꼬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새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날렵한 작은 육식공룡의 경우 꼬리뼈가 줄어들면서 꼬리의 크기는 작아졌다. 뒷다리를 뒤로 당기는데 꼬리 근육을 사용하는 대신 새처럼 대퇴골에 슬건(膝腱)을 발달시켰다.
한 예로 데이노니쿠스의 꼬리는 빳빳하게 굳어진 형태였다. 큰 먹이에 달라붙어 살점을 뜯을 때 꼬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역동적인 몸짓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즉 뒷다리와 꼬리가 근육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데이노니쿠스의 대퇴골에 이 근육과 연결되는 네번째 돌기(4th trochanter)가 없다는 점으로 입증된다.
꼬리가 뒷다리를 당기는 역할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은 날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할 선행조건이다. 현생 조류에게 꼬리는 날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위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원시적인 시조새의 경우 꼬리의 깃털은 뒷다리로부터 훨씬 자유로와 부력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됐다.
깃털의 보온효과
그렇다면 깃털은 언제 진화한 것일까? 깃털은 비늘과 똑같은 조직으로부터 발달한다. 새의 다리를 보면 전형적인 비늘에서 깃털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조직은 결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발달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의 랴오닝 지역의 약 1억2천5백만년 된 전기 백악기 호수 퇴적층에서 깃털을 가진 다양한 공룡들과 새화석이 발견돼 깃털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곳의 암석은 얇게 판으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어 깃털이나 내장과 같은 부드러운 부분까지 매우 정교하게 잘 보존돼 있었다.
이 가운데 1996년 발견된 시노사우롭테릭스(Sinosauropteryx)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 등의 중앙부에 발달된 털처럼 생긴 구조다. 목 부분에는 마지막 식사로 여겨지는 도마뱀이 함께 화석화됐으며, 몸 속에 두개의 알이 있어 한눈에 암컷임을 알 수 있다. 전체 크기는 약 1m 정도이며, 꼬리가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형태는 조그만 육식공룡인 콤소그나투스와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털처럼 생긴 검은 물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깃털의 전신으로, 몸의 체온을 유지하거나 짝짓기 때 화려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께 발견된 프로타르캐옵테릭스(Protarchaeopteryx), 카우딥테릭스(Caudipteryx), 아케오랩터(Archaeoraptor), 시노르니소사우루스(Sinornithosaurus)도 분명한 깃털을 가지고 있지만, 시조새보다 더 원시적이며 대칭적인 깃털을 가져 현생 조류처럼 완벽하게 날 수 없었다(새의 깃털은 비대칭이다).
이들의 몸은 불과 칠면조 크기에 불과했다. 그런데 크기가 2m가 넘는 베이피아오사우루스 (Beipiaosaurus)에서도 깃털 구조가 나타났다. 따라서 원시깃털은 분명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온을 위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새로운 발견은 수각류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원시깃털에서 진화해 여러 단계를 거쳐 성취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모든 수각류 공룡들이 이 보온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공룡의 제왕인 티라노사우루스도 원시깃털을 갖고 있었을까? 외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약한 새끼는 원시깃털로 덮여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끼는 점점 거대한 크기로 자라면서 털이 빠져버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솜털로 싸여있는 갓 태어난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앞으로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룡은 어떻게 날 수 있게 됐을까? 새는 두발보행의 공룡으로부터 진화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빠르게 뛰다가 날아오르는 능력이 생겼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시조새가 날다람쥐처럼 나무에 기어올라 중력의 도움으로 활강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날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조새의 발가락은 현생 새처럼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게 발달하지 않았다. 나무에 기어오르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새는 날고 전진하기 위해서 날개를 앞으로, 아래로, 그리고 안으로 차례로 움직이며 추진력을 만든다. 비록 시조새의 날개뼈가 현생 조류와 크게 다르지만 양력(揚力) 작용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날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조새도 현생 조류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날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시조새의 앞발에 난 깃털의 구조와 분포는 거의 현생 조류와 동일하며 몸의 골격 역시 거의 유사하다. 단지 앞발이 길어지고 꼬리가 줄었으며, 쇄골이 합쳐져 차골로 변하면서 날개 근육을 지탱할 수 있는 부위가 확보됐다는 점이 차이다. 확실히 시조새는 활강이 아닌 날갯짓에 의해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이다.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
앞의 많은 증거들은 공룡과 새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면서 새가 조그만 육식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이론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즉 조류는 공룡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공룡, 더 나아가 파충류 그 자체인 것이다. 이는 인류가 영장류이며 동시에 포유류라는 의미와 같다. 단지 인류가 직립을 하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와 구별되는 것처럼 조류도 비대칭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파충류와 구분되는 것이다.
공룡에게서 나타나는 새의 특징은 일반적인 조류와는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됐다. 이 특징은 공룡이 새로 진화한 후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기능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룡은 오늘날에도 포유류보다도 더 많은 종(種)을 가지고 중생대에 육지를 지배했듯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