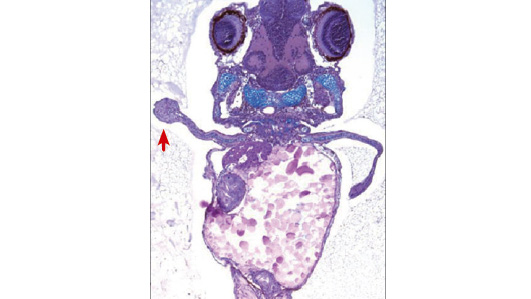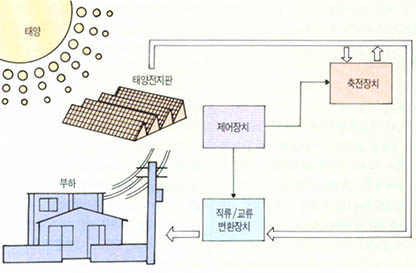우리만큼 아인슈타인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학습지, 음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그 이름이 상표로 사용되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공식 E=mc²조차 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위 공식이 아인슈타인 업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물론 이 공식이 끔찍한 수소폭탄의 원리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상대성이론)에는 특수상대론과 일반상대론이 있다. 이름으로 봐서는 특수상대론이 일반상대론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특수상대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반상대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E=mc²은 특수상대론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대학의 물리학과 2학년 과정에서 강의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반상대론은 대학원 과정에서 강의돼야 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개설돼 있지 않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특수상대론을 발표하면서 베른 특허국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물리학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특수상대론은 아인슈타인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 로렌츠, 마이켈슨, 몰리, 피츠제럴드 등과의 공동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인슈타인의 진가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15년 독창적인 일반상대론을 주창하면서 발휘됐다.
" 아인슈타인은 옳았다 "
일반상대론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꽤 복잡한 방정식 하나에 모두 함축돼 있다. 일반상대론이 발표된 이듬해인 1916년 독일의 슈바르츠실트(1873-1916)는 회전하지 않는 구대칭의 천체에 일반상대론이 적용되는 답을 구했다. 이 답을 ‘슈바르츠실트 풀이’라고 부른다.
슈바르츠실트 풀이가 맞는다면 해 바로 주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중력 때문에 빛이 약 2″(1°는 3,600″)의 각도만큼 휘어야 한다. 만일 해가 점점 더 작아진다면 중력이 강해지므로 휘는 각도는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중력은 천체의 질량뿐 아니라 크기에도 관련된다. 결국 반지름이 어떤 값보다 더 작아지면 빛은 휘다 못해 아예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값을 우리는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어떤 천체의 반지름이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이 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슈바르츠실트는 이듬해 결핵으로 일생을 마쳤다. 만일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블랙홀은 더 일찍 햇빛을 보았을 것이다.
당시 블랙홀에 대한 주장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블랙홀은 그만두고, 해 주위에서 빛이 휜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919년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영국의 에딩턴(1882-1944)이 지휘하는 아프리카 개기일식 관측팀이 그 사실을 관측해내자, “아인슈타인은 옳았다”(Einstein was right!)는 머릿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등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블랙홀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즉 이론이 맞는 것은 인정하지만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블랙홀은 상상 속의 존재일 뿐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팽배했던 것이다.
왜 사람들은 블랙홀에 대해 냉담했을까. 이유는 그 크기에 있었다. 해가 블랙홀이 되려면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약 3km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지구의 반지름을 약 1cm가 되도록 수축시키는 것과 같은 비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블랙홀은 물리학계와 천문학계의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블랙홀은 ‘얼어붙어버린 별’, ‘붕괴된 별’ 등으로 불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름조차 없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훨씬 뒤인 1969년의 일이었다.
하지만 별의 진화에 대한 수수께기를 푸는 항성진화론의 발전은 결국 블랙홀의 존재를 다시 믿도록 만들었다. 진화에 관한 베일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별들은 종말에 이르러 엄청난 수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별의 종말의 한 형태인 백색왜성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고 많은 관측 결과들은 블랙홀의 ‘복권’에 크게 기여했다. 백색왜성은 이름 그대로 희고 작은 별로, 우리 해가 백색왜성이 된다면 그 크기가 지구 만하게 수축한다. 표면의 밀도는 매우 높아서 1cm³부피에 약 10t(중성자별은 10억t)의 물질이 들어있다.

'미운 오리새끼' 의 복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내팽개쳐졌던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로써 블랙홀은 ‘미운 오리새끼’ 로부터 ‘예쁜 오리새끼’로 일단 변신하게 됐다. 특히 1963년 뉴질랜드 출신의 과학자 커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회전하는 구대칭의 천체에 적용해 그 답을 구함으로써 블랙홀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회전하지 않는 천체에 대한 슈바르츠실트 풀이를 구한 지 약 50년이 지나서야 회전하는 천체에 대한 커 풀이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천문학에서 말하는 슈바르츠실트 블랙홀, 커 블랙홀은 각각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과 회전하는 블랙홀을 의미하게 됐다.
또한 천문학에서는 백색왜성과 블랙홀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중성자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중성자별에서는 각설탕만한 부피(1cm³)의 물질이 10억t이 넘는 질량을 가질 정도로 밀도가 높다. 만약 중성자별이 우리 해와 질량이 같다면 그 반지름이 10km 정도다. 따라서 반지름이 3km인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블랙홀이 활발하게 다시 연구된 배경에는 일반 대중의 깊은 관심도 톡톡히 한 몫을 했다. 커 블랙홀은 우주 다른 곳에 있는 또 다른 커 블랙홀과 연결되는 웜홀을 만든다. 이 웜홀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SF영화에서는 불가능한 우주 여행의 꿈을 실현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까지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외우도록 만들었다.
물리학의 상대론과 천문학의 항성진화론이 만나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 보증을 서 주자, 사람들은 이 우주에 블랙홀이 정말 있는지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도전장을 낸 것은 1970년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발사한 X선 우주망원경인 우후루(Uhuru)다. 여기서 X선 영역을 탐색하게 된 동기는 블랙홀이 쌍성을 이루고 있을 때 강한 중력을 이용해 동반별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X선을 낼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X선이 지구 대기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주궤도에 망원경을 올리는 일이 필요했다. 우후루는 예상 밖으로 3백39개나 되는 X선원을 찾아냈다. 그 후로 백색왜성이나 중성자별과 같이 별이 죽어 남긴 시체의 한 형태로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게다가 현대 천문학의 상징처럼 돼 버린 허블우주망원경은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우리 태양계만한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도 믿게 만들고 있다. 이들 블랙홀은 질량이 최소 해의 1백만배에서 최대 수십억배에 이르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진화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 거대한 블랙홀 없이는 천문학계 최대 수수께끼의 하나였던 퀘이사의 정체가 해결될 수 없었다.
영국의 천체물리학자인 호킹이 옳다면 태초에 태어난 조그만 원시 블랙홀도 우주에는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이들 중에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작은 것들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연 블랙홀은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아니라 “블랙홀의 종류는 얼마나 있는가”라고 물을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정도면 블랙홀은 ‘미운 오리새끼’로부터 ‘예쁜 오리새끼’를 거쳐 화려한 ‘백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