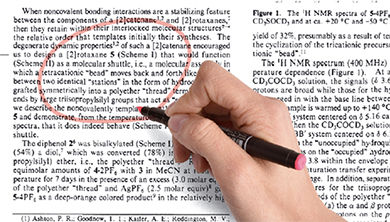오늘날 지구는 기후변동이라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자연현상에 직면해 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와 가뭄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전세계적인 현상이란 사실은 지구의 기후 변동이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잘 말해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들은 위기의 지구를 구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모색중이다. 문제는 환경 협약 등이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예외없이 통용되는 '힘'의 논리가 여전히 이 분야에서도 관철된다는 데 있다.
지난 10월 13일 경실련 환경개발 센터가 개최한 '기후 변동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의 공개 토론회 역시 이같은 점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는 행사로 평가된다.
전 스위스 베른대학의 교수인 루카스 비셔 박사를 초청해 가진 이 토론회에는 경실련 관계자들 외에도 정부측에서는 상공자원부 정준석 자원협력과장이, 기업측에서는 삼성 지구 환경연구소의 황연택 박사가 주제를 발표했다.
비셔 박사는 1990년 NGO(비정부단체) 멤버인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로 기후 변화 회의에 참석한 이래 기후 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상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으며, 92년 6월 열린 리우환경회의에 제출한 WCC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이 분야 전문가.
비셔 박사는 강연을 통해 80년대 초 기후 변화 정부간회의(IPCC)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한 예로 89년 미군이 사용한 에너지량은 미국의 대중교통시스템이 22년간 사용할 양이다)과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인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닥쳐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을 만들어 리우 회의에서 채택하자"는 권고안을 작성하는데만도 1년 반이나 걸렸다고 소개했다.
지구 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가 추세에 있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우선 선진국들에 대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 가스 배출의 감축을 의무화한 이 협약은 서명 후 국회의 비준을 얻으면 국제법상 지위를 획득 하는데, 94년 8월말 현재 90개국이 서명을 했음에도 강제력을 갖지 못한 상태다(의무사항은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할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과 동구권국가에 추가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나뉨).
이 협약의 준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나라는 태평양 연안의 군소도서국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온실 가스 배출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되면 2100년 경에는 해수면이 약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국가로서는 그야말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은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개도국과도 달라 의정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발표한 정준석 과장은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 나라로서는 별다른 의무 부담은 없으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92년에는 세계 2위(석유는 1위)를 차지 할 만큼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오는 96년 OECD에 가입할 예정인 만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부처를 망라한 기후변화대책기구를 설치해 적극 대처한다는 등의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