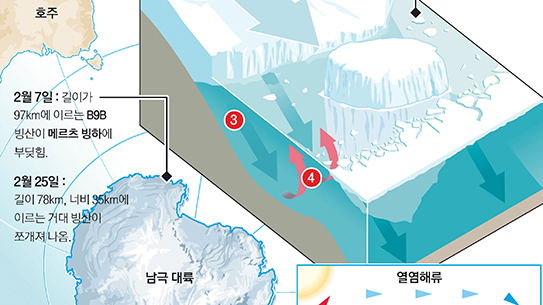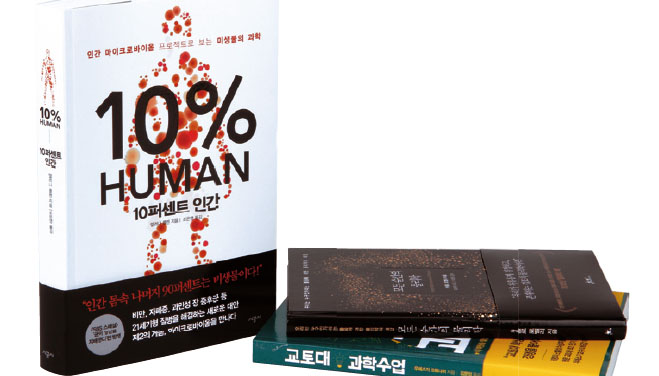얼마 전 캐나다 맨니토바 대학 교수로 있는 김원겸 박사가 사진 한장을 보내왔다. 사진을 받고 나는 한동안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지금부터 35년 전인 1958년 봄, 내가 서울대 생물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직후 찍은 사진이었다. 그해 4월 나는 지금 동덕여대 총장으로 있는 김종협 박사와 단 둘이 대학원 생물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대학원 재학생으로는 석 박사 과정을 합해 고작 6-7명에 불과했는데, 그 가운데 몇분과 같이 찍은 것이 이 사진이다.
이 사진 속의 정영호 선생(현 서울대 명예교수,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회장)은 당시 생물학과 조교수로, 박상윤 선생(성균관대 교수로 계시다 84년 별세)은 고려대 조교수로 계셨다. 두분 모두 우리 대학원생들의 좋은 맏형 노릇을 해주신 분들이다.
우리나라 생물학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는 젊은 패기와 오만에 가득차 있던 우리는 그야말로 기고만장하여 생명과학의 최첨단을 통달한 것같은 착각 속에 도취되어 있다가 한 두해 사이를 두고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학문한다는 것, 연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달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어언 3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느끼는 것이 있다. 젊을 때의 그 기고만장한 패기가 아니라면 누가 이 험난한 학문의 길을 스스로 택하겠는가 하고 '모르면 겁도 없다'는데, 진정 몰라서 겁없이 덤벼드는 곳이 학문의 세계가 아닌가 싶다. 하긴 세상만사 어느 한 곳 쉬운 데가 있을까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