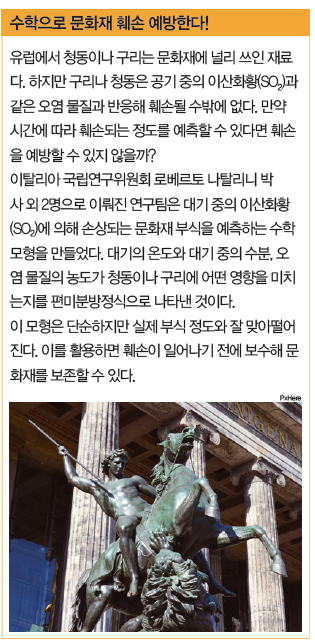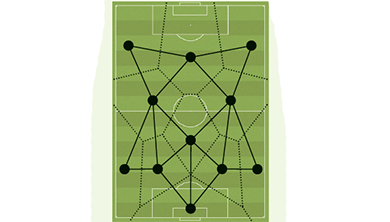미륵사지는 7세기에 지은 백제 최대의 절 미륵사가 있던 터다. 절 안에는 탑이 셋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목탑이, 동쪽과 서쪽에는 목탑 양식을 흉내 내 지은 석탑이 하나씩 있었다. 동쪽에 있었던 탑을 동탑, 서쪽에 있었던 탑을 서탑이라 하는데, 목탑과 동탑은 흔적만 남아있었다. 반면 서탑은 6층까지 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서탑이 미륵사지 석탑이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오른쪽에 탑이 보이고, 왼쪽에는 큰 가건물이 보였다. 오른쪽에 있는 동탑은 미륵사지 석탑을 참고해 복원한 것으로 1992년에 완성됐다. 김 연구사는 “동탑은 복원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원래의 석재★를 거의 활용하지 못해 문화재 같은 느낌이 적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
건축이나 토목 등에 쓰는 돌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륵사지 석탑은 다르다.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륵사지 석탑을 직접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동탑처럼 완벽한 모습이 아닌데도 말이다. 아마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낀 게 아닐까.

보수를 시작하기 전 미륵사지 석탑은 6층까지 그 원형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복원’이 아닌 ‘보수정비’를 해야 했다. 동탑은 발견된 부재★를 조사해 9층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지만, 미륵사지 석탑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김 연구사는 “문화재의 원형이 확실하게 고증되지 않았을 때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면 오히려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인 유럽에서도 과도한 복원보다는 교체나 보강을 통해 문화재를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다.
부재★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재료를 말한다.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탑이다. 그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 하지만 내부 구조나 탑의 보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에 대한 방침을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정밀하게 해보자’는 것으로 세웠다. 석탑의 상태와 구조적 특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확인하고, 해체 조사를 정밀하게 한 뒤, 최종 보수 범위와 기술을 직접 개발하다 보니 2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물론 그 성과는 컸다. 우리의 석조문화재 보존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에 적용된 기술은 해외에서도 세련됐다는 극찬을 받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에 적용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라오스나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다른 나라의 기술자가 찾아오거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연구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제대로 보수하자는 취지였지만, 일반적인 석조 문화재 수리 방법론과 기술적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미륵사지 석탑의 기준은 ‘남조척’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준이 되는 수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를 ‘척’이라고 했다. 한 척을 30cm라 하고 건물 한편의 길이를 10척으로 설계하면, 그곳의 길이는 30cm×10척=300cm=3m가 되는 식이다.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보수할 때도 이 개념이 중요하다. 문화재는 보통 오래됐기 때문에, 마모되거나 틀어지는 등 훼손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없어진 부분도 많다. 이 부분을 추정해 복원하거나,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려면 기준이 되는 척으로 가늠해 봐야 한다. 발견된 부재가 척에 맞지 않는다면, 없어지거나 교체된 부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척은 정수인 경우가 많다. 1척, 2척, 5척, 10척, 50척 등과 같이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미륵사지 석탑은 1척이 약 25cm인 ‘남조척’이 기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층은 동서남북 각 면이 3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칸을 나누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약 2.5m로 10척이다. 석탑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리장엄구’가 나온 심주석★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1m로 4척이고, 높이는 75cm로 3척이다. 석탑의 최대 폭은 12.5m로 50척이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에 몰두하고, 마무리 짓는 감회가 어떤지 묻는 질문에 김 연구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가 가진 역량과 노력을 다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끝난다고 하니 텅 빈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 문화재 수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재는 살아 숨 쉬는 역사이자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고리로, 남겨진 문화재를 보존하는 건 우리 후손들의 몫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