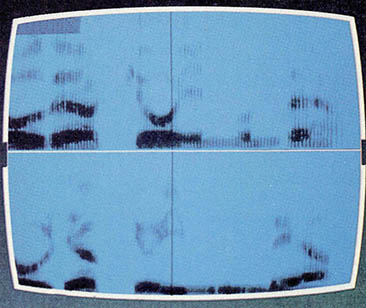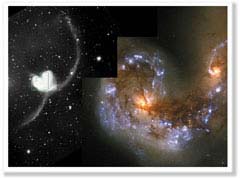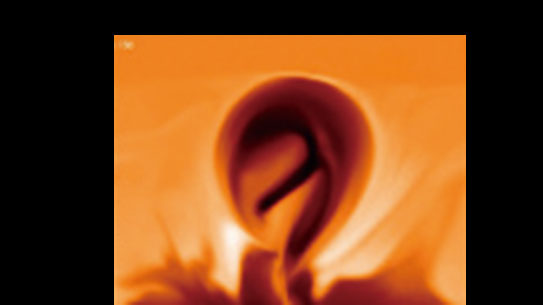“올해는 노벨상 콤플렉스에 대해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요? 한국이 노벨상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아이템이니까 빨리 써아죠.”
11월호 기사 방향을 논의하는 기획회의. 이창욱 기자의 유머러스한 의견에 진지한 회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학원에서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공부한 그의 시선은 항상 이렇게 과학과 사회의 접점에 머물러 있어 값집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급성장한 나라들도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벨상을 갈망합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때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몇 개나 따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특히 경제력)을 보여주는 잣대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메달 색깔에 관계 없이 모든 출전 선수들에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노벨상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 걸 피부로 느낍니다. 한국은 기술 성장 중심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단기간 내 수상하긴 어려울 거라는 이해, 기초과학 분야의 공로상 격인 노벨상에 굳이 목맬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더군요. 철없던 시절 일본과 한국의 노벨상 개수를 단순 비교하며 노벨상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기사를 썼던 흑역사가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차분한 분위기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국도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올해 노벨상처럼 앞으로의 노벨상도 상용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면 기초과학 응용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게 기회는 더 많을 겁니다.
물론 먹구름도 끼어있습니다.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돼 기초과학 연구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란 예측도 많으니까요.
과학동아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벨 재단 관계자부터 역대 노벨상 수상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과학자, 6년 만의 한국인 이그노벨상 수상자, 생리의학・화학・물리학 등 각 분야 연구자까지.
그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자유’였습니다. 미래의 노벨상을 위해선 진짜 궁금한 걸 연구할 수 있는 자유, 쓸모없어 보여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엉뚱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노벨상 기사를 보시고 공감하고 응원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