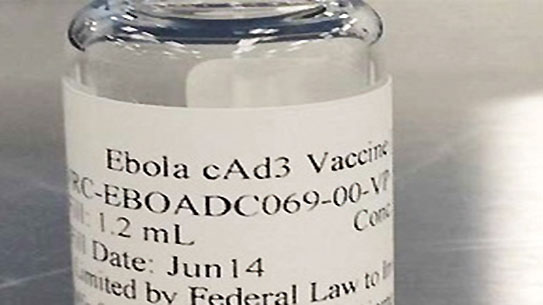“죄송해요. 아침인데, 그것도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괜찮습니다. VR의 가장 큰 장점이 몰입감과 현장감이니까요.”
서동일 볼레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자주 겪는 일인 듯 웃으며 말했다. 그는 공포를 ‘보는’ 것과 VR로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포 영화는 사건이 TV 속에서 일어날 뿐이지만(물론 TV 속에서 기어 나오는 경우도 있다), VR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무서움이 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설의 고향의 까마귀는 정말 끔찍했다.
VR 여행, 화성까지 간다
여행은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여행이 주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다른 시간대와 공간에 존재한다는 느낌이다. 문제는 이런 느낌을 돈, 시간, 건강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것. 한 달에 절반은 취재, 절반은 마감을 하는 잡지 기자에게 장거리 여행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여행은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제작한 VR ‘로스트밸리’가 대표적인 예다. 로스트밸리는 에버랜드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파리 투어로, 수륙양용차를 타고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스페셜 투어는 비용이 일인당 20만 원에 평균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반면 가상현실 로스트밸리 투어는 4D 시뮬레이션 의자에 앉아 HMD를 착용하기만 하면 그 즉시다. 직접 체험해보니 360도 사방에 사자, 코끼리, 오릭스 같은 야생 동물들이 손에 잡힐 듯 지나갔다. 오픈된 차량 지붕 위로 기린에게 먹이를 줄 때는 기린이 침을 흘릴까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과학기자로서 또 하나 탐나는 여행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17년 10월 19일 발표한 VR 화성탐사 ‘액세스 마스(Access Mars)’다. NASA는 구글과 함께 화성탐사로봇 ‘큐리오시티’가 전송해온 데이터로 입체적인 화성 지형을 제작했다.
‘화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MD를 쓰면 불그스름한 화성을 배경으로 제트추진연구소(JPL) 과학자가 말을 걸어온다. 그를 따라 큐리오시티의 바퀴 자국이 선명한 주요 탐사 지역 네 곳을 탐험할 수 있다. 일러야 2033년경 진행되는 화성 유인탐사보다 훨씬 먼저 화성을 즐길 수 있는 셈이다. 우주인이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 면제되는 것은 덤이다.


개인의 외로움 해결할 것
가상현실은 앞으로 여행 메이트를 구하는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친구의 아바타나 가상의 캐릭터와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친구가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콘텐츠를 퇴근 후에 마치 함께 간 것처럼 체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존현실’이라는 개념도 생겼다. 원격에 있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함께 영상, 음성, 촉감, 동작, 감성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서 대표는 “이런 기술이 개인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의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작 단계로 가상현실 속에서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VR 연애 시뮬레이션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옆집 오빠, 학교 동기, 소개팅 상대 등과 데이트를 즐기는데, 대화 주제나 데이트 시나리오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서 더욱 현실감 있다. 한 때 ‘연애를 글로 배웠다’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미래에는 ‘연애를 VR로 배우는 것’이 당연해질 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서 대표는 “가상현실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털어놨다. VR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기존 영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연애 시뮬레이션을 예로 들어 보자. 같은 1인칭 시점을 구현하더라도 기존에는 시야를 감독이 제어했다. 남자친구를 바라보다가 잠시 한 눈을 팔면(카메라를 돌리면) 그가 “자기야 어딜 봐, 나를 봐야지”라고 말하는 훈훈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러나 VR은 시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한 눈을 절대 안 팔수도 있고, 시종일관 한 눈만 팔 수도 있다. 이때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현실감이 뚝 떨어진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로 2016년 10월 한 여성 게이머가 가상현실 게임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블로그에 고백해 논란이 됐다. 다른 사용자의 아바타가 그녀의 아바타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는 것이다. 이런 가상현실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기에 현행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방지하려면 어떤 사전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지 논쟁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멀미 잡는 인터페이스가 관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가상현실 데이트에 솔깃한 기자는 결국 ‘구글 카드보드’를 질렀다. 골판지를 접어 스마트폰과 결합해 사용하는 HMD는 가격도 착했다. 인터넷 최저가로 990원. 오랫동안 취재로만 접했던 가상현실 기술을 실현하다니, 감동하며 유튜브에서 롤러코스터 콘텐츠를 재생해봤다.
그러나 3분 만에 포기. 평소 멀미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도 어지러움이 너무 심했다. 말로만 듣던 ‘사이버 멀미(cybersick ness)’였다. 사이버 멀미는 메스껍고 어지럽고 주위가 빙빙 도는 듯한 증상이 일반 멀미와 유사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멀미는 몸이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감각기관(눈)이나 뇌가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해 감각 불일치로 나타난다. 사이버 멀미는 그와 반대다. 눈이나 뇌가 움직임을 인식하는데 몸은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다.
서 대표는 “장비의 사양이 사이버 멀미에 영향을 준다”며 “HMD를 쓰면 디스플레이와 눈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초당 프레임 수(FPS·frames per second)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영상의 깜빡임을 눈이 인식해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당 프레임 수는 화면(프레임)이 바뀌는 빈도를 말한다. 보통 TV나 스마트폰, PC 화면은 초당 60프레임 이하다. 그러나 기자가 체험한 전설의 고향은 초당 90프레임이었다.
또 이날 사용한 HTC의 ‘바이브’는 양쪽 눈에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각각 1080×1200 픽셀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였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이유는 시야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디스플레이 영상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야각을 넓히기 위해 어안렌즈를 추가하는데, 이 경우 해상도가 원본의 45%로 떨어진다.
전설의 고향에서는 콘트롤러도 몰입감에 큰 영향을 줬다. 고가의 가상현실 기기는 HMD뿐만 아니라 손의 움직임을 가상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콘트롤러가 세트로 구성돼 있다. HMD를 쓴 채 콘트롤러를 쥔 손을 내려다보면 가상현실 속에 사람 손이 보인다. 악수하듯 손에 쥐고 검지를 누르면 물건을 잡거나 총을 쏠 수 있다. 이때 미세한 진동이 발생해 가상세계 물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촉각 VR은 가상현실 속 상호작용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가 생길 겁니다.”
서 대표는 의학 분야를 예로 들었다. 지금도 수술 장면을 VR로 제작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하고 있지만, 집도할 때의 미세한 촉감, 환자의 체온까지 느껴진다면 수술 교육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데이트도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과 따뜻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

‘그래. 결심했어’.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점점 개인화돼 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학기자답게(?) 가상현실 기기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가격 진입장벽이 꽤 높았다. 최근에 좀 내렸다는데 HMD에 콘트롤러까지 98만 원.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가상현실을 렌더링(영상을 만드는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고사양 컴퓨터가 150만~200만 원이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서울에 사는 흔한 싱글 여자의 집에서 눈을 가리고도 아무것과 부딪치지 않는 가로 세로 2m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구글 카드보드를 쓰고 최대한 정적인 공원의 VR 영상을 쇼파에 누워서 보는 방법을 택했다. 롤러코스터보다는 멀미가 훨씬 덜했다. 순간 순간 이게 무슨 가상현실 여행인가, 자괴감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었을 것이다.
▼관련기사를 계속 보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