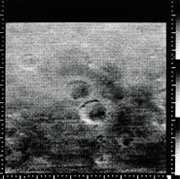요즘 식품 업계는 단맛이 대세다. 허니버터칩이 과자 업계를 강타한 이후 달달한 감자 스낵이 10개나 출시됐고 단맛을 내는 다른 과자들도 1년 새 매출이 52.2%나 늘었다. 인생살이의 쓴맛을 대변해온 소주조차도 유자농축액을 넣어 달착지근해졌다. 이 소주는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식품에서 단맛을 내는 성분은 ‘당(糖, sugar)’이다. 포도당, 과당 같은 단당류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한 설탕 등의 이당류가 있다. 한국인은 이런 당을 매일 같이 권장량(25g)의 2.6배나 소비하고 있다.
2010년엔 하루 평균 61.4g을 소비하던 것이 최근에는 65g까지 늘었다. 당을 과잉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과당은 그 해악이 에탄올에 버금간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다. 포도당과 달리 간세포에서 처리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혹시 눈치 챘는가? 단맛 소주는 에탄올만큼 나쁜 과당에 에탄올을 더한 식품인 셈이다). 그뿐인가.
과잉 섭취한 과당은 간에서 대부분 지방으로 바뀐다. 지방간을 유발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해 심한 경우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당은 단백질에 달라붙어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에탄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하는 짓(숙취)과 비슷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단맛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단맛에 중독됐다는 건 어쩌면 작은 위안에 의지해야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뜻일지 모른다.
식품에서 단맛을 내는 성분은 ‘당(糖, sugar)’이다. 포도당, 과당 같은 단당류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한 설탕 등의 이당류가 있다. 한국인은 이런 당을 매일 같이 권장량(25g)의 2.6배나 소비하고 있다.
2010년엔 하루 평균 61.4g을 소비하던 것이 최근에는 65g까지 늘었다. 당을 과잉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과당은 그 해악이 에탄올에 버금간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다. 포도당과 달리 간세포에서 처리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혹시 눈치 챘는가? 단맛 소주는 에탄올만큼 나쁜 과당에 에탄올을 더한 식품인 셈이다). 그뿐인가.
과잉 섭취한 과당은 간에서 대부분 지방으로 바뀐다. 지방간을 유발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해 심한 경우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당은 단백질에 달라붙어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에탄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하는 짓(숙취)과 비슷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단맛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단맛에 중독됐다는 건 어쩌면 작은 위안에 의지해야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뜻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