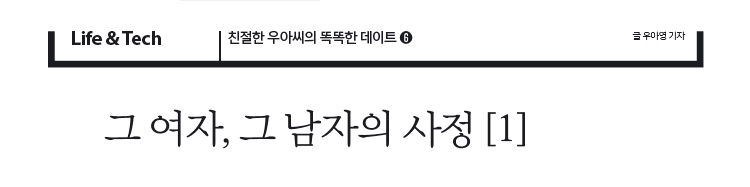

2015년 6월 1일, 소녀의 일기 :
인턴을 한 지 벌써 2주가 됐다. 새로운 경험에 한 뼘 자란 듯한 느낌이다. 특히 최근엔 새 변화가 생겼 다. 며칠 전 마주친 그는 "이번에 새로 온 인턴이죠? 할 만 해요?"라고 말을 걸었다. 큰 키에 선이 굵은 얼굴을 가진 옆 팀 김 대리다. 이상형인 배우 하정우를 닮아 흘깃거린 적이 있는데, 굵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 이킹을 탄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마도 내 뇌에서는 0.2초 만에 기쁨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아 드레날린이 나왔을 거다. "사랑에 빠지는 데 책 한 페 이지를 넘기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의 말이 이렇게 공감된 적이 없었다.
줄 긴 레스토랑,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나중에 또 봐요"라며 멀어졌던, 하정우를 닮은 그 를 오늘 퇴근 길에 또 마주쳤다. "어디 살아요?"라는 말에 또 다시 '심쿵'. 같은 방향이라고 차를 태워주겠 다는 말에 순간 남친 얼굴이 두둥실 떠올랐지만, '바 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합리화를 한 뒤 냉큼 올라탔다. 물론, 그러지 말아야 했다. 그는 배가 고프 다더니, 결국 광화문 근처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 다. 나도 배가 고프던 차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꼬르 륵거리는 퇴근 길이 아니었다면 한결 이성적으로 생 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들어가 보니 기다리는 줄이 길었다. 그냥 가자는 나 를 그가 불러세웠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후회 안 해요. 난 신입 인턴이랑 스테이크 한 접시 먹고 싶은데?" 심쿵. 하정우가, 무려 하정우 가! 내 코앞에 대고 말했다.
"식당 줄이 길 때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딸기나 바나나 향이 나는 먹이를 좋아하는 쥐를 이용해 실험했는데, 사람이 맛집 앞에 줄 서는 것처럼 쥐들도 향 나는 먹이가 있는 차단막 앞에서 기다리더래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25초를 넘어서니까 포기하고 돌아서서 별로 안 좋아하는 먹이를 먹었는데, 뇌를 촬영하니 후회할 때 활동하는 '안와전두엽 피질'이 활성화 됐다더군요. 재미있지 않아요?"
인턴을 한 지 벌써 2주가 됐다. 새로운 경험에 한 뼘 자란 듯한 느낌이다. 특히 최근엔 새 변화가 생겼 다. 며칠 전 마주친 그는 "이번에 새로 온 인턴이죠? 할 만 해요?"라고 말을 걸었다. 큰 키에 선이 굵은 얼굴을 가진 옆 팀 김 대리다. 이상형인 배우 하정우를 닮아 흘깃거린 적이 있는데, 굵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 이킹을 탄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마도 내 뇌에서는 0.2초 만에 기쁨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아 드레날린이 나왔을 거다. "사랑에 빠지는 데 책 한 페 이지를 넘기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의 말이 이렇게 공감된 적이 없었다.
줄 긴 레스토랑,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나중에 또 봐요"라며 멀어졌던, 하정우를 닮은 그 를 오늘 퇴근 길에 또 마주쳤다. "어디 살아요?"라는 말에 또 다시 '심쿵'. 같은 방향이라고 차를 태워주겠 다는 말에 순간 남친 얼굴이 두둥실 떠올랐지만, '바 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합리화를 한 뒤 냉큼 올라탔다. 물론, 그러지 말아야 했다. 그는 배가 고프 다더니, 결국 광화문 근처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 다. 나도 배가 고프던 차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꼬르 륵거리는 퇴근 길이 아니었다면 한결 이성적으로 생 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들어가 보니 기다리는 줄이 길었다. 그냥 가자는 나 를 그가 불러세웠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후회 안 해요. 난 신입 인턴이랑 스테이크 한 접시 먹고 싶은데?" 심쿵. 하정우가, 무려 하정우 가! 내 코앞에 대고 말했다.
"식당 줄이 길 때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딸기나 바나나 향이 나는 먹이를 좋아하는 쥐를 이용해 실험했는데, 사람이 맛집 앞에 줄 서는 것처럼 쥐들도 향 나는 먹이가 있는 차단막 앞에서 기다리더래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25초를 넘어서니까 포기하고 돌아서서 별로 안 좋아하는 먹이를 먹었는데, 뇌를 촬영하니 후회할 때 활동하는 '안와전두엽 피질'이 활성화 됐다더군요. 재미있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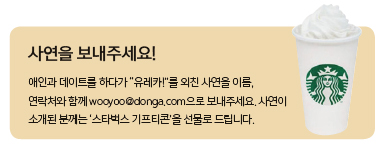
메뉴판 속 스윗스팟은 없다?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였을까. 평소 아는 척하던 버릇이 자꾸 나왔다. 혹시 그거 아시냐고. 음식 업계 사람들은 메뉴판 오른쪽 윗부분을 '스윗스팟'이라고 부른다고. 사람들이 메뉴판을 볼 때 이 지점에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윤을 크게 하려고 주력 메뉴를 여기에 쓴다고. 신기하지 않냐며. 휴, 이 놈의 입 방정. 그는 슬며시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스윗스팟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어느 교수가 실험 참가자들 눈에 적외선 시선 추적기를 달고 메뉴판을 보게 했더니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었다더군요. 물론 이 실험 결과도 또 다른 연구에 뒤집힐 수 있겠지만." 아…, 그렇구나. 아는 척 하려다가 되려 틀렸다는 것만 알았다. 무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황홀했다. 하정우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비싼 스테이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가볍게 와인 한 잔만 할건데, 같이 마실래요?" 하정우가 물었다. 암요, 그럼요, 먹고 말고요. 우린 카베르네 쇼비뇽으로 빚은 아름다운 레드 와인을 곁들였다.
'스테이크처럼 기름진 음식이 들어와 침과 뒤섞이면 미세한 기름방울이 입 안 곳곳을 코팅해 미끌미끌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하는데, 이때 레드 와인 속 탄닌 성분이 침 속 단백질과 결합해 덩어리로 침전되면서 거친 촉각(떫은 맛으로 느껴진다)을 선사해 기름 맛을 상쇄한답니다'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엔 수다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조신해 보이려고.
정신 없이 식사를 마치자 그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신호에 급정거하느라 차가 꿀렁하자, 그는 매너 있는 손길을 내 몸 앞으로 뻗었다. 또 가슴이 철렁했다. 꿀밤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졌다.
집 앞에 날 무사히 내려준 그는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돌아갔다. 바란 건 아니다…. 아니, 좀 바란 것 같기도 하다. '난 남친이 있고 너와 난 직장 선후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라는 느낌을 팍팍 풍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쾌활하게 얘기하며 식사했지만, 사실 이성간에 흐르는 그 기묘한 기류를 나도 몰랐을 리 없다. 일기장에서조차 모른 척 할 뿐. 침대에 엎드려 이 일기를 쓰는 동안에만 이불 발차기를 다섯 번이나 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정신 없이 식사를 마치자 그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신호에 급정거하느라 차가 꿀렁하자, 그는 매너 있는 손길을 내 몸 앞으로 뻗었다. 또 가슴이 철렁했다. 꿀밤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졌다.
집 앞에 날 무사히 내려준 그는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돌아갔다. 바란 건 아니다…. 아니, 좀 바란 것 같기도 하다. '난 남친이 있고 너와 난 직장 선후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라는 느낌을 팍팍 풍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쾌활하게 얘기하며 식사했지만, 사실 이성간에 흐르는 그 기묘한 기류를 나도 몰랐을 리 없다. 일기장에서조차 모른 척 할 뿐. 침대에 엎드려 이 일기를 쓰는 동안에만 이불 발차기를 다섯 번이나 했다. 나 이제…, 어떡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