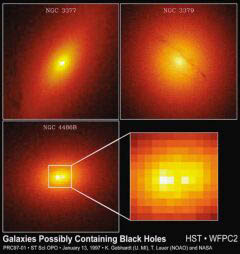지난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LTE어드밴스드(LTE-Advanced)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LTE? 이건 또 무슨 약자지? 4세대? 아이폰4가 4세대 아니었나? 하며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동통신기술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4세대 이동통신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며 어떤 기술을 이용할까.


태초에 마르코니가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전파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전신기를 만들었다. 무선통신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인터넷에 접속하고 내려받은 영상을 감상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됐다. 그런데 현재의 이동통신 기술은 조만간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 덕분이다. ‘아이폰4’는 단지 ‘4’라는 이름 때문에 4세대 휴대전화로 오해를 받았을 뿐 3세대에 속한다. 먼저 이 ‘세대’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자.
휴대전화를 꽤 오래 쓴 사람도 대부분 2G, 즉 2세대부터 기억한다. 그다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통화다. 아날로그 방식은 소리의 파형을 그대로 전자파로 변형해 정보를 전달한다. 1970년대 모토롤라가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을 시작했다. 거기에 쓰인 주파수 변조 방식이 아직 라디오에서 쓰고 있는 FM이다.
휴대전화를 영어로는 ‘Cellular Phone’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도 1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 나왔다. 당시 지역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 뒤 각각에 기지국을 하나씩 세워 휴대전화와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을 썼다. 한 기지국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므로 더 가까운 기지국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기지국 하나가 담당하는 지역을 ‘셀’이라고 한다. 이런 셀룰러 방식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다.
하지만 셀룰러 방식은 기지국 하나를 여러 명이 함께 쓰기 때문에 동시에 통화할 경우 서로 쓰는 주파수 간에 간섭이 생긴다. 따라서 간섭을 막기 위해 자원을 골고루 분배해야 했다. 이동통신에서 자원이란 주파수와 시간을 말한다. 1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주파수를 나눴다. 800~900MHz의 주파수를 이용했다면 이 구간을 수십 KHz씩 나눠 각각을 한 명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MA)’이라고 한다.
본격 디지털 세대의 등장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방식을 사용했다. 아날로그 방식은 신호에 끼어드는 잡음을 없애기가 어려웠는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의 수열로 바꿔 보낸다. 예를 들어 0을 5V로, 1을 -5V로 나타낸다면, 잡음이 끼어 4.8V의 신호가 와도 잡음을 무시하고 0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은 아날로그보다 주파수 효율이 낮았다. 보통 사람의 음성 대역이 0~4KHz이므로 아날로그는 4KHz의 대역폭이면 음성을 보낼 수 있다. 반면 초기 디지털 음성은 아날로그보다 16배나 넓은 대역폭이 필요했다. 1940년대에 이미 미국의 수학자 클라우드 샤논이 디지털 통신 개념 및 방법을 이론적으로 확립했음에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한 까닭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통신 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데는 압축 기술과 광섬유 전송기술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다. 디지털 신호를 작게 압축하는 기술이 발달해 아날로그73와 비슷한 대역폭으로도 전송이 가능해졌고, 광섬유 전송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값싸게 전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신호를 다루는 집적회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유럽에서 쓴 GSM과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쓴 IS-95다. GSM은 1세대와 달리 시간을 나눠 쓴다. 시간을 수백 마이크로초 정도로 잘게 쪼개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만 신호를 보내지만, 띄엄띄엄 오는 신호를 원래 시간에 맞게 틀어 주면 통화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를 ‘시분할다중접속(TDMA)’라 한다.
정보 이론에 따르면 TDMA 및 등분할 FDMA 모두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모든 주파수를 쓰는 게 최적이다. 이를 구현한 게 IS-95가 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다. CDMA는 각각의 사용자가 모든 자원을 쓰되 서로 다른 코드를 이용해 간섭을 막는다. 미국의 퀄컴이 개발해 크게 성공한 전송방식이다.
2세대까지는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주요 전송 대상이었다. 3세대에 이르러 인터넷 이용과 같은 데이터 통신이 늘어났다. 그래서 3세대는 CDMA를 확장한 WCDMA를 쓴다. 기본 원리는 같지만 대역폭을 늘린 것이다.




태초에 마르코니가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전파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전신기를 만들었다. 무선통신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인터넷에 접속하고 내려받은 영상을 감상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됐다. 그런데 현재의 이동통신 기술은 조만간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 덕분이다. ‘아이폰4’는 단지 ‘4’라는 이름 때문에 4세대 휴대전화로 오해를 받았을 뿐 3세대에 속한다. 먼저 이 ‘세대’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자.
휴대전화를 꽤 오래 쓴 사람도 대부분 2G, 즉 2세대부터 기억한다. 그다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통화다. 아날로그 방식은 소리의 파형을 그대로 전자파로 변형해 정보를 전달한다. 1970년대 모토롤라가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을 시작했다. 거기에 쓰인 주파수 변조 방식이 아직 라디오에서 쓰고 있는 FM이다.
휴대전화를 영어로는 ‘Cellular Phone’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도 1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 나왔다. 당시 지역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 뒤 각각에 기지국을 하나씩 세워 휴대전화와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을 썼다. 한 기지국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므로 더 가까운 기지국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기지국 하나가 담당하는 지역을 ‘셀’이라고 한다. 이런 셀룰러 방식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다.
하지만 셀룰러 방식은 기지국 하나를 여러 명이 함께 쓰기 때문에 동시에 통화할 경우 서로 쓰는 주파수 간에 간섭이 생긴다. 따라서 간섭을 막기 위해 자원을 골고루 분배해야 했다. 이동통신에서 자원이란 주파수와 시간을 말한다. 1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주파수를 나눴다. 800~900MHz의 주파수를 이용했다면 이 구간을 수십 KHz씩 나눠 각각을 한 명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MA)’이라고 한다.
본격 디지털 세대의 등장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방식을 사용했다. 아날로그 방식은 신호에 끼어드는 잡음을 없애기가 어려웠는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의 수열로 바꿔 보낸다. 예를 들어 0을 5V로, 1을 -5V로 나타낸다면, 잡음이 끼어 4.8V의 신호가 와도 잡음을 무시하고 0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은 아날로그보다 주파수 효율이 낮았다. 보통 사람의 음성 대역이 0~4KHz이므로 아날로그는 4KHz의 대역폭이면 음성을 보낼 수 있다. 반면 초기 디지털 음성은 아날로그보다 16배나 넓은 대역폭이 필요했다. 1940년대에 이미 미국의 수학자 클라우드 샤논이 디지털 통신 개념 및 방법을 이론적으로 확립했음에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한 까닭이다.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한 1세대 전화기.]


[FDMA와 TDMA 시간과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왼쪽은 주파수를 나눠 쓰는 FDMA고, 오른쪽은 시간을 나눠 쓰는 TDMA다.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통신 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데는 압축 기술과 광섬유 전송기술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다. 디지털 신호를 작게 압축하는 기술이 발달해 아날로그73와 비슷한 대역폭으로도 전송이 가능해졌고, 광섬유 전송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값싸게 전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신호를 다루는 집적회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유럽에서 쓴 GSM과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쓴 IS-95다. GSM은 1세대와 달리 시간을 나눠 쓴다. 시간을 수백 마이크로초 정도로 잘게 쪼개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만 신호를 보내지만, 띄엄띄엄 오는 신호를 원래 시간에 맞게 틀어 주면 통화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를 ‘시분할다중접속(TDMA)’라 한다.
정보 이론에 따르면 TDMA 및 등분할 FDMA 모두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모든 주파수를 쓰는 게 최적이다. 이를 구현한 게 IS-95가 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다. CDMA는 각각의 사용자가 모든 자원을 쓰되 서로 다른 코드를 이용해 간섭을 막는다. 미국의 퀄컴이 개발해 크게 성공한 전송방식이다.
2세대까지는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주요 전송 대상이었다. 3세대에 이르러 인터넷 이용과 같은 데이터 통신이 늘어났다. 그래서 3세대는 CDMA를 확장한 WCDMA를 쓴다. 기본 원리는 같지만 대역폭을 늘린 것이다.

[이동통신 기술은 하나의 기지국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쾌적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들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대용량의 3D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재생해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 4세대 이동통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화상통화는 물론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다.]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화상통화는 물론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다.]
진정한 스마트 시대를 여는 4세대 이동통신
최근 4세대 이동통신 개발이 열기를 띠는 이유는 뭘까. 지난 1~2년 사이에 휴대전화 시장의 판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원하는 통신 용량을 갑자기 크게 늘려 놓았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기술이 더 앞서갔다면, 이제 반대로 기술이 뒤처진 셈이다.
3세대까지 전송방식으로 쓴 CDMA는 사실 코드가 완벽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씩 생기는 간섭을 막기 위해 신호의 세기를 제어한다. 처음에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 갑자기 강한 신호를 보내면 다른 사용자에게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 들어갈 때는 약하게 보내 보고 안 되면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라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음성통화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단 정보를 화면에 띄운 뒤에는 통신을 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띄엄띄엄 터치할 때만 신호를 주고받는 데이터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이동통신인 LTE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OFDMA)’ 방식을 쓴다. 1세대에서 썼던 주파수분할다중접속을 개선한 방식이다. 여기에 ‘다중안테나기술’이 함께 들어간다. 다중안테나기술은 기지국과 휴대전화에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해 통신 용량을 높인다. 안테나의 수에 비례해 용량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가 LTE의 핵심기술이다. 이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LTE어드밴스드는 LTE에 ‘기지국간협력’ 기술까지 들어가 있다. 보통 기지국 두 곳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으면 간섭이 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 기지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호 하나를 빼거나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월 25일 열린 LTE어드밴스드 시연회에서 600Mbps(1초에 6억 비트)의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다. 현재 쓰고 있는 3세대에 비해 약 40배 가량 빠르다. 용량이 20기가 정도인 풀HD 영화 한 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 정도에 불과하다.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끊김 없이 120Mbps의 속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서도 무리 없이 고속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LTE어드밴스드는 앞으로 2~3년 안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4세대 이동통신 기술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휴대전화 네트워크와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의 경쟁이 남아 있다. LTE진영은 와이파이(무선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 ‘펨토셀’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범위가 수 km인 이동통신 기지국보다 범위가 훨씬 작은 초소형 기지국을 만들어 와이파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컴퓨터 진영에서는 와이파이에 이동성을 가미해 맞섰다. 바로 와이브로 어드밴스다.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결과가 어떻든 사용자는 더욱 편리해진 세상을 접할 것이다. 점점 빠르고 똑똑해진 스마트폰이 나올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모듈이 각종 전자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통신 모듈은 필요한 기계에 정확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는 스마트 그리드에 쓸 수 있고, 자동차에 기본으로 들어 있어 교통량에 따라 신호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데도 쓸 수도 있다. 편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생활의 효율을 높이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4세대가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지금 벌써 스마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세상이 얼마나 스마트해질지 궁금해진다.
최근 4세대 이동통신 개발이 열기를 띠는 이유는 뭘까. 지난 1~2년 사이에 휴대전화 시장의 판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원하는 통신 용량을 갑자기 크게 늘려 놓았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기술이 더 앞서갔다면, 이제 반대로 기술이 뒤처진 셈이다.
3세대까지 전송방식으로 쓴 CDMA는 사실 코드가 완벽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씩 생기는 간섭을 막기 위해 신호의 세기를 제어한다. 처음에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 갑자기 강한 신호를 보내면 다른 사용자에게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 들어갈 때는 약하게 보내 보고 안 되면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라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음성통화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단 정보를 화면에 띄운 뒤에는 통신을 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띄엄띄엄 터치할 때만 신호를 주고받는 데이터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이동통신인 LTE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OFDMA)’ 방식을 쓴다. 1세대에서 썼던 주파수분할다중접속을 개선한 방식이다. 여기에 ‘다중안테나기술’이 함께 들어간다. 다중안테나기술은 기지국과 휴대전화에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해 통신 용량을 높인다. 안테나의 수에 비례해 용량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가 LTE의 핵심기술이다. 이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LTE어드밴스드는 LTE에 ‘기지국간협력’ 기술까지 들어가 있다. 보통 기지국 두 곳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으면 간섭이 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 기지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호 하나를 빼거나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월 25일 열린 LTE어드밴스드 시연회에서 600Mbps(1초에 6억 비트)의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다. 현재 쓰고 있는 3세대에 비해 약 40배 가량 빠르다. 용량이 20기가 정도인 풀HD 영화 한 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 정도에 불과하다.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끊김 없이 120Mbps의 속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서도 무리 없이 고속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LTE어드밴스드는 앞으로 2~3년 안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4세대 이동통신 기술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휴대전화 네트워크와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의 경쟁이 남아 있다. LTE진영은 와이파이(무선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 ‘펨토셀’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범위가 수 km인 이동통신 기지국보다 범위가 훨씬 작은 초소형 기지국을 만들어 와이파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컴퓨터 진영에서는 와이파이에 이동성을 가미해 맞섰다. 바로 와이브로 어드밴스다.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결과가 어떻든 사용자는 더욱 편리해진 세상을 접할 것이다. 점점 빠르고 똑똑해진 스마트폰이 나올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모듈이 각종 전자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통신 모듈은 필요한 기계에 정확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는 스마트 그리드에 쓸 수 있고, 자동차에 기본으로 들어 있어 교통량에 따라 신호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데도 쓸 수도 있다. 편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생활의 효율을 높이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4세대가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지금 벌써 스마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세상이 얼마나 스마트해질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