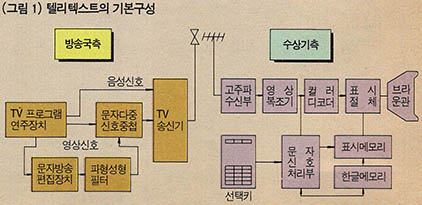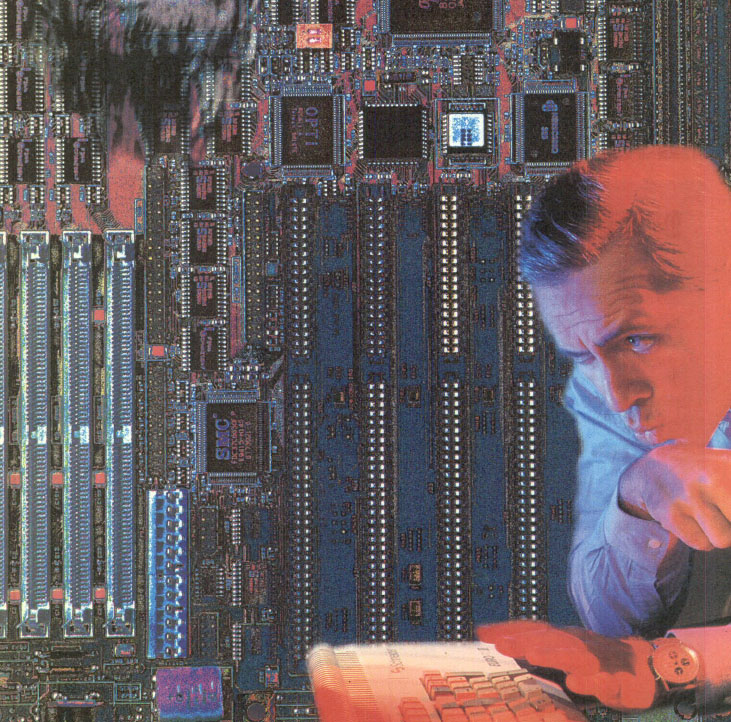한국 최초로 열리는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영암에서 열린다. 이 대회를 위해 특별히 건설하고 있는 F1 전용도로(서킷)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3400억 원이 들어간 최첨단 도로는 청량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져 있어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머신들과 함께 절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세계 19경기 중 17번째로 치러질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에 앞서 주요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자.
제로백에 승부를 건다
F1 머신의 엔진배기량은 2400cc로 중형차 수준이다. 하지만 엔진의 출력은 중형차보다 4배 많은 750마력이다. 머신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내며 말 그대로 ‘총알처럼’ 튀어나간다. 그래서 머신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되는 시간, 즉 제로백은 단 2초에 불과하다. 중형차의 제로백이 약 9초라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머신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 또 머신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60km까지 간 뒤 다시 정지 상태로 돌아오는 데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드라이버가 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직선코스와 곡선코스에서 어떻게 조절하지를 눈여겨 살피면 훨씬 더 재밌는 관람이 될 것이다.
초고속에서의 안전성, 차체를 믿어라!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머신들이 부드럽게 코너링를 돈다. 엎치락뒤치락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어 있다. 동물적인 운전 감각을 지닌 드라이버들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진 머신은 벽을 들이 받고 산산조각 난다. 과연 운전자는 안전할까. 놀랍게도 부품들이 산산조각 날만큼 큰 충격을 받는데도 드라이버가 들어 있는 차체는 찌그러지지 않는다.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어 드라이버는 멀쩡하게 걸어 나온다. F1 머신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든 차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jpg)
F1 머신의 차체는 두 장의 탄소섬유판 사이에 충격에 가장 강한 6각형 벌집 모양의 알루미늄판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만든다. 이 특수 합성 물질의 두께는 3.5mm에 불과하지만 철판보다 수 배 이상 견고하다. 드라이버의 바로 뒷부분에 있는 인덕션 포드는 12t의 충격을 견딜 수 있다. 튼튼하고 강한 드라이버의 운전석 덕분에 드라이버는 마음 놓고 아찔할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내구성은 NO! 오직 달리기만을 위해
수명이 짧은 차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동차 회사도 1~2년 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F1 머신은 오직 달리기 위해 태어난 차다. 100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머신에는 드라이버의 운전을 돕는 편의장치라곤 전혀 없다. 계기판과 속도계도 없고 오직 엔진회전수를 볼 수 있는 장치만 있다. 드라이버도 간신히 들어가는 좁은 운전석에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그리고 조그마한 사각형의 핸들만 있다.
내구성은 더 ‘빵점’이다. 엔진과 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부품은 경기마다, 또는 경기 도중에 바꿔줘야 한다. 일반 차량의 엔진은 30만km를 주행해도 끄떡없지만 머신은 700~1000km를 달리면 수명을 다한다. 두세 번의 경기를 치르면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다.
타이어의 수명은 더 짧다. 경기 주행거리인 308km를 다 달리지 못해 200km 정도가 되면 교체된다.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 타이어에 엄청난 열과 마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jpg)
소모품처럼 쓴다고 해서 저렴한 부품을사용하지 않는다. F1 머신은 초고가의 차량답게 최고의 부품만을 사용한다. 엔진은 최고의 성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티타늄처럼 열에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타이어는 접지력을 높일 수 있게 제조사의 모든 기술을 집약시킨다. F1 경기에 자사의 타이어가 사용되는 것은 모든 타이어 제조사들의 꿈이다.
브레이크는 탄소섬유로 만들어 2000℃에서 6개월을 구워야 디스크 하나가 완성된다. 덕분에 급제동이 필요할 때 빠르게 힘을 전달한다. 변속기는 핸들에 달린 레버를 움직여 0.005초 만에 빠르게 기어를 바꿀 수 있다.
.jpg)
변화된 규정을 잘 활용하라
전 세계 6억 명이 시청하는 F1은 발전하는 자동차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과 동시에 재미를 돋우기 위해 매년 규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몇 가지 규정이 독특하게 변해 각 팀들의 전략에 고민이 많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주유에 관한 규정이다. 주유하는 장면은 타이어 교체와 함께 F1 경기에서 가장 긴장되고 스릴감 넘치는 장면이었는데, 안전을 이유로 금지됐다. 그래서 출전팀들은 넉넉한 연료통을 마련하고 연료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무거워진 연료탱크를 감당할 수 있는 타이어를 달아야 한다.
포인트 시스템도 변경됐다. 예선 출전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점수도 10점에서 25점으로 크게 올렸다. 1위에서 10위까지 25, 18, 15, 12, 10, 8, 6, 4, 2, 1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해 1위와 2위의 점수 차를 크게 나도록 했다.
.jpg)
.jpg)
부품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운동에너지 재생시스템(KERS)’ 사용이 가능해졌다. KERS는 감속할 때 발생하는 회생 에너지를 배터리나 플라이휠 등에 저장하고 추월처럼 힘이 필요할 때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개발 비용이 비싸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올 대회부터 허용했다. 단 무게를 감안해 머신의 무게를 605kg에서 620kg으로 올렸다.
안전하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더블 디퓨저도 허용된다. 디퓨저는 머신 바닥의 공기흐름을 정리하면서 뒷부분에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다운포스는 차체를 들뜨지 않게 하고 속도를 높이는 힘이다.
단 휠 커버는 사용할 수 없다. 휠 커버는 타이어 주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지만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고 조립이 불량하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지했다.
최첨단 자동차 기술 이끄는 F1 대회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부품의 일부분을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튜닝 시스템’을 기본으로 발전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달리는 자동차이다 보니 각 분야별 튜닝기술이 필수다. 약간의 튜닝만으로도 일반차보다 약 7~10%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즉 F1에서 검증된 튜닝기술은 일반 양산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모터스포츠가 자동차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는 셈이다. 특히 모터스포츠의 정점인 F1은 공식(=포뮬러)의 조건을 맞추면서도 최고 난이도의 튜닝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은 F1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비록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가지만 F1 머신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분야도 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모터스포츠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초보적이다. 자동차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듬는다는 측면에서 F1 개최는 의미가 매우 크다. 국산 자동차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스템적인 원천 기술이 오로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F1은 우리만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동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1
제로백에 승부를 건다
F1 머신의 엔진배기량은 2400cc로 중형차 수준이다. 하지만 엔진의 출력은 중형차보다 4배 많은 750마력이다. 머신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내며 말 그대로 ‘총알처럼’ 튀어나간다. 그래서 머신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되는 시간, 즉 제로백은 단 2초에 불과하다. 중형차의 제로백이 약 9초라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머신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 또 머신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60km까지 간 뒤 다시 정지 상태로 돌아오는 데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드라이버가 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직선코스와 곡선코스에서 어떻게 조절하지를 눈여겨 살피면 훨씬 더 재밌는 관람이 될 것이다.
초고속에서의 안전성, 차체를 믿어라!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머신들이 부드럽게 코너링를 돈다. 엎치락뒤치락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어 있다. 동물적인 운전 감각을 지닌 드라이버들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진 머신은 벽을 들이 받고 산산조각 난다. 과연 운전자는 안전할까. 놀랍게도 부품들이 산산조각 날만큼 큰 충격을 받는데도 드라이버가 들어 있는 차체는 찌그러지지 않는다.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어 드라이버는 멀쩡하게 걸어 나온다. F1 머신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든 차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jpg)
F1 머신의 차체는 두 장의 탄소섬유판 사이에 충격에 가장 강한 6각형 벌집 모양의 알루미늄판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만든다. 이 특수 합성 물질의 두께는 3.5mm에 불과하지만 철판보다 수 배 이상 견고하다. 드라이버의 바로 뒷부분에 있는 인덕션 포드는 12t의 충격을 견딜 수 있다. 튼튼하고 강한 드라이버의 운전석 덕분에 드라이버는 마음 놓고 아찔할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내구성은 NO! 오직 달리기만을 위해
수명이 짧은 차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동차 회사도 1~2년 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F1 머신은 오직 달리기 위해 태어난 차다. 100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머신에는 드라이버의 운전을 돕는 편의장치라곤 전혀 없다. 계기판과 속도계도 없고 오직 엔진회전수를 볼 수 있는 장치만 있다. 드라이버도 간신히 들어가는 좁은 운전석에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그리고 조그마한 사각형의 핸들만 있다.
내구성은 더 ‘빵점’이다. 엔진과 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부품은 경기마다, 또는 경기 도중에 바꿔줘야 한다. 일반 차량의 엔진은 30만km를 주행해도 끄떡없지만 머신은 700~1000km를 달리면 수명을 다한다. 두세 번의 경기를 치르면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다.
타이어의 수명은 더 짧다. 경기 주행거리인 308km를 다 달리지 못해 200km 정도가 되면 교체된다.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 타이어에 엄청난 열과 마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jpg)
소모품처럼 쓴다고 해서 저렴한 부품을사용하지 않는다. F1 머신은 초고가의 차량답게 최고의 부품만을 사용한다. 엔진은 최고의 성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티타늄처럼 열에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타이어는 접지력을 높일 수 있게 제조사의 모든 기술을 집약시킨다. F1 경기에 자사의 타이어가 사용되는 것은 모든 타이어 제조사들의 꿈이다.
브레이크는 탄소섬유로 만들어 2000℃에서 6개월을 구워야 디스크 하나가 완성된다. 덕분에 급제동이 필요할 때 빠르게 힘을 전달한다. 변속기는 핸들에 달린 레버를 움직여 0.005초 만에 빠르게 기어를 바꿀 수 있다.
.jpg)
변화된 규정을 잘 활용하라
전 세계 6억 명이 시청하는 F1은 발전하는 자동차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과 동시에 재미를 돋우기 위해 매년 규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몇 가지 규정이 독특하게 변해 각 팀들의 전략에 고민이 많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주유에 관한 규정이다. 주유하는 장면은 타이어 교체와 함께 F1 경기에서 가장 긴장되고 스릴감 넘치는 장면이었는데, 안전을 이유로 금지됐다. 그래서 출전팀들은 넉넉한 연료통을 마련하고 연료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무거워진 연료탱크를 감당할 수 있는 타이어를 달아야 한다.
포인트 시스템도 변경됐다. 예선 출전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점수도 10점에서 25점으로 크게 올렸다. 1위에서 10위까지 25, 18, 15, 12, 10, 8, 6, 4, 2, 1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해 1위와 2위의 점수 차를 크게 나도록 했다.
.jpg)
.jpg)
부품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운동에너지 재생시스템(KERS)’ 사용이 가능해졌다. KERS는 감속할 때 발생하는 회생 에너지를 배터리나 플라이휠 등에 저장하고 추월처럼 힘이 필요할 때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개발 비용이 비싸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올 대회부터 허용했다. 단 무게를 감안해 머신의 무게를 605kg에서 620kg으로 올렸다.
안전하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더블 디퓨저도 허용된다. 디퓨저는 머신 바닥의 공기흐름을 정리하면서 뒷부분에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다운포스는 차체를 들뜨지 않게 하고 속도를 높이는 힘이다.
단 휠 커버는 사용할 수 없다. 휠 커버는 타이어 주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지만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고 조립이 불량하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지했다.
최첨단 자동차 기술 이끄는 F1 대회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부품의 일부분을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튜닝 시스템’을 기본으로 발전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달리는 자동차이다 보니 각 분야별 튜닝기술이 필수다. 약간의 튜닝만으로도 일반차보다 약 7~10%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즉 F1에서 검증된 튜닝기술은 일반 양산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모터스포츠가 자동차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는 셈이다. 특히 모터스포츠의 정점인 F1은 공식(=포뮬러)의 조건을 맞추면서도 최고 난이도의 튜닝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은 F1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비록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가지만 F1 머신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분야도 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모터스포츠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초보적이다. 자동차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듬는다는 측면에서 F1 개최는 의미가 매우 크다. 국산 자동차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스템적인 원천 기술이 오로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F1은 우리만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동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