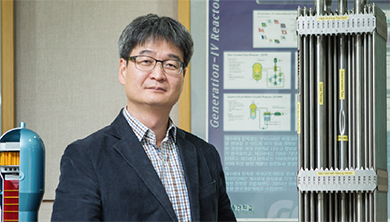"도대체 과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과학 공부가 싫어요."
한국과학문화재단이 2004년 실시한 “가장 싫어하는 과목”설문조사에서 과학은 수학에 이어 ‘당당히’ 2등으로 꼽혔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학생들이 과학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현직 과학교사 4명이 입을 모아 “교과서가 재미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새 교과서를 썼다.
이들은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를 펴내며 “학생들에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과학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책을 썼노라고 말한다. 글과 실험 장면만 가득한 기존 과학교과서와는 ‘차원이 다른’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먼저 통합 과학적 접근법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저자들은 기존 교과서에서 정석처럼 인식돼 온 ‘힘=역학’이란 등식을 거부한다.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힘, 지각에서 작용하는 힘, 원자들을 결합시키는 힘 모두를 ‘힘’이라는 범주로 묶어 소개한다. 이런 접근법은 ‘열’을 다루는 단원에서도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열, 동물의 체온 유지, 지구 내부의 열순환 등으로 이어진다. 이전 교과서라면 감히 한 단원으로 묶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분류방법이다.
과학적 원리에 접근하는 방법도 독특하다. ‘원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자. 딱딱한 오비탈 공식을 내세우는 대신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라부아지에, 돌턴에 이르는 과학적 사고가 어떤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인지 과학사와 일상을 넘나들며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들은 “쓰나미도 다루지 않는 과학교과서는 가라”고 일갈한다. 과학교과서도 사회의 변화상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스윙 바이’나 수중 분만 등 시사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을 따로 ‘교과서 밖의 과학’ 코너에서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관심을 끈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미래의 과학자들에게도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아가 단순히 과학적 원리와 효용성을 소개하는 데서 벗어나 과학의 성과가 자칫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려하며 즐거움을 주는 잡지 같은’ 서구의 교과서를 무작정 따라하지도 않았다. 전개가 느리고 장황한 서구 교과서의 단점은 과감히 버리고, 체계적인 서술로 핵심 내용을 집약해 이해하기 쉽다.
시원하고 읽기 쉬운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글과 사진, 일러스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편집 기법을 구사해 개념 원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꾸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