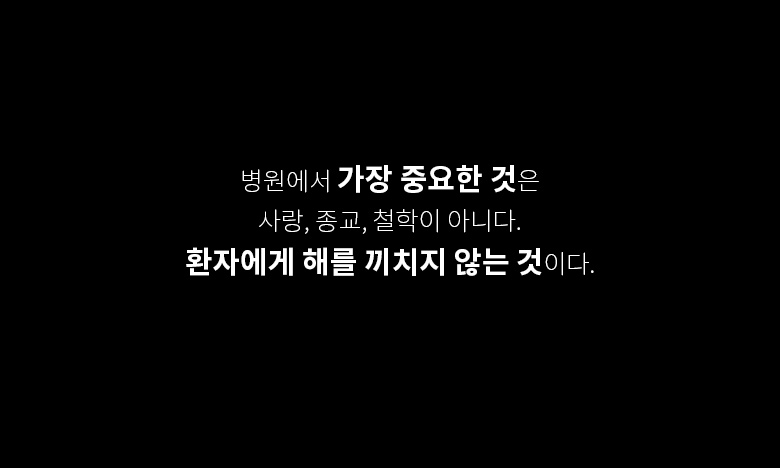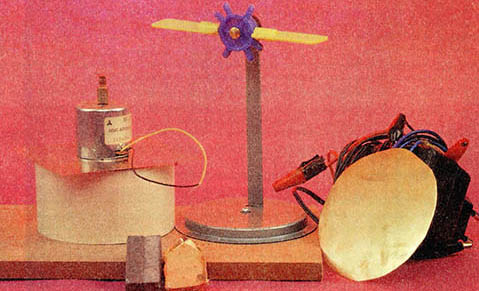8월 17일 아테네 올림픽 남자 자유형 2백m 결선이 열린 아쿠아틱 센터.
전자 부저음 소리와 함께 ‘인간 어뢰’ 이언 소프(호주)와 ‘수영 신동’ 마이클 펠프스(미국), 2000년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터 판 덴 호헨반트(네덜란드)가 거칠게 물결을 헤치며 세기의 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50m를 남기고 역전을 이뤄낸 소프의 승리. 올림픽 신기록이었다. 동시에 첨단 과학의 승리이기도 했다.
소프가 힘차게 팔을 휘두를 때마다 관람객들은 그의 몸을 감싼 검은 수영복에 눈길이 쏠렸다. 경기가 끝나고 은메달을 딴 옆줄의 호헨반트와 손을 맞잡을 때도 상체를 드러낸 호헨반트와 검은 수영복을 입은 소프는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제 메달 색깔은 과학에 달린 세상이 왔다. ‘신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마라톤’ 이라지만 동네 대회라면 몰라도 올림픽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이봉주 선수의 신발은 1억원을 들여 개발됐다. ‘맨발의 아베베’ 신화는 추억일 뿐이다.
축구 경기에서 공만 잘 찬다고 골을 넣는 것도 아니다. 축구화에 축구 유니폼도 남보다 앞서야 되고 큰 경기를 앞두고 선보이는 첨단 축구공에도 남들보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 수영복과 육상복은 점점 온몸을 감싸고, 양궁 선수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까지 한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 선보인 첨단 장비들을 파헤쳐보자.
비행기와 상어 모방한 전신수영복
이언 소프는 시드니 올림픽 때 아디다스가 개발한 ‘풀 바디 수트’ 라는 ‘전신 수영복’ 을 입고 3개의 금메달을 땄다. 당시 시드니 올림픽에서 33개 금메달 중 25개를 전신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차지했다.
수영 선수들은 물 속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작은 털까지 깎는다. 그러나 스포츠용품 회사들은 전신 수영복이 사람의 피부보다 더 저항이 작아 유리하다고 말한다. 수영복이 물의 저항을 줄이는 특수 옷감으로 만들어진데다 표면에 상어 피부를 모방한 미세한 돌기가 붙어 있어 선수 주위에서 빙글빙글 맴도는 작은 소용돌이를 없애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뉴욕주립대 조지프 몰런도프 박사는 “전신 수영복이 전통적인 수영복보다 저항을 10-15%까지 줄여준다”고 최근 발표했다.
소프가 이번 올림픽에 입은 전신 수영복은 4년전 입었던 것보다 한단계 더 발전한 ‘제트 콘셉트’ 다. 비행기의 동체와 날개에는 긴 홈이 나 있는데 이 수영복에도 겨드랑이 밑에서 허리까지 비슷한 홈이 나 있어 물이 선수의 등을 따라 유연하게 흐른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생물리학자 휴브 토세인트 박사는 지난해 ‘스포츠 생물리학’ 이라는 학술지에 “상어라면 몰라도 사람이 헤엄치는 속도에서는 전신 수영복이 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말해 앞으로 다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유형 2백m 결선에서 은메달을 딴 호헨반트도 첨단 과학의 수혜자다. 그가 착용한 물안경은 이른바 ‘무테 물안경’ 이다. 오직 한 쌍의 렌즈만으로 이뤄져 있고 의료용 접착물질을 이용해 렌즈를 얼굴에 붙인다. 이 물안경을 끼면 눈이 편하면서 시야가 폭넓게 확보되고 저항도 줄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가벼운 축구 유니폼

다음날인 8월 18일 그리스 테살로니키 카프탄조글리오 경기장.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말리와 기적 같은 무승부를 이루며 56년만에 8강에 진출했다. 이날 첨단 과학도 한국팀의 8강 진출에 기여했다.
한국보다 더 더운 그리스에서 축구 선수들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더위. 후반으로 갈수록 땀에 젖은 옷은 축축 늘어져 선수를 짓누른다. 한국팀이 입은 축구복은 무게가 1백55g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축구복 중 가장 가벼운 옷이다. 나이키가 개발한 이 옷은 앞판과 등판, 옆구리에 있던 재봉솔기를 없앴다. 섬유 조각을 실로 잇는 대신 용접하듯 열을 가해 이음새를 붙인 것이다. 무게와 부피가 줄고 솔기로 인한 피부 쓸림 현상도 없다.
또 어깨는 촘촘한 그물조직을 대고 겨드랑이 부분은 성긴 그물 옷감을 덧대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것도 체온을 낮추는데 유리하다. 한국이 후반전에 3골을 몰아칠 수 있었던 것에는 이 옷도 한몫 하지 않았을까. 후반 자책골을 유도한 크로스를 올린 최성국의 축구화도 골프공 7개의 무게에 불과한 1백96g이다. 다른 축구화보다 50m를 달릴 때 10% 더 빠르다.
이번 대회 공인구 ‘펠리아스’ 도 기존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박음질의 이음선이 없다. 고압으로 천 조각들을 붙여 더 가볍고 빨라졌으며 완전 방수된다. ‘펠리아스’ 는 물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가상현실 훈련한 양궁선수
여자 개인전과 남녀 단체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양궁은 첨단 장비와 함께 첨단 훈련 장비로 세계 1위 수성에 성공했다.
양궁에 쓰이는 활과 화살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다. 1970년대 후반 알루미늄과 나무, 탄소섬유를 결합한 화살이 나왔다. 1980년대 중반 화살 속대를 특수플라스틱인 ‘신택틱 폼’ 으로 만든 활이 등장했다.
현재 쓰이는 화살은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알루미늄만으로 만들어진 것과 알루미늄에 탄소섬유를 덧댄 2가지 종류가 있다. 속이 텅빈 화살이 나오면서 화살 속도는 초속 6m나 빨라졌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아테네의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 무게중심을 화살촉에서 화살대로 옮긴 화살이 개발됐다.
양궁 국가대표팀이 7월 선보인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도 돋보인다. 직접 경기를 하지 않고도 안경만 쓰면 실제 경기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연습장에서 몸을 풀고 경기장으로 이동해 7천5백여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는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마지막 화살까지 쏘는 등 매우 구체적이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이 시스템으로 수십번씩 훈련한 뒤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다. 심리적인 면이 크게 좌우하는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 것은 이 시스템 덕분이 아니었을까.
첨단 과학의 격돌 1백m달리기

올림픽의 꽃은 역시 1백m 달리기. 8월 22일 열린 인간 탄환들의 경연장 남자 1백m 결선은 첨단 과학의 각축장이었다. 특수 러닝화는 물론 수영처럼 전신 육상복이 최근 인기를 얻는 추세다.
금메달을 딴 저스틴 게이틀린(미국)이 신은 러닝화는 여성의 하이힐처럼 뒤꿈치를 살짝 들어준다. 1백m 경기중 마지막 30m를 남기고 선수들의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선수들의 힘의 빠지고 발뒤꿈치가 점점 밑으로 내려앉는다. 이때가 승부가 갈리는 고비다.
게이틀린이 신은 러닝화 ‘몬스터 플라이’ 는 발의 뒤꿈치를 강하게 잡아줘 선수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또 러닝화 뒷부분이 일정 각도로 들려 있어 피곤한 선수들이 마지막 30m에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나이키가 개발한 신제품이다.
육상 선수들이 입은 옷은 수영 선수처럼 팔이나 무릎 아래까지 덮지는 않지만 원피스 수영복처럼 상체와 하체를 꽉 쪼이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번에 동메달을 딴 모리스 그린(미국)은 아디다스가 개발한 ‘포모션’ 이라는 전신육상복을 입었다. 포모션은 몸에 착 달라붙어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허벅지 뒷부분에서 복근까지 밴드가 연결돼 선수가 발을 내뻗을 때마다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열기 냉각시키는 마라톤화

8월 29일 아테네에서 벌어진 올림픽 마라톤 경주.
이날 경기에 참가한 이봉주 선수는 두 발에 1억원이 넘는 마라톤화를 신고 뛰었다. 아식스가 1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운동화는 짝발인 이봉주 선수의 발 형태에 맞춘 데다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이봉주의 마라톤화는 겉에 특수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두르고 있다. 경기 도중 마라토너의 신발 안은 온도가 43~44℃, 습도는 95%로 올라간다. 발을 내딛을 때마다 전해져오는 충격은 물론 마찰열과 체온, 땀으로 신발 안은 습식 사우나 안처럼 무덥고 물집도 잘 생긴다. 그러나 이봉주의 마라톤화는 깊은 숨을 쉬는 것처럼 초당 3백20cm3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쉰다. 덕분에 신발안에 바람이 불면서 온도도 금새 38℃까지 내려간다. 습기도 함께 떨어진다. 또 이 신발은 15m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충격흡수 소재로 만들어졌다. 오르내리는 길이 많은 마라톤 코스를 고려한 것이다.
장대높이뛰기는 새로운 장대 소재가 나올 때마다 기록이 향상됐다. 처음에 사용된 재료는 물푸레나무나 서양 호두나무다. 당시 선수들이 튼튼한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 장대를 기어 올라가 3m를 넘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20세기 들어 탄성이 뛰어난 일본산 대나무가 등장하면서 4m의 기록이 깨졌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산 대나무는 사라지고 무게와 탄성이 고른 철이나 알루미늄 장대가 나와 기록은 4.8m까지 올라갔다. 현재 쓰이는 유리섬유 장대는 56년에 나왔다. 이 장대는 끝 부분이 크게 휘어지며 선수를 튀어오르게 한다. 현재 세계 기록은 세르게이 부브카가 세운 6.14m다. 꾸준히 더 좋은 유리섬유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기록이 깨질지 관심거리다.
고대 올림픽의 스포츠과학
첨단 장비로 기록을 향상시키고 승부에서 이기려는 노력은 근대 올림픽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대 올림픽에서도 나름대로 스포츠과학을 통해 기록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의 운동생리학자 알버트 미네티 박사는 2002년 10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 출전한 5종 선수들이 멀리뛰기를 할 때 저울에 쓰는 추를 이용해 기록을 높였다”고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 에 발표했다.
기원전 700년경 그려진 고대 올림픽의 모습을 보면 당시 선수들은 두 손에 추와 비슷한 도구를 하나씩 들고 힘차게 멀리뛰기를 했다. 이 추는 돌이나 납으로 만들어졌다. 연구팀이 실제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결과 이 추를 이용하면 3m를 뛸 때 약 17cm를 더 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추 한개의 무개는 3kg이 가장 적당했으며 추가 더 무거우면 뛰는 거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네티 박사는 “추를 흔들면 팔에서 더 많은 근육이 움직여 힘이 많이 나오고 이 힘이 다리에 전달돼 도약할 때 더 세게 발을 구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를 계속 보시려면?
올림픽과 스포츠과학
① 천재선수, 유전자부터 다르다
챔피언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② 금메달 제조기 '스포츠 과학'
전신수영복의 원리
여자 양궁 선수의 첨단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