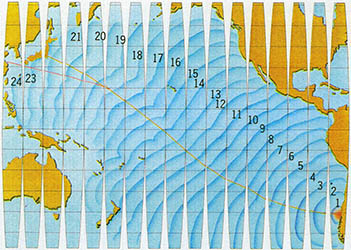언제부터인가 궁궐마당에 서서 앞쪽의 전각이 아니라 뒤편에 심어진 나무에 눈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됐다. 나무학자 박상진 교수의 ‘궁궐의 우리나무’가 출간된 후에 생긴 궁궐산책의 새로운 풍경이다. 나무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나무에 얽힌 역사이야기가 흥미롭게 엮어진 이 책으로 인해 나무를 보러 궁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 박 교수가 잇따라 낸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김영사, 2004)와 ‘나무, 살아서 천년을 말하다’(랜덤하우스중앙, 2004) 역시 나무를 찾아나서는 사람들의 반가운 길벗이 될 것 같다. 연초록 어린잎들이 햇빛을 받아 수줍게 반짝이는 종묘에서, 나무를 알아야 숲도 알 수 있다는 박상진 교수를 만나봤다.

5백년 궁궐살이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 을 비롯한 역사서에 나오는 나무이야기와 목질문화재 이야기가 어우러져 우리 나무의 생태뿐 아니라 나무에 얽힌 문화를 맛볼 수 있으니, 가히 아름다운 문체로 풀어쓴 ‘나무의 문화사’ 라 할 만하다.”
‘궁궐의 우리나무’ 에 대한 미술사학자 강우방 교수의 평이다. 자연과학자의 연구를 인문학자가 평한다는 것도 우리 학계에서는 드문 일인데, 그 연구 또한 ‘문화사’에 이를 만하다는 것은 괜한 찬사가 아닐까. 하지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덕수궁 등 궁궐에 있는 나무를 주인공으로, 그 식생은 물론이고 나무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까지 엮어낸 책의 내용을 접하면 과연 그렇구나 하며 고개가 끄덕여진다.
원래 ‘궁궐의 우리나무’ 는 박 교수가 대학에서 수목학 교재로 쓰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임산공학과를 택한 학생들조차 나무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이고 관심조차 부족한 실정에서, 생소한 수목학을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는 익숙한 나무와 연관시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진 것이라고.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나무만을 연구해온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사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책을 펼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무의 모습은, 저자 자신이 틈틈이 찍어온 수만장의 사진에 ‘궁궐의 우리나무’ 를 위해 다시 특별한 정성을 더한 것이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고, 사시사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 역시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기 마련인데, 그 절정의 순간을 기다려 아름다운 사진 한장을 얻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책이니 앞서의 평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
나무, 역사의 목격자
‘궁궐의 우리나무’ 에도 나무문화재의 재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온 박상진 교수의 관심이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다. 아예 나무문화재와 인연을 맺은 과정에서부터 나무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투영된 사람과 나무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다.
글자가 새겨진 나무판인 죽간과 목간, 죽은 임금의 시신을 모신 관재, 옛 배를 만드는데 쓰였던 선박나무, 옛 절의 건축재 등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역사, 문화와 어우러져 재미를 더한다. 신안해저유물선과 무령왕릉 발굴의 비밀,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등 손톱 크기만한 나무조각 하나를 붙잡고 현미경과 씨름하며 보낸 30년 세월이 오롯이 녹아있다.
‘나무, 살아서 천년을 말하다’ 는 박 교수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찾아낸 노거수(老巨樹)의 천가지 사연과 만가지 표정을 담은 책이다.
“사람에게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있다면, 나무에게는 기쁨과 함께 힘들게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희로애락(喜勞哀樂)이 있습니다. 속리산 정이품송처럼 임금과 인연을 맺어 벼슬까지 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각박한 현실에서 의지할데 없는 민중들의 기도와 염원의 대상이 됐던 나무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30년을 한결같이 나무를 연구해온 박 교수 역시 나무를 대하는 일상이 지겨울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럴 때면 언제라도 가방을 둘러메고 미련 없이 훌쩍 떠난다고. 그런데 번거로운 일상을 피해가는 자연에서, 아름드리 나무와 또 마주치게 되니 어느덧 다시 나무 속 깊은 세계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나무와 더불어 보낸 세월에서 우러나오는 “나무와 마주앉아 대화한다” 는 박 교수의 말을 누가 헛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정년을 1년반 정도 남기고 있는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석하는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출품될 ‘한국의 책 1백권’ 에 선정된 ‘궁궐의 우리나무’ 의 일본어 번역작업으로 더욱 바쁠 듯 하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해 전에 냈던 ‘다시 보는 팔만대장경판 이야기’(운송신문사, 1999)를 보충해 팔만대장경판 제작과정의 역사적 비밀도 밝혀볼 생각이다.
흔히 고려와 몽골의 전쟁 중 승전을 기원하기 위해 강화도에서 제작돼 지금의 해안사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진 팔만대장경판에, 경판이 옮겨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원래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들이 사용된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퇴직 후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나무이름의 유래와 근거를 찾은 것들을 정리한 ‘수목도감’ 까지 펴낸다면 박 교수의 지금 계획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