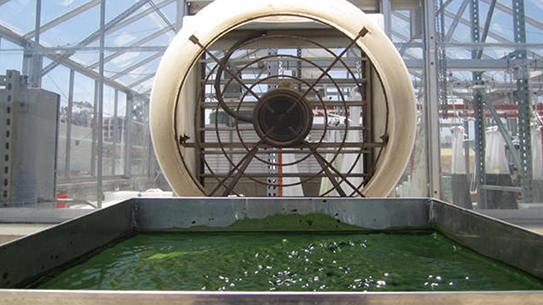도도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새다. 이들은 인간과 인간이 데려간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불과 수십년만에 멸종했다. 도도의 흔적은 ‘도도처럼 죽다’(as dead as a dodo)라는 표현으로만 남게 됐다. 1800년대에 가장 흔한 새 중 한 종류인 여행비둘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때는 수억마리씩 무리를 지어 날아다녀 ‘하늘을 덮어 어둠을 만든다’고 했던 동물이다.
‘자연의 빈자리’는 도도나 여행비둘기처럼 지난 5백년 동안 지구에서 자취를 감춘 동물들의 모습을 복원하고 그들의 존재를 기록한 책이다. 때로는 편지 속의 간단한 글과 알아보기 힘든 그림으로, 때로는 한장의 사진과 딱딱한 박제로만 남아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환경생물학자 플래너리와 야생동물 전문화가 샤우텐의 공동작업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플래너리와 샤우텐은 전세계 박물관에서 멸종 동물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 연구·분석한 후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맞는 동물을 골라냈다. 1500년에서 1999년 사이에 멸종된 포유동물·새·파충류, 실물묘사가 가능할 만큼 대상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 아종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들여진 생물일 것, 그 종이 멸종했다는 것에 다수의 동물학자들이 동의해야 할 것.
‘자연의 빈자리’에는 이 기준에 일치하는 1백여종의 동물들이 멸종 연대 순서대로 학명과 분포지역, 그리고 마지막 기록과 함께 실려있다. 작업과정에서 분류학적으로 애매하거나,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멸종 여부가 불확실해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의 목록으로 정리해 뒀다. 책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은 본격적인 신세계 탐험과 식민지 확장전쟁이 이뤄졌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목격된 것들이다. 이들 동물의 마지막 기록자들은 동시에, 동물을 멸종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플래너리와 샤우텐은 동물들이 살았던 섬과 사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확신이 들 때라야 비로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책에 있는 그림들이 원래는 모두 실물크기로 그려졌다는 사실이다. 꽃잎보다 작은 바하마벌새에서 몸통이 8m에 이르는 거대한 스텔라바다소에 이르기까지 살아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동물들의 깃털과 발톱, 그들이 딛고 서있는 땅과 나뭇잎, 조약돌 하나하나까지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 고증해서 꼼꼼히 그린 것이라고 하니 그들의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종이로 만든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도 바로 그들의 이런 노력 때문이다.
‘자연의 빈자리’에서 동물들의 빈자리가 언젠가는 인간의 빈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슬픈 생각을 넘어, 다양한 생명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인간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