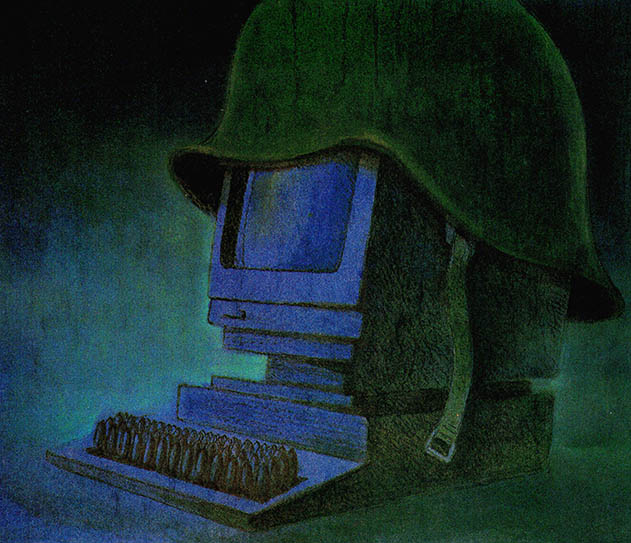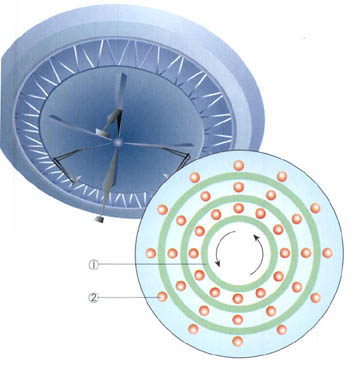봄이 오면 우포늪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초록 융단이 깔린다. 개구리밥, 생이가래, 어리연, 자라풀 등 물풀이 자라 늪의 수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 위에 가시연, 물옥잠, 자운영이 예쁘게 피어나 수를 놓으면 우포늪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포늪만큼 봄을 맞기에 좋은 장소가 없다는 것이 늪지킴이 ‘푸른우포사람들’의 이야기다.
‘우포늪’은 푸른우포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강병국, 성낙송 두사람이 우포늪의 자연과 그 안에 사는 생명체를 소개한 책이다. 우포늪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 뿐만 아니라 우포늪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까지 담았다는 점이 여느 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던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던 원시림인 우포늪을 찾아가는 길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한다. 비밀스런 세상을 탐사하듯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면 우포늪의 식물, 곤충, 물고기, 새, 포유·양서·파충류의 세계가 그 모습을 생생히 드러낸다. 우포늪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인 저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우포늪’을 읽다보면, 70만평에 이르는 드넓은 늪지에 사는 1천여종의 생명체가 제각각 멋진 모습을 드러낸다.
‘우포늪’은 우포늪의 동식물에 대한 생태환경 보고서이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집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래한 시집이다. 늪에 몸을 담궈 논우렁이와 민물조개를 잡고, 장대나뭇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대로 자연의 일부가 된다.
사실 늪지대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책을 펴내기 위해 우포늪을 처음 찾았던 편집자의 고백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그저 풀덩이로만 보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할지 참으로 난감할 수도 있다.
사전 지식이 없다면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푸른우포사람들은 여름에는 생태교실을, 겨울에는 탐조학교를 열어 사람들이 우포늪에 관심을 갖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연보호식물 뿐만 아니라 희귀종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습지보전국제협약(람사협약)에 등록돼 있는 세계적인 습지, 우포늪. 하지만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3백년 후면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3백년 후에 이 땅을 살게 될 후손들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은 아닐까.
수양버들의 푸르름이 상쾌함을 더하는 봄, 잠자리가 떼지어 물 위를 나는 여름, 반딧불이가 청명한 밤을 밝히는 가을, 철새들의 날개짓이 하늘을 뒤덮는 겨울. 언제라도 한번쯤 우포늪을 찾아가보면 어떨까. 눈밝은 길잡이가 돼줄 이 책과 함께. 그러다가 우포늪을 지키는 푸른우포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이 기사의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500(500원)이 필요합니다.
2003년 04월 과학동아 정보
🎓️ 진로 추천
- 생명과학·생명공학
- 환경학·환경공학
- 도시·지역·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