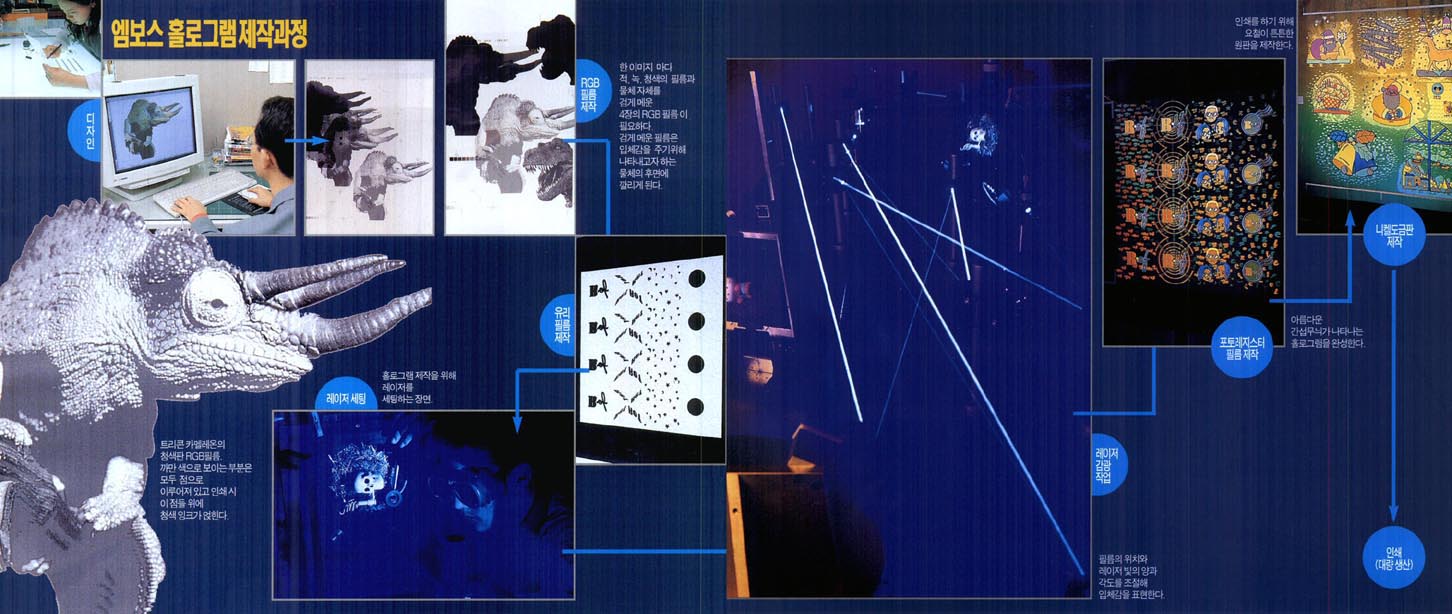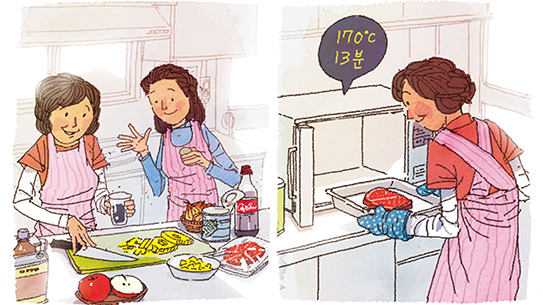대학 1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대에 부풀어 나간 미팅 자리에서 미생물학과라고 말하면 십중팔구 “그럼 바퀴벌레를 연구하시나요?”란 질문을 받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아질 무렵 “미대 생물학과입니다”라고 선수를 치곤 했습니다. 동물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해내는 크로키나 동식물도감에 나오는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 미대에서도 생물학을 공부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때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르네상스 이전까지 과학은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남긴 책을 번역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동식물의 그림도 책이나 이곳저곳에서 주워 들은 말로 상상해서 그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직접 관찰한 것을 그리게 되면서 새로운 과학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미술가들이 큰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대 과학의 발달은 미대 생물학도들의 공로가 아닐까요.
동식물의 살아있는 ‘초상화’

르네상스의 과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독일의 미술가 알프레드 뒤러(1471-1528)입니다. 그의 그 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림 속의 사물을 실제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상이 사람이든 아니면 토끼, 잡초이든 그의 손을 거치면 화폭에 ‘살아’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뒤러가 모든 사물의 ‘초상화’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일차적으로 기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덕분이었습니다. 인체의 비례와 기하학을 다룬 그의 책 ‘컴퍼스와 자를 이용한 측정법 강의’(1527)는 미술뿐 아니라 3차원 기하학과 이를 이용하는 자연과학에 폭넓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동판화 ‘아담과 이브’는 인체의 비례를 완벽하게 표현한 수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뒤러의 또다른 능력이 숨어있습니다.
당시 미술의 중심지는 르네상스의 주요 무대였던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에서 배경에 있는 풀 하나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것들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배경에 그려진 식물들은 뒤러의 고국인 독일에서 자라는 종류였습니다. 직접 관찰해보지 않고서는 그토록 세밀하게 묘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 자신이 훌륭한 식물학자였던 것입니다.
뒤러의 사실적인 묘사법은 동식물의 삽화로 과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상스기에는 동식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책들이 많이 출간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동식물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식물학자인 푹스와 동물학자 게스너의 책들은 바로 뒤러의 독창적 화법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또 당시 뇌 해부도의 표준이 된 목판화를 만든 한스 팔퉁 그리엔은 그의 직계 제자이며, 푹스와 함께 식물학을 새롭게 개척한 브룬펠스의 혁신적인 식물지에 그림을 그린 사람 역시 제자인 한스 바이디츠였습니다.
뒤러의 영향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그의 코뿔소 그림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게스너의 동물지에는 코뿔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코뿔소를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뒤러가 그린 펜화를 베낀 것입니다.
문제는 뒤러 역시 코뿔소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곳저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그린 것이죠. 그래서 그림의 코뿔소는 목 뒤에 작은 뿔(그림 3 원 안)이 있고 중세기사처럼 철갑을 두르고 있으며 다리엔 비늘이 있는 등 실제 모습과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당연히 코뿔소가 뒤러가 그린 것처럼 생겼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자의 고뇌 표현

뒤러가 사실적인 화풍을 개척한 데에는 금세공사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장인정신과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체득한 르네상스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림이 ‘멜랑꼬리아 Ⅰ’입니다. 그림에는 한손엔 컴퍼스를 쥐고 한손으론 턱을 괸 여인을 중심으로, 아래 부분에는 톱, 대패, 망치 등이 놓여있고 인물의 뒤편에는 모래시계, 저울, 종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합이 34가 되는 마방진(魔方陣)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뒤러는 이 그림의 제목을 멜랑꼬리아, 즉 ‘우울’이라고 붙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즉 뒤러 자신의 고뇌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중세에까지 맹위를 떨치던 고대 그리스의 의학은 인간의 성질을 4가지 체액의 과다에 따라 흑담즙질(우울), 황담즙질(짜증), 다혈질(활기), 점액질(음울)로 나눴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운데 정치가, 철학자, 예술가처럼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울질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그림 아래의 기술적인 도구와 위의 과학적 도구를 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파악해내려는 과학자, 예술가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르네상스기의 그림에는 화가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대표적인 예로, 그는 자신이 그린 시스티나성당 천정화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아의 모습으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나학당’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모습으로 턱을 괴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랑코리아의 주인공은 뒤러 자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영국 대영박물관에서는‘알프레드 뒤러와 그의 유산전’이 개최됐습니다.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정면을 향한 자화상에서 뒤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미대 생물학과입니다”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