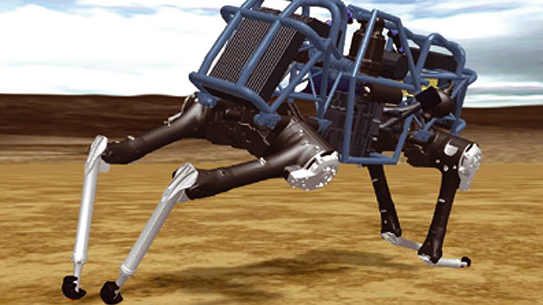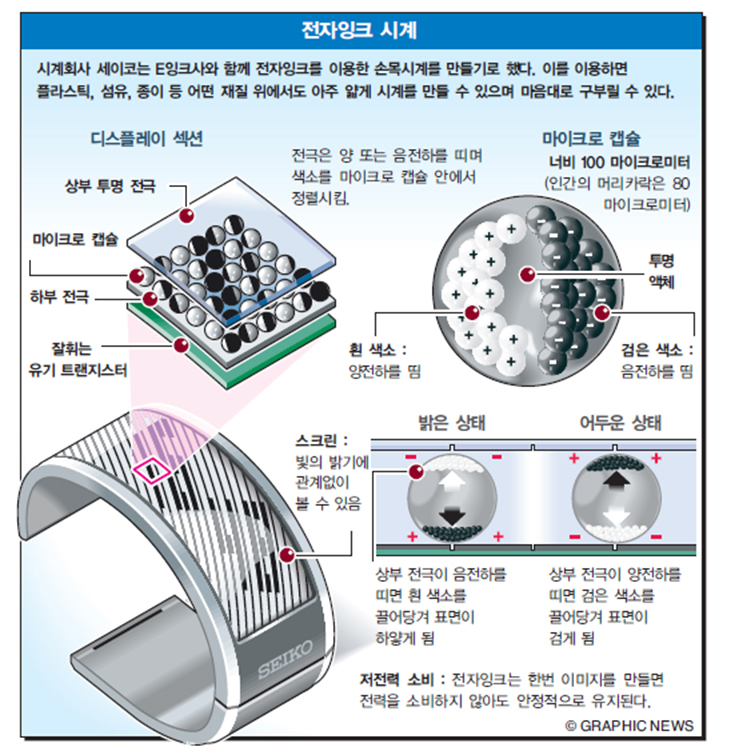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정지함에 따라 각 장기의 죽음(괴사)이 발생하고, 세포가 죽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이 붕괴돼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미노산의 붕괴는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 암 같은 악성종양의 발생, 심근 경색 등 혈류의 막힘, 노화에 의한 조직 변성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저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인가.
생물에게는 모두 생명의 한계가 있다. 만일 죽지 않는다면 종족을 보전하기 위한 자식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한번 태어난 종의 개체가 계속 생존해 그대로 존재한다면 종은 변이하지 않고 그 형질 또한 그대로 고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로서 살아있다는 것, 즉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한다"는 중요한 본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명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이유이며, 환경과 생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이 변하면 변이에 의해 적응해야 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은 나이가 들어 번식이 끝나면 개체의 생리기능이 약해지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결국 전체가 통합력을 상실해 죽음(생활사의 종말)을 맞는다.
비록 개체 수준에서는 죽더라도 종의 수준에서 보면, 생명체는 번식에 의해 유전자로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유전자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생물의 세계가 계속되는 한 공룡과 같이 종으로서 절멸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는 다른 파충류를 통해 양상을 바꾸어 계속 유지된다.
우리 인간이 가진 유전자에는 박테리아가 가진 유전자, 공룡이 가졌던 유전자, 그리고 그 밖의 생명체가 지녔던 유전자들이 한 부분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생명체의 한 개체는 죽어가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개체의 죽음으로써 유전자를 남겨 영원히 살고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말이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눈을 극미의 세계로, 그리고 광활한 우주로 돌리면 죽음의 의미는 어떻게 확장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