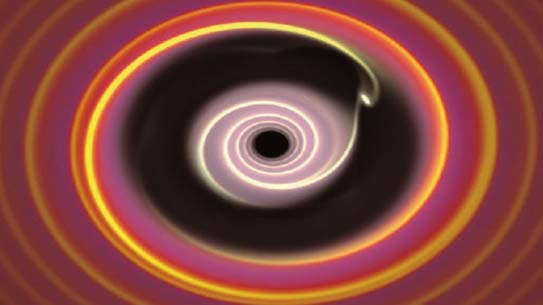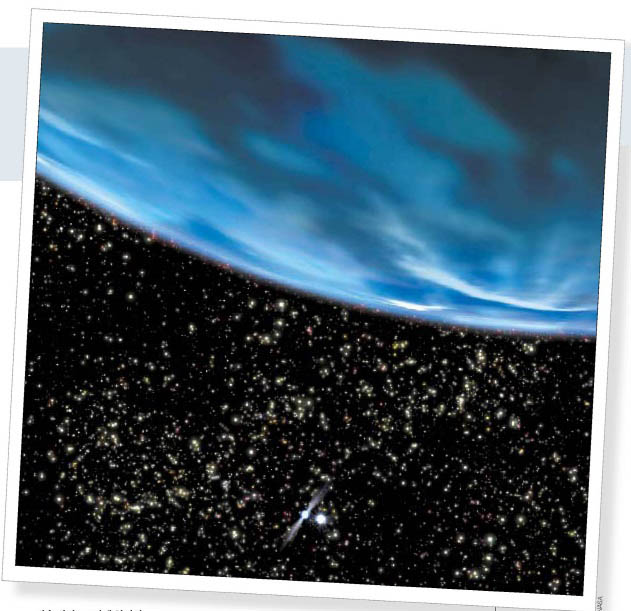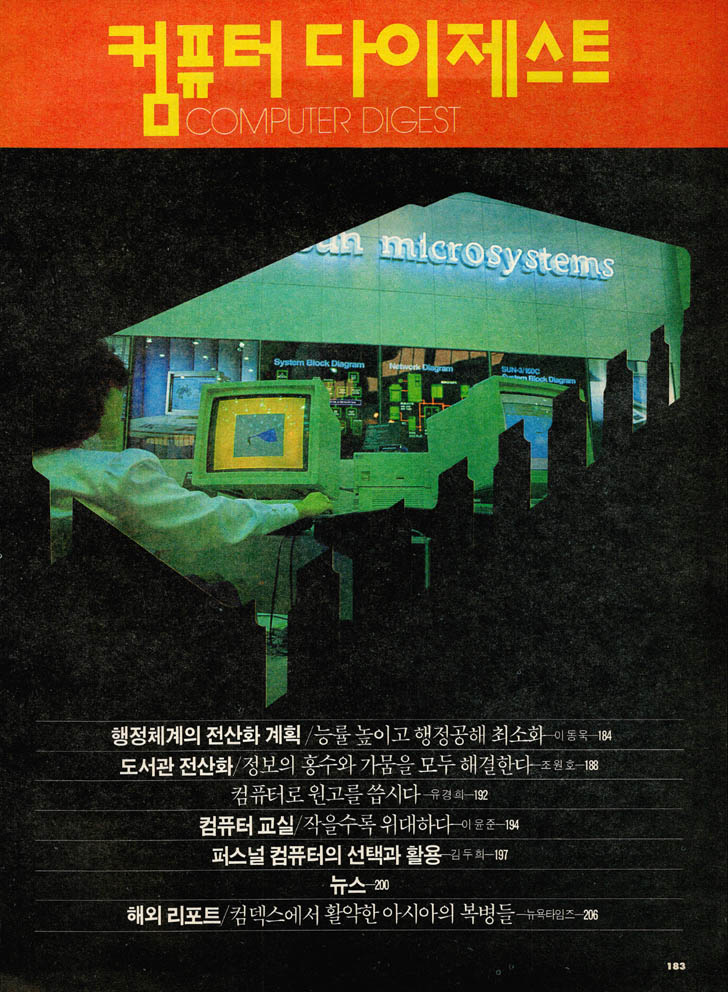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의 설계가 한창이던 1991년 6월. 필자는 영국행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 손으로 꼭 인공위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지 3년, 이를 위해 10여명의 학생들이 서리대학에서 위성교육을 받고 영국의 위성제작에 직접 참여해 경험을 쌓던 때였다. 막상 우리 위성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그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궁금했고 우리별 1호의 설계결과를 직접 점검해야 하는 의무감도 무겁게 느껴졌다.
영국에 도착해 담당교수로부터 "밤이면 실험실이 아예 한국 실험실로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또 풋내기 학생으로 떠났던 제자들이 전문 연구원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흐뭇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제자들이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이 녀석들이 저녁 사달라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속 장소는 학교 세미나실이었고 음식과 케익을 마련해 파티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소장님,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생일을 제자들이 기억해줬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파티에 대한 필자의 답례는 얼음장처럼 차거운 훈시였다. "우리별 1호 개발이란 큰 사명을 띠고 먼 타국땅에 온 사람들이 다른 일까지 신경쓴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별1호를 성공하지 못하면 도버해협을 건너올 생각을 하지마라."
필자는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별 1,2호를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오늘도 그때의 감동과 각오로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별3호를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