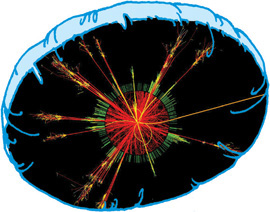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는 거장 임권택 감독의 101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우수한 전통한지를 되살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 보존, 복원작업을 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한지의 우수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영화에선 ‘한지가 천년을 간다’고 했는데, 그말은 사실이다.
흔히 일반 종이를 ‘양지’라고 부르며 한지와 구분하기도 한다. 부모님 서재에 꽂혀 있던 양지로 만든 책은 몇 십 년만 지나도 읽기 어려울 정도로 색이 바래지만 전통한지는 수백 년이 지나도 썩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한지의 우수성 때문에 복원작업이 오히려 고되고 힘들다. 서양회화를 되살려 내는 것처럼 물감을 덧칠하는 식으로 작업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고문서나 회화 복원은 결국 ‘불순물을 제거하고 본래 모습과 가깝게 되살리는’ 것이다. 돋보기와 현미경으로 한지 표면을 들여다보며 침착하고 끈질기게 핀셋과 브러쉬를 움직이는 꼼꼼한 ‘청소작업’이 전통 지류(종이) 문화재 복원의 정체다.
원칙 하나. 한지는 먼저 썩지 않는다
한지로 만든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한지는 먼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지를 처음 만든 것은 중국 후한의 ‘채륜’이다. 서기 105년 경 제조방법을 발견했다. 삼, 닥나무 등을 물에 담가 발효시킨 뒤 잘 찧어서 놓고, 잿물에 삶은 다음 햇볕에 말려 표백한다. 잿물의 주성분은 산화칼륨(K₂O)으로 염기성을 띄고 있다. 한지가 양지보다 서서히 산성화되는 이유다. 반면 1850년 이후 개발된 양지는 나무로 만든 펄프가 주 원료다. 한지처럼 섬유의 결이 살아 있지 않고, 주성분인 섬유소만 추출해 얻은 집합체(펄프)다. 펄프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에 황화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을 처리해 섬유질을 용해시켜 제거한다. 그리고 다시 화학처리 과정을 거쳐 섬유소 물질만 뽑아내 종이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리그닌, 헤미셀룰로오스 같은 목재 성분이 화학약품과 반응해 색깔이 변한다. 결국 거무튀튀한 보기 좋지 않은 종이가 만들어지므로 산화제인 염소,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산 등을 넣어 종이를 다시 희게 표백한다. 이 표백 작업때 발생한 산화 현상 때문에 양지는 pH4~5.5 정도의 산성을 띤다. 산성은 종이의 구조를 끊기 때문에 양지는 약 100여 년 사이 서서히 분해된다. 물론 처음부터 중성약품을 써서 만든 고급 ‘중성지’는 예외다.
이에 비해 한지는 천연기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통 pH9.0 이상의 알칼리성 종이가 된다. 더구나 닥나무의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 있어 습기에 따라 조금씩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잘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다.
물론 한지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원인은 한지 자체가 아니라 한지에 묻어 있는 불순물이다. 물감이나 먹, 풀 등이 습기와 만나면서 곰팡이가 슬거나, 벌레의 피해를 입는다. 곰팡이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놓는 찌꺼기, 균사, 벌레의 배설물 등은 대부분 산성물질이라서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쌓이면 결국 한지도 조금씩 변색되고 삭아 없어진다.
한지에 묻은 첨가제가 문제가 된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일부분은 벌레가 좀먹는 것을 막기 위해 한지 위에 밀랍을 발랐다. 이 밀랍이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문제가 됐다. 밀랍이 녹은 뒤 굳어지면서 한지가 뭉치고 찢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나섰지만 복원은 쉽지 않았다. 한지 자체는 손상시키지 않고 밀랍만 녹여내는 ‘탈납’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1998년부터 13년째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에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실제 탈납실험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 반면 밀랍을 바르지 않은, 순수한 한지로 만든 실록은 지금까지 잘 보관되고 있다.

생명체가 최대의 적
이런 원칙은 한지로 만든 고려, 조선시대 서책이나 미술작품도 마찬가지다. 먹이나 풀, 물감 등이 피해를 입으면 한지도 함께 손상을 입는다.
특히 미술작품은 한지를 두세 장 이상 풀로 덧붙여 튼튼하게 보강하는 배접(褙接)과정을 거친다. 이때 쓴 풀에는 적잖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습기에 노출되면서 곰팡이가 발생한다.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종이의 갈라짐을 막아 장기간 보관에 도움이 되지만 밀폐된 곳에선 곰팡이에게 좋은 서식처를 제공한다.

[지류문화재 복원을 주로 하는 경기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이 고문서를 살피며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고 있다. 원형을 사진으로 남긴 후 건식, 습식 클리닝과 종이를 덧대는 ‘배접’까지 끝나면 고급 중성지로 종이상자를 만들어 넣는다.]

곰팡이는 번식 속도가 빠르고, 한지 위에서 번져나가며 종이의 갈라짐을 막아 종이 속으로 스며들어 깊고 진한 얼룩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유기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지도 결국 빛이 바랜다.
벌레도 문제다. 닥나무 등의 섬유질을 이용해 한지를 제작하는 만큼 섬유류에 서식하는 좀과 바퀴벌레 등이 내놓는 배설물은 다시 한지를 산성으로 만든다. 따라서 한지로 만든 지류 문화재는 종류를 불문하고 곰팡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복원의 첫 번째 원칙이다.

털 것인가, 빨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복원의 시작은 역시 꼼꼼한 불순물 제거(클리닝) 작업이다. 곰팡이 같은 불순물을 제거해 먹으로 쓴 글씨나 미술작품의 색깔을 살려내고, 혹시 유기산으로 인한 탈색이 진행됐다면 종이의 색깔도 되살려 놓아야 한다.
조선시대에 편지는 얇은 한지에 먹을 이용해 글을 써 둥글게 말거나 접어서 봉투에 넣는 방식으로 보관하지만, 절에서 보관하던 불화(옛 불교그림)는 채색을 위해 두껍고 질긴 한지로 제작한다.
용도와 재료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손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서와 작품은 같은 한지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복원은 다소 다른 과정으로 이뤄진다.
먼저 클리닝작업을 진행하는데, 건식과 습식작업으로 구분한다.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한지 표면에만 발생했거나, 손상정도가 비교적 적은 경우는 건식으로 클리닝한다. 이 방법에서는 현미경과 돋보기 등으로 표면을 살펴보면서 핀셋으로 종이 속에 죽어 있는 작은 벌레 등을 꺼내고, 브러시로 먼지나 표면에 쓸어 있는 곰팡이 등을 털어낸다. 가느다란 노즐로 강한 바람을 불어넣는 에어 브레이시브(공기연마기) 등으로 종이 속까지 털어내기도 한다. 이런 작업은 모두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면서 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단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작업하다 보면 고문서나 작품의 본래 색깔이 한층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는 건식클리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고문서는 표지로 감싸져 있고, 책 같은 것은 여러 장의 종이가 포개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 글자나 그림이 바래거나, 습기 때문에 얼룩지는 일이 상대적으로적다. 벌레나 곰팡이도 상대적으로 덜 생긴다.
하지만 고문서라도 손상이 아주 큰 경우, 그리고 회화작품은 대부분 습식복원과정이 포함된다. 유리액자도 없던 시절에 족자 등의 형태로 벽에 그냥 걸어 두곤 했기 때문에 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상이 크다. 특히 채색화 같은 경우는 각종 유·무기안료를 진하고 두껍게 발라 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안료가 박락(剝落)되면서 한지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다.
습식클리닝은 깨끗한 증류수나 알코올 등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녹여 내면서 닦아 내는 작업이다. 한지에 이물질이 스며들었거나, 곰팡이가 조직 내에 침투하여 검푸르게 착색 또는 변색된 경우에만 시행한다. 글로 적고 보면 간단하지만 조금이라도 한지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회화작품을 복원하기 전에는 드물게 X선이나 적외선 촬영 장비를 동원하기도 한다. 서양의 유화처럼 그림 밑 부분에 다른 그림이 숨어있는 경우도 드물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복원과정에서 아래쪽에 숨어있는 그림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복원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다.

[지류 문화재 복원의 첫 단계는 클리닝이다. 브러시로 표면에 묻은 각종오염물과 먼지 등을 털어낸다. 하지만 회화작품, 특히 안료를 두껍게 칠한 불화는 칠이 떨어져 나가거나 색이 변한 부분을 되살려야 한다. 아교를 끓는 물에 녹인 다음, 가루로 된 안료를 섞어가며 색을 맞춰 덧칠한다. ]

[지류 문화재는 만들 때부터 배접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복원과정에선 배접할 종이의 종류까지 고려해야 한다.]
종이붙이기가 성패 가른다
한지를 재료로 한 유물은 배접된 경우가 많다. 배접이란 얇은 한지나 비단 등의 뒷면에 같은 재질의 한지나 천을 덧대는 것이다.
특히 작품의 경우 제작 전이나 완료시 배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을 제작하거나 수묵화를 족자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문서는 낱장 또는 여러 장일 경우 말아서 끈으로 묶는 등의 형태로 전래되며, 표구를 하거나 족자로 제작하여 보관하기도 한다. 이 때 배접했다 하더라도 보통 포개거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서가 접히는 부분에 특히 더 많은 손상을 입는다.
결국 복원과정에서도 배접은 필수다. 구멍이 난 경우는 구멍의 크기에 꼭 맞게 한지를 오려 붙이고, 작품의 일부분이 잘려나갔을 경우 크기나 모양을 짐작해 종이를 새롭게 만들어 붙여 주어야 한다. 이럴 때는 최대한 비슷한 재질로 만든 한지를 찾을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뒷면에 한지를 덧대어 전체적인 두께를 보강해 주기도 한다.
클리닝과 배접이 끝났다면 색을 다시 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안료와 염료 등의 재료로 본래 형태와 유사하도록 고색 처리(색 맞춤)과정을 거친다.
한국의 고대 문서, 고대 회화 등은 거의 대부분이 한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문화재를 연구, 복원하는 사람들이 한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 기술은 물론 역사와 미술사 등에 정통해야 하고, 시대에 적합한 재료와 작업방식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나간다면 한국인들의 전통문화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한지를 재료로 한 유물은 배접된 경우가 많다. 배접이란 얇은 한지나 비단 등의 뒷면에 같은 재질의 한지나 천을 덧대는 것이다.
특히 작품의 경우 제작 전이나 완료시 배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을 제작하거나 수묵화를 족자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문서는 낱장 또는 여러 장일 경우 말아서 끈으로 묶는 등의 형태로 전래되며, 표구를 하거나 족자로 제작하여 보관하기도 한다. 이 때 배접했다 하더라도 보통 포개거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서가 접히는 부분에 특히 더 많은 손상을 입는다.
결국 복원과정에서도 배접은 필수다. 구멍이 난 경우는 구멍의 크기에 꼭 맞게 한지를 오려 붙이고, 작품의 일부분이 잘려나갔을 경우 크기나 모양을 짐작해 종이를 새롭게 만들어 붙여 주어야 한다. 이럴 때는 최대한 비슷한 재질로 만든 한지를 찾을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뒷면에 한지를 덧대어 전체적인 두께를 보강해 주기도 한다.
클리닝과 배접이 끝났다면 색을 다시 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안료와 염료 등의 재료로 본래 형태와 유사하도록 고색 처리(색 맞춤)과정을 거친다.
한국의 고대 문서, 고대 회화 등은 거의 대부분이 한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문화재를 연구, 복원하는 사람들이 한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 기술은 물론 역사와 미술사 등에 정통해야 하고, 시대에 적합한 재료와 작업방식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나간다면 한국인들의 전통문화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