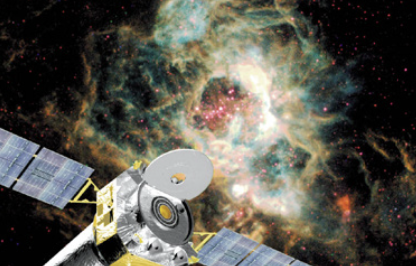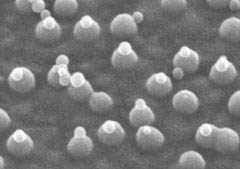이과와 문과의 이분화는 교육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처음 맞닥뜨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선 고등학생들에게, 특히 두 계열 모두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필자 역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전공을 산업공학으로 정한 뒤 나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는 산업공학, 그리고 기술경영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진,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양면적인 매력 때문이리라.
기술경영은 말 그대로 기술과 경영의 융합이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사용했던 그 유명한 표현을 빌자면, 기술경영은 기술 자체의 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technology), 그리고 기술을 위한 경영(management for technology)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혹자는 기술경영을 무늬만 공학인 사회과학이라고 폄하하기도 하고 혹자는 딱딱한 공학을 부드럽게 승화시키는 예술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경영이 공학기술과 경영을 이어주는 필수불가결한 학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과의 수리적, 분석적 능력과 문과의 유연한 사고력, 직관적 판단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공학적 역량과 경영학적 마인드, 어느 하나만 부족하여도 자칫하면 중간에서 길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특한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기술경영연구실의 모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타 공대 실험실과는 확연히 다르다. 거대한 실험장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연구원의 남녀 성비가 거의 대등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학술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 학술지에도 많은 논문을 게재한다. 딱딱함 보다는 부드러움, 기술에만 치우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보다는 기술과 경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지향하는 곳이 기술경영연구실이다.
기술경영연구실은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기술경영 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실로 자리매김했다. 지도교수인 박용태 교수가 세계 50대 기술경영연구자로 선정된 것은 연구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기술경영연구실을 다녀간 선배와 현재 몸 담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밤낮 없는 노력이 일궈낸 성과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이과와 문과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세계를 구축해왔다. 공학과 경영학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해석을 해왔고 엔지니어와 경영자는 서로 다른 언어로 다른 이야기를 해 왔다. 이들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bridge)와 이들을 한데 아우르는 용광로(melting pot)를 구축하는 매력적인 일에 많은 후배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의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500(500원)이 필요합니다.
2009년 09월 과학동아 정보
글
이학연 기자
🎓️ 진로 추천
- 산업경영공학
- 경영학
- 컴퓨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