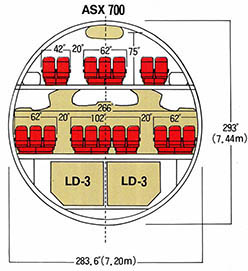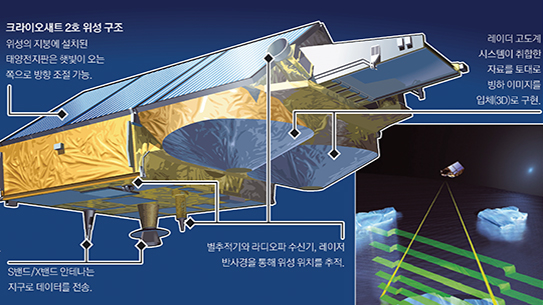조지 고든 바이런의 말을 인용하자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웹 2.0의 시대가 돼 있었다. 웹 2.0은 변화의 흐름이고 방향이다. 웹 2.0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변화도 아니고 아직 완결되지도 않았다. 변화는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됐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롭다, 2.0 시대

웹 2.0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정보기술 도서를 전문적으로 내는 오라일리 출판사의 부사장 데일 도허티였다. 오라일리 출판사가 2004년 12월 웹 2.0 컨퍼런스를 열면서 웹 2.0이라는 개념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0년 닷컴 거품 붕괴 이후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징에 주목했다. 왜 라이코스는 죽고 구글과 야후는 살아남았을까. 아마존과 이베이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닷컴 거품 시대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먼저 주목할 부분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굳이 2.0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웹 2.0의 핵심 개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참여와 개방, 공유로 정리할 수 있다. 웹 1.0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이 관건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만들고 서로 나누고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 관건이 됐다.
구글의 경우 경쟁력의 핵심은 어떤 콘텐츠를 검색 결과의 맨 위에 놓을 것이냐다. 구글은 ‘페이지 랭크’라는 방식으로 검색된 페이지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어떤 페이지를 가리키는 링크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보고 링크가 많을수록 더 유용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전지현’이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링크돼 있는 페이지가 전지현의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구글에서 ‘참담한 실패’(miserable failure)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학살자’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이른바 ‘구글 폭탄’도 그래서 가능하다. 구글은 불특정 다수 사용자들의 집단지성을 콘텐츠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았다. 구글은 어떤 콘텐츠도 직접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콘텐츠에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신의 지성을 공유하라

웹 2.0의 첫 번째 키워드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포털과는 또 다르다. 포털은 말 그대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문’이지만 플랫폼은 콘텐츠가 모여들고 확대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기차역과 비교하자면 얼마나 많은 기차들이 멈춰 서느냐, 그리고 그 기차들을 어떻게 잘 골라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웹 2.0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집단지성이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구글의 경우도 그렇고 가까이는 네이버 지식검색의 경우도 그렇다.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은 독자들의 서평을 모아 도서 구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경매 사이트 이베이 역시 구매자들의 평가가 판매자의 신용을 높인다. 이런 집단지성은 후발업체들에게 강력한 진입장벽이 된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웹 2.0을 이해하기 훨씬 쉽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는 누구든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고쳐 쓸 수 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당연히 작성자 이름도 남지 않는다. 내가 쓴 글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가 고쳐서 다듬을 수 있고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치고 다듬고 하다보면 더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가 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www.flicker.com)도 빼놓을 수 없다. 플리커는 다른 사진 공유 사이트와 달리 무제한 용량을 주고 사진에 태그를 붙이고 태그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한 사진에 ‘과천’ ‘현대 미술관’ ‘피카소 전시회’ ‘홍길동’이라는 태그를 붙여둘 수 있다. 그러면 과천이라는 주제의 다른 사진을 검색해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을 모아서 볼 수도 있다.
즐겨찾기 공유 사이트인 딜리셔스(del.icio.us)도 주목할 만하다. 플리커와 비슷하게 딜리셔스는 즐겨찾기에 태그를 붙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다른 사람들의 즐겨찾기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주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기 하고 있는 웹 사이트를 살펴볼 수도 있다. 딜리셔스에 가서 ‘웹 2.0’을 검색해보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기 하고 있는 웹 페이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80%가 중요하다
블로그 문화도 웹 2.0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블로그는 일기 형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개인 홈페이지와는 다르다. 홈페이지처럼 멈춰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록이 업데이트된다. 정보의 생산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보의 유통에 그쳤던 네이버 지식검색과도 다르다. 불특정 다수 사용자들이 모두 콘텐츠 생산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구글 애드센스는 웹 2.0 모델을 수익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애드센스를 신청하고 소스 코드를 심어 놓으면 본문의 내용을 검색해 본문의 내용과 가장 잘 맞는 내용의 광고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골프 이야기가 나오는 페이지에 골프채나 골프 가방 광고를 집어넣는 식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보여주고 보자는 식이었지만 구글 애드센스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만한 광고를 보여준다.
구글 애드센스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형 광고주가 아니라도 누구나 광고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이제는 동네 통닭집도 광고를 낼 수 있다. 봉천동에 있는 통닭집이라면 ‘봉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페이지에 광고를 집어넣고 클릭할 때마다 50원씩 지불한다든가 하는 방식이다. 본문 내용과 연계된 이런 광고는 실제로 클릭과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부분은 대형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나 동호회 사이트 어디에든 이런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광고주들은 이제 과거처럼 무차별 광고 공세로 클릭을 유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애드센스는 페이지 뷰가 아니라 클릭한 만큼만 광고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누구나 광고주가 되고 누구나 광고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구글 역시 이런 플랫폼으로 엄청난 수익을 낸다.
롱테일 법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롱 테일’(long tail)이란 긴 꼬리라는 의미다. 흔히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올려준다고 하지만 하위 80%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마존은 20%의 베스트셀러보다는 잘 안 팔려서 구하기 어려운 나머지 80%의 책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온다.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아마존에서만 살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 새로운 상상력
다음커뮤니케이션 윤석찬 팀장은 웹 2.0의 세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인간 중심의 시맨틱 웹. 시맨틱(semantic) 웹은 의미를 살린 웹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인간 중심의 웹, 또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 구조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더 직관적이고 가벼운 전달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오픈 소스와 오픈 스탠다드. 누구나 쉽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제공돼야 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 소스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게 좋다. 더 많은 참여가 더 많은 가능성을 낳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사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사용자들의 욕구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웹 2.0은 새로운 유행도 아니고 첨단기술도 아니다. 웹 2.0은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상상력을 의미한다. 핵심은 어떻게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것이냐다. 그러려면 웹 1.0 시대의 모델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경우도 있고 당장의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웹 2.0이란?
2004년 12월 오라일리 출판사의 부사장 데일 도허티가 웹의 진화라는 맥락에서 도입한 개념. 닷컴 버블 이후 살아남은 닷컴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원칙이 발견됐다. 첫째, 플랫폼으로서의 웹과 둘째,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들의 집단지성이다. 몇 차례 컨퍼런스를 거치면서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UCC)나 롱테일 법칙, 시맨틱 웹 등의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웹 2.0 사업 모델도 쏟아져 나왔다. 버블 2.0이라는 비아냥도 있고 벌써부터 웹 3.0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