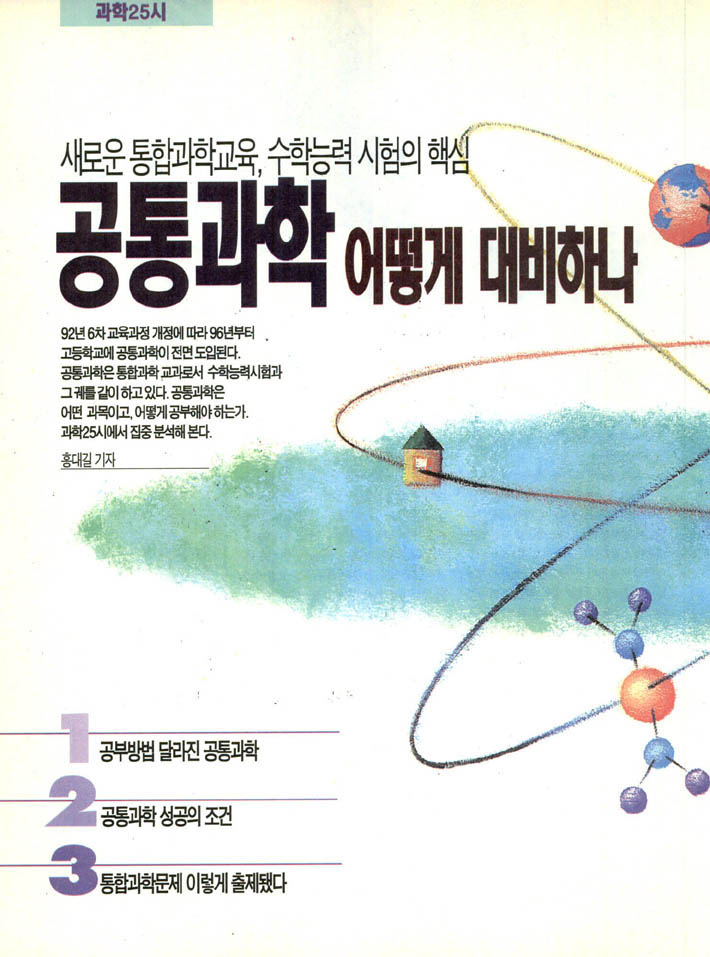최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연일 매스컴이 떠들썩하다. 우리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사의 시작으로 잡고 있는 ‘고조선’ 만 하더라도, ‘단군조선’ 이 실재 했느냐의 문제를 놓고서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문헌과 유물 등 당시의 역사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까닭이다. 더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사료마저 그 신빙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고대사 연구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2천년 천문기록 속에 숨은 역사 밝혀내
역사학계의 이런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뜻밖의 단서를 제시한 것은 천문학 분야. 국내 고천문학 개척자인 박창범 교수의 연구로 역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난 2천년 동안 꾸준히 관측, 기록해온 천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고대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천체의 운동은 규칙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 사료에 나타난 천문현상이 실제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당시의 관측지점을 밝혀내 시대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는 박 교수가 10년 가까이 공을 들인 고천문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책이다. 과학과 역사의 만남이라는 형식도 흥미롭지만, 내용 역시 대륙과 해양을 사이에 놓고 펼쳐지는 동아시아 고대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우주론 연구가 주전공인 박 교수가 고천문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93년 초.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고대사를 천문학적으로 규명해보면 어떻겠냐”는 동료학자의 제안에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고대 천문기록을 직접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해와 달, 행성의 운동을 계산하고 시각화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후, 고조선의 역사가 기록된 ‘단기고사’ 와 ‘한단고기’ 의 천문기록을 찾아 정리했다. 그 중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5행성 결집현상’.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 등 5행성이 2백50년에 한번 꼴로 일직선에 가깝게 늘어서는 희귀현상이어서 상대적으로 확인하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정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두책에 나타난 기록이 실제 일어난 현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통역사학계에 던진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연구 중 특히 ‘삼국사기’ 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삼국시대 일식기록에 대한 중국대륙에서의 측정 논쟁 등은 역사학계 안팎의 주목을 끌며 논쟁의 초점이 됐다.
‘삼국사기’ 만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조작설을 제기하는 일본학자들은 물론,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초기 기록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받는 것이 사실. 그런데 박 교수의 연구는 ‘삼국사기’ 의 천문기록이 중국과 일본의 고대 사료에 비해 훨씬 정확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사료의 신뢰도를 높여준 것이다.
더욱이 당시 일식의 최적 관측지점이 백제는 발해만 유역, 신라는 양쯔강 유역으로 나타나 놀라움이 더해졌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두나라의 강역이 중국까지 뻗어있었다고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과학적·역사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박 교수의 연구가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고대의 천문기록을 현대에 활용 가능한 사료 형태로 바꿔놓은 것일 뿐”이라며 해석의 문제는 역사학계의 몫이라고 했다. 또한 “연구결과가 가져올 역사적 해석의 문제를 놓고 선입관을 갖기보다는, 천문현상이 보여주는 사실을 역사적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구만 할 수 있어 행복한 학자
얼마전 한 TV프로그램에서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를 다룬 적이 있다. 박 교수는 책에 담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는 좋은 기회였지만, 천문역사학 분야만을 제한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책에는 천문역사학 외에도 천문고고학, 천문학사, 고천문학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과학지식을 전달하거나 가르치려는 과학책이 아니라, 과학에 순수한 관심을 갖게 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한다. 그의 책을 보면 어떤 생각에서 출발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결과를 얻게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글을 쓰게 된 목적과 방법을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글을 쓰면서 이렇게 치밀한 계산까지 한걸 보면 그가 보통의 관심으로 책을 낸게 아님을 눈치 챌 수 있다. “처음 강단에서 교양과목을 맡게 됐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천문학 교양도서를 모두 사봤어요. 그런데 30여권에 이르는 책 중에서 내용이 좋다고 인정할만한 것은 고사하고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책이 일본의 문고판이나 미국의 교양 천문학 도서의 번역판인데다가, 번역 또한 부실해서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된 탓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과학책을 쓰는데도 애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박 교수는 지난해 서울대 천문우주학과에서 고등과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연구만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은하와 퀘이사의 기원과 진화를 밝히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인 SDSS(Sloan Digital Sky Survey)에도 참여하게 돼 연구자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또 내년에는 주전공인 우주론을 다룬, ‘인간과 우주’ 출판 1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을 낼 준비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