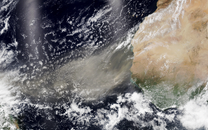가장 딱딱하고 재미없게 보이는 책을 꼽으라면? 아마 학생들은 ‘교과서’를 뽑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올해 중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듯하다. 교과서가 모습을 싹 바꿨기 때문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외형을 살펴보았다.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크기의 변화. 16.9×23.7cm에서 18.9×25.8cm로 커졌다. 학생들의 어깨가 좀더 아플 듯하다.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으와! 컬러다!’ 칙칙한 흑백 때문에 교과서의 그림이나 사진은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교과서에도 컬러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왜 이제야 칼라로 됐는지, 진작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흑백으로 보았을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던 여러가지 암석도 확연히 달라 보였다. 이렇게 공부하면 야외에 나가서도 암석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사진이나 그림이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실험뿐 아니라 신문, 인터넷도 활용
화려한 옷으로 바꿔 입은 교과서가 내용 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기 위해 목차를 뒤져본다. ‘앗! 단원 개수가 12개나!’이전에는 지각의 물질과 변화, 주변의 생물, 물질의 특성과 분리, 힘과 운동 총 4단원이었다. 단원 개수가 3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배울 내용이 많아진 것일까.
단순한 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페이지 수로 따져보았다. 단원 당 70여 페이지에서 20여 페이지로 한 단원의 양이 팍 줄어들었다. 기존의 내용을 좀더 짧게 나눠, 과거의 소단원이 한 단원으로 발전된 것이다. 가령 기존의 '지각의 물질과 변화'의 첫번째 소단원인 '지각의 물질'이 새 교과서의 3단원 '지각의 물질'로 재구성됐다. 이는 길게 이어지는 단원에 대한 지루함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한편 예전 교과서와 내용구성이 다르다. 어떤 내용은 사라지고, 어떤 내용은 새로 추가됐다. 가령 물리 영역을 살펴보자. 예전 교과서는 4단원 '힘과 운동'이 물리 영역이다. 그런데 새로운 교과서는 2단원 '빛', 10단원 '힘', 그리고 12단원 '파동'이 여기에 속한다. 너무나도 다른 구성이다. 왜 이렇게 구성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올해 초등 3·4학년, 중등 1학년에서 시작하는 '7차교육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6차교육과정까지 학제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6-3-3이었다. 7차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에서 고등 3학년까지 총 12학년을 1-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리고 11-12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나눈다. 마치 미국이 우리의 중학교 1학년을 7학년으로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는 총 10개 과목을 배운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가 그것이다. 그리고 과학은 3학년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초등 3·4학년과 중학 1학년(7학년)은 7차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로 배운다. 한편 7차교육과정부터는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리고 고등 2·3학년(11·12학년)의 경우 상당수의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된다. 물론 학교가 정해주는 과목도 상당하다. 마치 미국처럼 말이다.
한편 7차교육과정은 ‘전교과목의 학습량과 수준 적정화’라는 방침이 있다. 이를 위해 교과내용을 30% 줄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과목의 경우 3-10학년까지 내용의 학년변화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새로운 중1 교과서에 등장한 ‘빛’ 단원은 기존 교과서의 초등 4학년 ‘빛의 나아감’ 중 일부 내용이 옮겨온 것이다. 3학년 내용이 4학년으로, 4학년 내용이 5학년으로 학년 이동이 이뤄졌다. 그래서 기존의 중 3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을 고등 1년까지로 조정했다.
좀더 자세히 교과서의 일부 페이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실생활과 관련된 예들이 많이 등장한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보온병의 경우, 보온병 꼭지 부분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데, 왜 직접 물을 따르지 않고 꼭지만 눌러도 물이 나오는지’를 예로 들어준 교과서도 있다(중학교 교과서는 총 7가지). 과학이 멀게만 느껴지는 학생들에게 보다 친밀감을 주기 위해 기존보다 다양한 실례를 들어주는 것이 방침이었다.
또다른 특징은 예전보다 실험이나 활동, 분석과 같이 직접 학생들이 해보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것. 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뭔가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지만 현실의 교육 여건에서 가능할까가 걱정이다. 지금처럼 선생님이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한다면 매시간 활동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은 과학교사 한명 당 한개의 실험실을 기본으로 깔고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7차교육과정이 IMF 이전에 시작한 것이라, 그때의 경제 수준에 맞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활동 내용이 풍부해진 점도 있다. 단순히 ‘과학의 활동은 실험이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그 영역이 보다 확장됐다.

현존 과학자 실리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변화의 수준은 교과서마다 상당한 차이를 주고 있다. 중학교 7종 교과서 중 일부는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고, 어떤 것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교과서의 경우 집필진이 주로 교사라는 것. 이전까지는 주로 교과서를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적으로 집필했다. 그러나 새로운 교과서의 특징은 상당수의 현직 교사가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모 선생님은 “교과서 집필 과정은 상당히 재미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를 들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과학자를 소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내 과학자로 교과서에 소개할 만한 이는 우장춘, 이휘소 박사 정도뿐”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왜 현존하는 과학자를 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초등 5·6학년 교과서에는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 프로야구선수 박찬호, 프로골퍼 박세리 등이 등장한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한 유명한 한국인으로서 말이다.
왜 과학자는 안된다는 것일까. 교과서 집필의 지침은 교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존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꺼린다. 현존인물의 남은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꼭 써야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의 김승익 연구사는 밝혔다.
일선 교사들은 칼라에 사진이 많아진 점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반긴다. 획기적으로 성형 수술한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보다 더 과학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