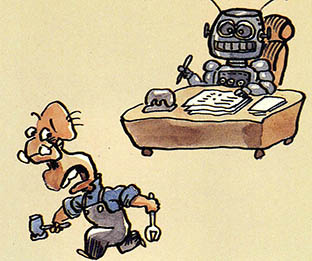필자를 '원자력 전문가' 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에는원자력발전소가 생길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원자력과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억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하지만 평생 한 길을 달려왔다고 선뜻 지난날을 소개하는 것이 왠지 어렵게 느껴진다.
잠시 과기처 생물해양연구조정관을 지낸 적이 있다. 그로 인해 1991년 세종기지를 방문했다. 바람과 얼음, 크릴세우와 펭귄으로 대표되는 4바다의 남극. 신비에 싸여있는 미개척 대륙을 향하는 마음은 마냥 부풀어 올랐다. 한국에서 1만7천km를 날아 남미 최남단 칠레령 푼타아레나스에 다다른 후 부정기 군수송기에 올라탔다.
고막을 찢을 듯한 소음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기체 동요 속에서 군수품에 끼어 가는데도 전혀 고생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기상이변 때문에 3시간만에 되돌아와야 했다. 공항과 숙소를 오가기를 몇차례 거듭한 끝에 3일 후 전번의 고생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자갈밭같은 비행장에 내렷다. 여기서 다시 헬리콥터를 타야 하는데 날씨 때문에 고무보트에 올랐다. 하늘 사정이 나쁜데 바다 사정은 오죽했으랴.
보트에 오르는데 굳이 구명조끼를 입으란다. 그래야만 만일의 경우 생명은 부지못해도 주검은 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웃었지만 오싹해지는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 군데군데 칼날처럼 날카로운 얼음들을 밀치며 마음 졸인 항해 끝에 마침내 세종기지에 도착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오로라가 펼쳐지는 장관가 사파이어 기둥같은 얼음절벽이 우리 눈을 사로잡았다, 남극의 얼음은 눈이 쌓이고 짓눌려 된 것이다. 따라서 내부에 기포가 많고 불순물이 적어 햇살을 받으면 파란 빛을 띤 보석 처럼 빛났다. 우선 얼음을 채우고 위스키를 따랏다. 단군시대 아니 그보다 오래된 태고의 공기를 품은 얼음이 잔 속에서 톡톡거리며 튀었다. 아득한 옛날 포집됐던 공기가 우리 가슴 속을 파고 들었다. 태고와의 만남을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른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