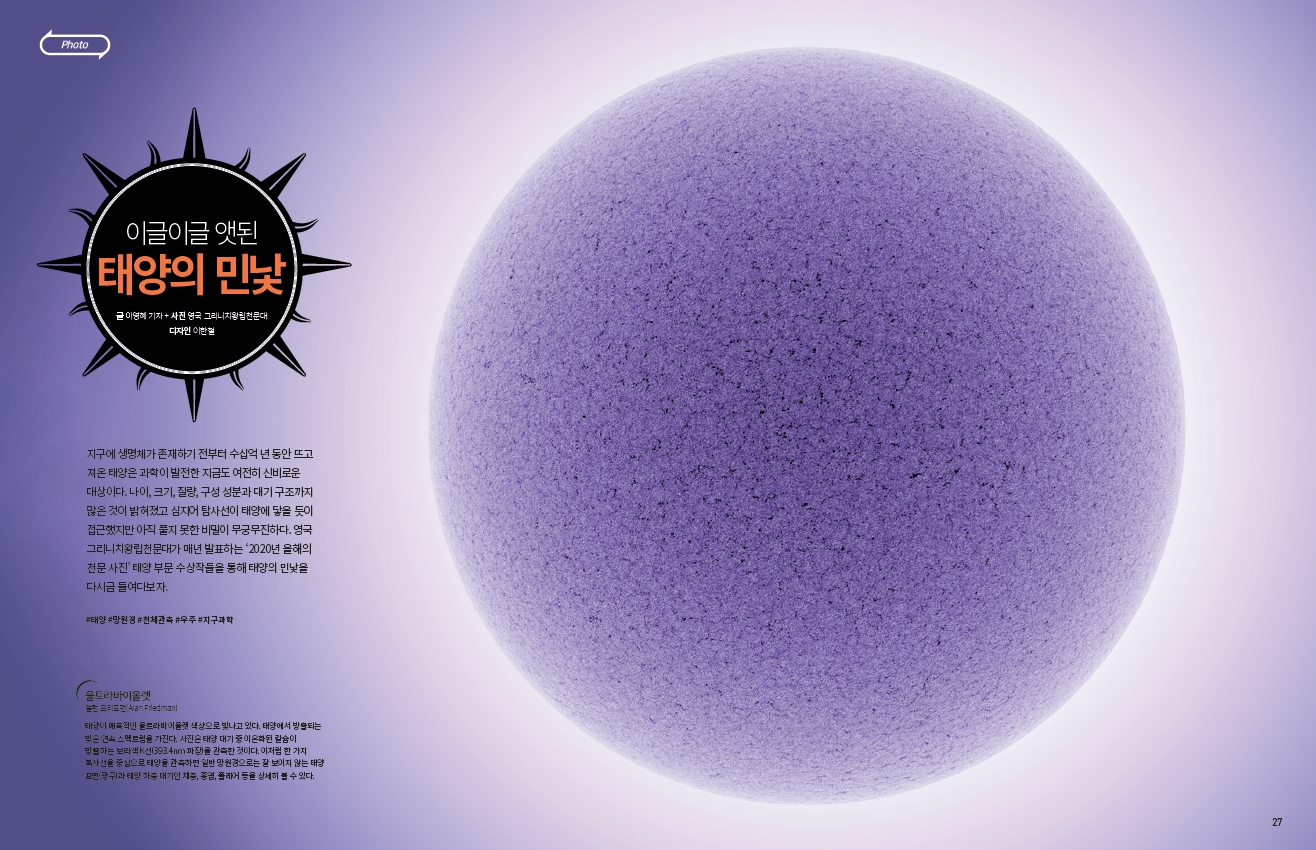학자로서의 생을 거의 마감할 이즈음에 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사이 대학 행정직을 맡지 않고 줄곧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했었더라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랐을 것이다.
연구 생활을 하면서 나를 흥분시킨 일이 세 번 있었다. 첫번째는 1965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연구하던 때다. 생쥐의 난소를 떼내어 배양하면서 배란을 유도한 일이다. 생체 밖 배양액에서 3-4일간 자란 어린 난소가 다 자란 난자를 배출하는 것을 보고 흥분했던 일이 벌써 30년 전의 일이 되었다.
두번째는 수십년간 난소 내에서 성숙이 억제된 난자가 난소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즉시 수정을 할 수 있는 단계의 난자로 성숙을 하게 되는 과정에 cAMP라는 생체조절물질이 깊게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양법을 통해서 밝혔을 때다. 하버드대학에서 연구 생활하던 1972년의 일이다. 세번째는 내가 개발한 난자배양법으로 배양중인 생쥐의 수정난이 이틀 걸리는 장거리 여행 중에 배낭까지 발생시키는데 성공했을 때다.
통상의 배양 방법으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법이었다. 수정난을 배양액이든 미세관에 넣고 이를 다시 시험관 속에 넣었다. 그리고 36℃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솜으로 싸서 배에 동여맨 채 케임브리지에서 에든버러까지 옮긴 것이다. 1973년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에 있을 때다.
연구실을 계속 지키고 있었더라면 더 많은 흥분거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