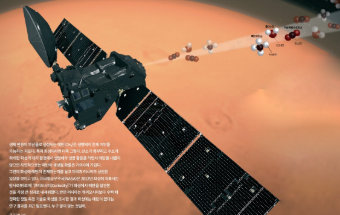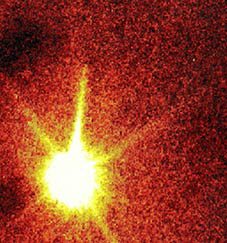피지 하면 초록빛 바다가 펼쳐지고 야자수가 군데군데 솟아 있는 해변, 즉 남태평양 섬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실제로 피지에는 이런 해변이 국제공항이 있는 난디를 중심으로 곳곳에 펼쳐져 있고 관광은 인구 85만 명의 섬나라 피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피지에서 관광만큼이나 중요한 산업이 있다. 사탕수수 재배와 제당 산업이다.
피지는 1874년부터 1970년까지 96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인들은 1년 내내 온화하고 낮에 햇빛이 강한 피지의 자연환경이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역시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대거 이주시켜 사탕수수 농장을 일궜다. 피지에서 가장 큰 섬인 비티레부섬 곳곳에는 사탕수수 밭이 펼쳐져 있다.
난디에서 북쪽으로 30km쯤 가면 라우토카(Lautoka)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피지에서 가장 큰 제당공장이 있다. 라우토카는 인구가 5만 3000명으로 수도 수바(인구 17만 3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10월 1일 오전 소형비행기를 타고 수바에서 난디로 이동한 기자는 라우토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일 사장의 안내로 사탕수수 취재 여정에 올랐다.
수숫대에 들어 있는 달콤한 속살
난디공항을 벗어나자마자 차창 밖 풍경은 온통 사탕수수다. 사탕수수는 인도가 원산지인 벼과 식물로 3~4m까지 자라는데, 얼핏 보면 키가 큰 옥수수 같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얻었다고 한다.
“이 길이 피지에서 유일한 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사탕수수를 싣고 가는 트럭을 위해 만들었죠.”
일단 수확하면 쉽게 상하는 사탕수수는 24시간 내에 공장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공장까지 신속히 운반해야 한다. 길옆에는 폭이 50~60cm에 불과한 협궤철로도 있다. 역시 사탕수수 운반 열차 전용 철로다. 15분쯤 지났을까 철로 위 운반차에 수확한 사탕수수를 싣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강 사장이 차를 세웠다.
“이 주변에서 수확한 사탕수수는 이곳으로 가져와 기차로 공장까지 운반합니다. 운반차에는 농장별로 표시를 해놓지요.”
묵묵히 사탕수수를 싣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겠다고 하자 흔쾌히 포즈를 취해준다. 마디 굵은 손가락이 거친 노동의 강도를 짐작케 했다. 초로의 건장한 이 사내는 자신의 이름이 페니(Peni)라며 활짝 웃었다. 다시 차에 올라 10분쯤 달린 뒤 한 농장 앞에 내렸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42세의 농장주 사텐 라오(Satend Rao) 씨가 기자를 맞았다. 6명이 사탕수수밭 22에이커(약 9만m2)를 경작하는데, 사탕수수 연간 생산량은 500~600t이라고 한다. t당 가격은 75피지달러(약 5만 원)이고 6~12월이 수확철이다. 사탕수수는 1년 동안 자라면 밑동을 베어내 잎을 걷어내고 대만 모은다. 댓속에 단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건물 뒤편 사탕수수밭으로 자리를 옮긴 라오 씨가 ‘케인 나이프(cane knife, 사탕수수 칼)’라고 부르는 일종의 낫을 가져와, 밭으로 들어가 몇 번 휘두르니 어느새 사탕수숫대가 눈앞에 있다. 그리고 휙휙 날렵한 낫질로 껍질을 벗기자 연한 노란색 속살이 드러난다.
툭!
라오 씨가 건네주는 사탕수숫대를 받아 속을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에 단물이 확 퍼진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든다는 게 실감 난다. 우적우적 씹어 단물을 빨아 먹은 뒤 남은 섬유질 속은 뱉어냈다.
“대가 잘린 자리 옆에서 눈이 나와 또 식물이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7~8번 수확할 수 있죠.” 키가 3~4m나 되는 사탕수수가 즐비한 밭 옆에는 잎이 서너 개 달린 작은 사탕수수가 자라고 있다. 수년 동안 수확해 수명이 다한 사탕수수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사탕수수 대를 두세 마디 길이로 잘라 옆으로 뉘여 심으면 마디에 있는 눈에서 싹이 터 새로 식물이 자란다고 한다. 결국 사탕수수는 7~8년마다 한 번 심고 매년 수확하는 작물인 셈이다.
공기조차 단내 나는 도시
농장을 뒤로하고 여전히 사탕수수밭이 늘어서 있는 길을 20분쯤 달리자 도시가 모습을 보인다. 라우토카다. 길가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야자수가 마치 전봇대 같다. 곧게 뻗은 나무줄기는 굵기도 전봇대와 비슷할 뿐 아니라 색깔도 시멘트 회색빛이다.
야자수 건너편에 폭이 2~3m인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철로가 나란히 뻗어 있다. 마침 사탕수수 묶음을 실은 운반차 수십 대를 매달고 서 있는 기관차가 보인다. 놀이공원에 있는, 실물을 반으로 축소한 기차 같다. 기관차 안에서 사람이 나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기자를 향해 손을 흔든다.
“피지 인구의 30% 정도가 인도계인데,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 개척 때 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강 사장은 작은 인도식당에 들어서며 피지 원주민과 인도계 주민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부지런한 인도계 사람들이 피지의 경제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으로 닭고기 카레를 주문했는데, 음식은 가격(5피지달러로 약 3000원)에 비해 만족스러웠다. 우리가 먹는 찰진 자포니카 품종의 쌀보다 풀풀 날리는 인디카 품종의 쌀이 카레엔 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을 나서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FSC(Fiji Sugar Corporation, 피지설탕사)의 제당공장으로 향했다. 아직 공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차창 밖에서 벌써 단내가 풍긴다. 들쩍지근한 냄새가 마치 식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밥에 엿기름물을 붓고 솥에 끓여 밥알을 삭힐 때 나는 냄새 같다. 공장 입구에는 사탕수수 운반차가 몇 갈래로 갈라진 협궤철로 위에 줄지어 늘어서 있고 옆에는 사탕수수를 잔뜩 실은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트럭은 후진으로 차를 댄 뒤 사탕수수를 내려놓고 떠난다. 그 옆에는 기차로 운반한 사탕수수가 내려지고 있다. 여기서 쏟아져 내리는 사탕수숫대는 약 5m 아래 컨베이어벨트에 얹어져 ‘해체’의 첫 단계에 들어간다.
“이곳은 하루에 약 500t의 사탕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지에서 가장 큰 공장이죠.”
공장 안내를 맡은 수석 엔지니어(chief engineer) 존 댄포드 씨는 사무실에서 인사말을 나눈 뒤 공장을 돌아보자며 바로 일어섰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멍멍하고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로 연신 재채기가 났다. 사르르 모래가 구르는 소리 정도가 날 뿐인 흰색(사실은 무색투명한)의 설탕 가루가 이런 과정을 거쳐 태어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벨트로 운반된 사탕수수는 파쇄기에서 잘게 분쇄됩니다. 이걸 보시죠.”
댄포드 씨가 기계에서 한 움큼 집어 눈앞에 가져다준 사탕수수는 축축한 섬유질 덩어리로 바뀌어 있었다. 다음 단계로 이 덩어리를 압착해 즙과 찌꺼기를 분리한다. 무게 비로 따지면 즙이 86% 정도이고 찌꺼기가 14%다. 찌꺼기는 보일러로 옮겨 연료로 쓴다. 찌꺼기를 태워 즙을 끓여 농축시키고 남은 열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 공장에서 사용한다. 타고 남은 재는 수거해 천연비료로 쓴다. 사탕수수는 버릴 게 없는 셈이다.
수분을 날리면 즙은 점차 걸쭉해지면서 갈색시럽이 된다. 여기에 실험실에서 만든 작은 설탕입자, 즉 핵을 분사하면 설탕결정이 자란다. 작은 드라이아이스나 염분 입자를 뿌려 빗방울이 잘 형성되게 하는 인공강우와 같은 이치다.
“이렇게 해야 균일한 크기의 설탕결정이 얻어집니다. 저기 현미경을 보세요.”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는 증발기에서 채취한 시럽이 발라져 있다. 반짝반짝 불빛을 반사하는 모습이 시럽 속에 결정이 상당히 형성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실제로 현미경 대안렌즈에 눈을 갖다 대자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 놓은 듯 눈부신 설탕결정이 가득하다. 정말 크기가 똑같아 보인다.
“결정이 충분히 형성되면 시럽을 원심분리기에 넣어 설탕결정과 시럽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원심분리기가 고속으로 돌아가면 물체가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데, 내벽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액체(시럽 찌꺼기)는 통과하고 설탕결정만 남는다. 원심분리가 끝나면 벽에 붙어 있는 결정을 긁어내고 뜨거운 물을 뿌려 표면에 묻은 시럽을 씻어낸 뒤 건조기로 보내 결정을 말린다. 이 모든 과정을 막 끝내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따끈따끈한’(막 만들었다는 비유적 의미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따뜻한!) 설탕가루를 한 줌 집었다. 그런데 설탕이 희지가 않고 누렇다.
맛의 뉘앙스 풍부한 갈색설탕
“사탕수수에서 얻은 설탕은 원래 이렇습니다. 갈색설탕(brown sugar) 이라고 하죠. 백설탕(white sugar)은 갈색설탕을 다시 물에 녹여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 더 정제한 것이죠.”
갈색설탕 역시 90% 이상은 자당(sucrose)이지만 갈색을 내는 색소와 당밀, 사탕수수 고유의 향기를 지닌 냄새분자, 그리고 많은 미량성분이 포함돼 있다. 반면 백설탕은 갈색설탕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색소나 냄새분자를 거의 제거하기 때문에 거의 순수한 자당만 남는다. 요리과정에서 순수하게 단맛만을 부여하고 싶을 때 갈색설탕보다 백설탕이 선호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탕=흰색’이라는 인식이 강해 거의 모든 경우 백설탕을 쓴다.
반면 사탕수수의 나라 피지는 갈색설탕이 주류다. 기자가 수바에서 묵은 호텔의 경우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나오는 설탕 단지 안에도 갈색설탕이 들어 있고 봉지설탕도 갈색설탕이다. 순수한 단맛의 백설탕을 좋아할지, 맛의 뉘앙스가 풍부한 갈색설탕을 좋아할지는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일 것이다. 다만 같은 양일 경우 갈색설탕은 만드는 데 에너지가 덜 들어가므로 백설탕보다 더 친환경적임이 분명하다.
원심분리기를 빠져 나간 시럽 찌꺼기(폐당밀)에도 채 결정화되지 않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발효시켜 에탄올을 얻는다고 한다. 이래저래 사탕수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물이란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다.
“사탕수수 9t에서 설탕 1t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든 설탕의 일부는 피지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주로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합니다.”
사양길 접어든 피지 사탕수수 산업
지금까지 EU는 경제원조 차원에서 다소 비싼 값으로 피지 설탕을 사들였는데,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불공정무역이라는 판결을 받아 머지않아 이 같은 특혜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지 사탕수수 산업의 미래는 결코 달콤하지 않은 셈이다.
공장을 나와 오던 길을 되돌아 숙소가 있는 난디로 향했다. 피지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며 칵테일을 한 잔 할까 하고 메뉴의 목록을 훑어봤다. ‘앵그리 피지언(Angry Fijian, 성난 피지사람)’이란 칵테일이 맨 앞줄에 있다. 설명문을 읽어 보니 럼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다. 럼(rum)은 사탕수수 즙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이다. ‘오늘은 끝가지 사탕수수로 가보자.’
칵테일을 가져오는 종업원에게 이 술을 마시면 정말 화가 나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활짝 웃는다. 새콤달콤한 칵테일의 맛 속에 들쩍지근한 사탕수수 냄새가 배어 있다. 문득 중간 집하소에서 열심히 사탕수수 더미를 쌓던 노동자 페니 씨와 사탕수수를 맛보며 감탄하는 기자를 보며 껄껄 웃던 농장주 라오 씨가 떠올랐다.
막 나온 뜨끈뜨끈한 설탕을 두 손 가득 담아 포즈를 취해주던 엔지니어 댄포드 씨의 목소리가 엄청난 소음과 함께 들리는 듯했다. ‘앵그리 피지언’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문득 사탕수수 산업의 침체로 피지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커피에 설탕을 타다가 봉지에 남은 걸 입에 털어 넣었다. 왠지 땀내가 느껴지고 씁쓸한 뒷맛이 남을 것 같았지만 피지의 설탕은 무척 달고 향기로울 뿐이었다.